-
 [스페셜1]
[여성 영화인들⑤] 황혜미 감독 - 새로운 영상미와 결합한 문제의식
황혜미는 1970년대에 유일하게 활동한 여성감독이었다. 그녀의 명성을 뒷받침한 것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프랑스 소르본에서 영화를 전공했다는, 거의 정설처럼 회자됐던 소문이었다. 간혹 남편과 함께 미국 조지타운대학을 졸업했다는 낭설도 심심치 않게 등장했다. 이후 다큐멘터리 <아름다운 생존: 여성 영화인이 말하는 영화>에서 프랑스에 잠시 가 있었을
글: 이길성 │
2018-10-03
[스페셜1]
[여성 영화인들⑤] 황혜미 감독 - 새로운 영상미와 결합한 문제의식
황혜미는 1970년대에 유일하게 활동한 여성감독이었다. 그녀의 명성을 뒷받침한 것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프랑스 소르본에서 영화를 전공했다는, 거의 정설처럼 회자됐던 소문이었다. 간혹 남편과 함께 미국 조지타운대학을 졸업했다는 낭설도 심심치 않게 등장했다. 이후 다큐멘터리 <아름다운 생존: 여성 영화인이 말하는 영화>에서 프랑스에 잠시 가 있었을
글: 이길성 │
2018-10-03
-
 [스페셜1]
[여성 영화인들④] 최은희 감독 - 메가폰을 든 스타
배우 최은희의 이력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화려하다. 1943년 연극 무대로 데뷔한 최은희는 1947년 <새로운 맹서>(감독 신경균)로 스크린에 데뷔한 후 1950~60년대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부동의 ‘스타’였다. 따라서 박남옥, 홍은원에 이은 한국영화사상 세 번째 여성감독이라는 칭호는 배우 최은희의 화려한 명성을 장식하는 ‘특별한 이력’으로
글: 공영민 │
2018-10-03
[스페셜1]
[여성 영화인들④] 최은희 감독 - 메가폰을 든 스타
배우 최은희의 이력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화려하다. 1943년 연극 무대로 데뷔한 최은희는 1947년 <새로운 맹서>(감독 신경균)로 스크린에 데뷔한 후 1950~60년대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부동의 ‘스타’였다. 따라서 박남옥, 홍은원에 이은 한국영화사상 세 번째 여성감독이라는 칭호는 배우 최은희의 화려한 명성을 장식하는 ‘특별한 이력’으로
글: 공영민 │
2018-10-03
-
 [스페셜1]
[여성 영화인들③] 홍은원 감독 - 스크립터로 출발한 충무로의 정통파
홍은원은 영화계에서 그 본명과 예명 홍설아·홍진아만큼이나 여러 일에 종사했다. 그는 스크립터로 출발해 조감독을 거쳐 시나리오작가, 작사가, 감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능을 보인 충무로의 정통파였다. 두 예명에 ‘예쁠 아’(娥)를 넣을 만큼 그는 눈처럼 아름답고 참되게 살려고 했던 것일까. 실제로 스튜디오에선 언니로 통할 만큼 영화인들의 사랑을 받았다.
글: 김종원 │
2018-10-03
[스페셜1]
[여성 영화인들③] 홍은원 감독 - 스크립터로 출발한 충무로의 정통파
홍은원은 영화계에서 그 본명과 예명 홍설아·홍진아만큼이나 여러 일에 종사했다. 그는 스크립터로 출발해 조감독을 거쳐 시나리오작가, 작사가, 감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능을 보인 충무로의 정통파였다. 두 예명에 ‘예쁠 아’(娥)를 넣을 만큼 그는 눈처럼 아름답고 참되게 살려고 했던 것일까. 실제로 스튜디오에선 언니로 통할 만큼 영화인들의 사랑을 받았다.
글: 김종원 │
2018-10-03
-
 [스페셜1]
[여성 영화인들②] 박남옥 감독 - 한국 최초의 여성영화감독
2017년 4월 8일 한국 최초의 여성영화감독으로 불리는 박남옥 감독이, 향년 94살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별세했다. 그가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처음 열린 서울여성영화제를 통해서다. 그때 한국영상자료원에 결말부 영상과 일부 사운드가 유실된 채로 네거티브필름만 보관되어 있던 그의 연출작 <미망인>(1955)이 다시 빛을 보
글: 정종화 │
2018-10-03
[스페셜1]
[여성 영화인들②] 박남옥 감독 - 한국 최초의 여성영화감독
2017년 4월 8일 한국 최초의 여성영화감독으로 불리는 박남옥 감독이, 향년 94살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별세했다. 그가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처음 열린 서울여성영화제를 통해서다. 그때 한국영상자료원에 결말부 영상과 일부 사운드가 유실된 채로 네거티브필름만 보관되어 있던 그의 연출작 <미망인>(1955)이 다시 빛을 보
글: 정종화 │
2018-10-03
-
 [스페셜1]
[여성 영화인들①] 오성지 한국영상자료원 연구전시팀 차장, “여성감독들의 낭만에 관객이 공감하기를”
-한국 여성감독 6인에 대한 전시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4월 최은희 선생님의 부고였다. 한 시대가 저무는 느낌이었다.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박남옥 감독님이 돌아가신 뒤 따님인 이경주 선생님이 감독님에 대한 자료를 기증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게 생각났다. 그분들과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여성 연출자인
글: 장영엽 │
사진: 백종헌 │
2018-10-03
[스페셜1]
[여성 영화인들①] 오성지 한국영상자료원 연구전시팀 차장, “여성감독들의 낭만에 관객이 공감하기를”
-한국 여성감독 6인에 대한 전시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4월 최은희 선생님의 부고였다. 한 시대가 저무는 느낌이었다.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박남옥 감독님이 돌아가신 뒤 따님인 이경주 선생님이 감독님에 대한 자료를 기증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게 생각났다. 그분들과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여성 연출자인
글: 장영엽 │
사진: 백종헌 │
2018-10-03
-
 [스페셜1]
여성 영화인들이여,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내다보라 ① ~ ⑧
지난 2017년 4월 8일, 한국 최초의 여성감독 박남옥이 세상을 떠났다. 올해 4월 16일에는 1950~60년대를 풍미한 톱스타이자 한국영화사에 등장한 세 번째 여성감독 최은희의 부고 소식이 들려왔다. 여성감독의 존재감이 전무하다시피했던 20세기 중반, 충무로라는 광야에서 그들만의 설 자리를 개척했던 두 감독의 잇단 부고를 접하면서, 한국영화 속 여성감
글: 장영엽 │
2018-10-03
[스페셜1]
여성 영화인들이여,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내다보라 ① ~ ⑧
지난 2017년 4월 8일, 한국 최초의 여성감독 박남옥이 세상을 떠났다. 올해 4월 16일에는 1950~60년대를 풍미한 톱스타이자 한국영화사에 등장한 세 번째 여성감독 최은희의 부고 소식이 들려왔다. 여성감독의 존재감이 전무하다시피했던 20세기 중반, 충무로라는 광야에서 그들만의 설 자리를 개척했던 두 감독의 잇단 부고를 접하면서, 한국영화 속 여성감
글: 장영엽 │
2018-10-0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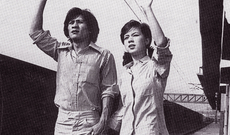 [스페셜1]
[부산국제영화제⑧]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 회고전 이장호 감독, <별들의 고향> <바람 불어 좋은 날>부터 최근작 <시선>까지
그는 충무로에 혜성처럼 등장했다. 한해 제작된 120편의 한국영화 중에서 관객수 5만명을 넘긴 영화가 15편이 채 되지 않았던 암흑기에, 그의 데뷔작은 46만여명이나 불러모았다. 서울의 명보극장 한 군데에서만 말이다. 통기타 음악, 청바지, 생맥주 등 청년 문화 바람을 일으켰고, “경아, 오랜만에 누워보는군”이라는 대사가 유신 시대에 억눌렸던 대중의 감수
글: 김성훈 │
2018-09-26
[스페셜1]
[부산국제영화제⑧]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 회고전 이장호 감독, <별들의 고향> <바람 불어 좋은 날>부터 최근작 <시선>까지
그는 충무로에 혜성처럼 등장했다. 한해 제작된 120편의 한국영화 중에서 관객수 5만명을 넘긴 영화가 15편이 채 되지 않았던 암흑기에, 그의 데뷔작은 46만여명이나 불러모았다. 서울의 명보극장 한 군데에서만 말이다. 통기타 음악, 청바지, 생맥주 등 청년 문화 바람을 일으켰고, “경아, 오랜만에 누워보는군”이라는 대사가 유신 시대에 억눌렸던 대중의 감수
글: 김성훈 │
2018-09-26
[스페셜1] [여성 영화인들⑤] 황혜미 감독 - 새로운 영상미와 결합한 문제의식 황혜미는 1970년대에 유일하게 활동한 여성감독이었다. 그녀의 명성을 뒷받침한 것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프랑스 소르본에서 영화를 전공했다는, 거의 정설처럼 회자됐던 소문이었다. 간혹 남편과 함께 미국 조지타운대학을 졸업했다는 낭설도 심심치 않게 등장했다. 이후 다큐멘터리 <아름다운 생존: 여성 영화인이 말하는 영화>에서 프랑스에 잠시 가 있었을 글: 이길성 │ 2018-10-03
[스페셜1] [여성 영화인들④] 최은희 감독 - 메가폰을 든 스타 배우 최은희의 이력은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화려하다. 1943년 연극 무대로 데뷔한 최은희는 1947년 <새로운 맹서>(감독 신경균)로 스크린에 데뷔한 후 1950~60년대 한국영화를 대표하는 부동의 ‘스타’였다. 따라서 박남옥, 홍은원에 이은 한국영화사상 세 번째 여성감독이라는 칭호는 배우 최은희의 화려한 명성을 장식하는 ‘특별한 이력’으로 글: 공영민 │ 2018-10-03
 [스페셜1]
[여성 영화인들③] 홍은원 감독 - 스크립터로 출발한 충무로의 정통파
홍은원은 영화계에서 그 본명과 예명 홍설아·홍진아만큼이나 여러 일에 종사했다. 그는 스크립터로 출발해 조감독을 거쳐 시나리오작가, 작사가, 감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능을 보인 충무로의 정통파였다. 두 예명에 ‘예쁠 아’(娥)를 넣을 만큼 그는 눈처럼 아름답고 참되게 살려고 했던 것일까. 실제로 스튜디오에선 언니로 통할 만큼 영화인들의 사랑을 받았다.
글: 김종원 │
2018-10-03
[스페셜1]
[여성 영화인들③] 홍은원 감독 - 스크립터로 출발한 충무로의 정통파
홍은원은 영화계에서 그 본명과 예명 홍설아·홍진아만큼이나 여러 일에 종사했다. 그는 스크립터로 출발해 조감독을 거쳐 시나리오작가, 작사가, 감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능을 보인 충무로의 정통파였다. 두 예명에 ‘예쁠 아’(娥)를 넣을 만큼 그는 눈처럼 아름답고 참되게 살려고 했던 것일까. 실제로 스튜디오에선 언니로 통할 만큼 영화인들의 사랑을 받았다.
글: 김종원 │
2018-10-03
[스페셜1] [여성 영화인들②] 박남옥 감독 - 한국 최초의 여성영화감독 2017년 4월 8일 한국 최초의 여성영화감독으로 불리는 박남옥 감독이, 향년 94살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별세했다. 그가 우리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처음 열린 서울여성영화제를 통해서다. 그때 한국영상자료원에 결말부 영상과 일부 사운드가 유실된 채로 네거티브필름만 보관되어 있던 그의 연출작 <미망인>(1955)이 다시 빛을 보 글: 정종화 │ 2018-10-03
 [스페셜1]
[여성 영화인들①] 오성지 한국영상자료원 연구전시팀 차장, “여성감독들의 낭만에 관객이 공감하기를”
-한국 여성감독 6인에 대한 전시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4월 최은희 선생님의 부고였다. 한 시대가 저무는 느낌이었다.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박남옥 감독님이 돌아가신 뒤 따님인 이경주 선생님이 감독님에 대한 자료를 기증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게 생각났다. 그분들과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여성 연출자인
글: 장영엽 │
사진: 백종헌 │
2018-10-03
[스페셜1]
[여성 영화인들①] 오성지 한국영상자료원 연구전시팀 차장, “여성감독들의 낭만에 관객이 공감하기를”
-한국 여성감독 6인에 대한 전시를 기획하게 된 이유는.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4월 최은희 선생님의 부고였다. 한 시대가 저무는 느낌이었다.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난해 박남옥 감독님이 돌아가신 뒤 따님인 이경주 선생님이 감독님에 대한 자료를 기증하고 싶다고 말씀하셨던 게 생각났다. 그분들과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여성 연출자인
글: 장영엽 │
사진: 백종헌 │
2018-10-03
 [스페셜1]
여성 영화인들이여,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내다보라 ① ~ ⑧
지난 2017년 4월 8일, 한국 최초의 여성감독 박남옥이 세상을 떠났다. 올해 4월 16일에는 1950~60년대를 풍미한 톱스타이자 한국영화사에 등장한 세 번째 여성감독 최은희의 부고 소식이 들려왔다. 여성감독의 존재감이 전무하다시피했던 20세기 중반, 충무로라는 광야에서 그들만의 설 자리를 개척했던 두 감독의 잇단 부고를 접하면서, 한국영화 속 여성감
글: 장영엽 │
2018-10-03
[스페셜1]
여성 영화인들이여,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내다보라 ① ~ ⑧
지난 2017년 4월 8일, 한국 최초의 여성감독 박남옥이 세상을 떠났다. 올해 4월 16일에는 1950~60년대를 풍미한 톱스타이자 한국영화사에 등장한 세 번째 여성감독 최은희의 부고 소식이 들려왔다. 여성감독의 존재감이 전무하다시피했던 20세기 중반, 충무로라는 광야에서 그들만의 설 자리를 개척했던 두 감독의 잇단 부고를 접하면서, 한국영화 속 여성감
글: 장영엽 │
2018-1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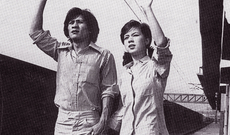 [스페셜1]
[부산국제영화제⑧]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 회고전 이장호 감독, <별들의 고향> <바람 불어 좋은 날>부터 최근작 <시선>까지
그는 충무로에 혜성처럼 등장했다. 한해 제작된 120편의 한국영화 중에서 관객수 5만명을 넘긴 영화가 15편이 채 되지 않았던 암흑기에, 그의 데뷔작은 46만여명이나 불러모았다. 서울의 명보극장 한 군데에서만 말이다. 통기타 음악, 청바지, 생맥주 등 청년 문화 바람을 일으켰고, “경아, 오랜만에 누워보는군”이라는 대사가 유신 시대에 억눌렸던 대중의 감수
글: 김성훈 │
2018-09-26
[스페셜1]
[부산국제영화제⑧] 부산국제영화제 한국영화 회고전 이장호 감독, <별들의 고향> <바람 불어 좋은 날>부터 최근작 <시선>까지
그는 충무로에 혜성처럼 등장했다. 한해 제작된 120편의 한국영화 중에서 관객수 5만명을 넘긴 영화가 15편이 채 되지 않았던 암흑기에, 그의 데뷔작은 46만여명이나 불러모았다. 서울의 명보극장 한 군데에서만 말이다. 통기타 음악, 청바지, 생맥주 등 청년 문화 바람을 일으켰고, “경아, 오랜만에 누워보는군”이라는 대사가 유신 시대에 억눌렸던 대중의 감수
글: 김성훈 │
2018-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