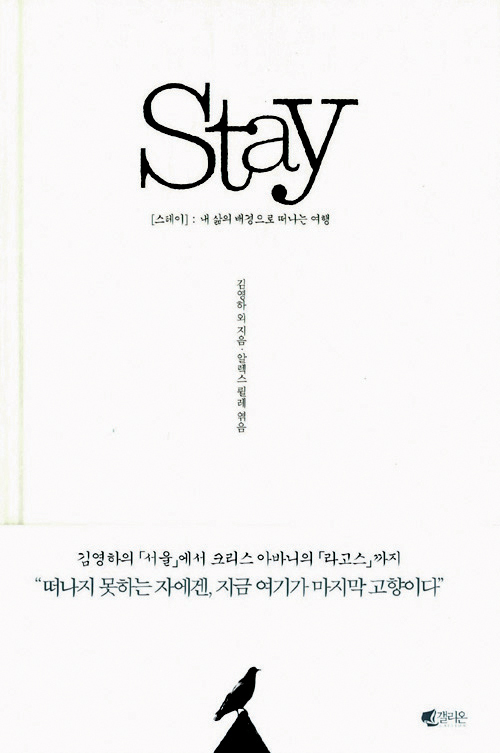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당신의 ‘고향 도시’에 생각해보라. 도시는 단순한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멜랑콜리와 그리움으로 가득한 영혼의 공간이기에, 그에 얽힌 감정을 설명하기란 쉽지 않으리라. 세계 최대 규모의 열두 도시에 살고 있는, 혹은 살았던 작가들이 ‘고향 도시’에 대한 글을 썼다. 그들은 자신이 태어났거나 오래 살았던 한 도시에 대해 사랑하고 미워하는 도시와 삶의 풍광을 자유롭게 그려냈다. <스테이>는 열두 도시에 대한 열두 작가의 글을 담았는데, 모두 다른 이야기지만 어찌보면 서로 닮아 보이는 감상을 자아낸다. 복합적이고도 복잡한. 냉소적이고 자조적이지만 애정을 부인할 수는 없는. 돌아는 가는데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모두 돌아버리게 만드는 현실에 대한 농담이 있다는 점도 비슷하다.
아마 당신이 가장 뼈아픈 감정으로 읽게 될 글은 김영하가 쓴 서울에 대한 글 ‘단기기억상실증’일 것이다. “서울은 어쩌면 정신과적 상담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미치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는 분명 아닌 것이다. 자기 몸에 새겨진 문신을 지우려 애쓰는 늙은 폭주족처럼, 서울은 필사적으로 근대의 기억을 지우고 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서울은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왕조 시대의 풍습을 복원하는 것도, 그리하여 값싼 오리엔탈리즘으로 스스로를 치장하는 것도, 모든 주거 형태를 아파트로 단일화하는 것도, 하수도에 가까운 개천을 새로운 인공수로로 덮어버리는 것도, 모두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하고 있다.” 요하네스버그에 사는 이반 블라디슬라비치는 치안이 불안정한 요하네스버그에서 살아남기 위해 17개의 열쇠를 가지고 다니며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테헤란에 사는 아미르 하싼 체헬탄은 테헤란의 도시민들이 행하는 총체적이고도 목적지향적인 유일한 행위는, 석유수입을 탕진하는 데 있다며, “우리는 오래전에 집단 자살을 시작한 자들이다”라고 선언한다. 멕시코시티에서는 20층 빌딩에 불이 나도 소방차보다 TV방송국 헬리콥터가 먼저 출동한다.
누구를 향한 비난이 아니다. ‘고향 도시’에 대한 애증이 실제로 그러할 뿐이다. 아미르 하싼 체헬탄의 말처럼. “나는 이 도시가 싫어요. 하지만 테헤란은, 내가 그곳에 있을 때 안전하고 편안한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세상에서 유일한 도시입니다. 테헤란은 내 신체의 일부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