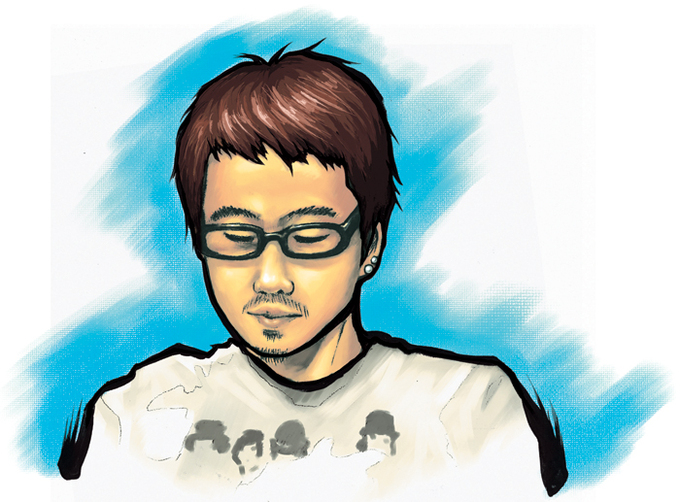파리의 ‘셰익스피어 앤드 컴퍼니’ 서점에 갔다가 1973년에 발행된 폴린 카엘의 비평집 <Deeper Into Movies>를 샀다. 지난 2001년 작고한 폴린 카엘은 1968년부터 91년까지 <뉴요커>를 주무대로 비평을 기고했던 평론가로, 예리한 직관과 아이러니에 개인적인 감상을 팍팍 친 신랄한 독설로 유명했던 저널리즘 비평의 큰언니다. 그녀의 글은 아주 명쾌하다. <뉴요커>를 읽을 만한 수준의 독자를 위한 글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지휘하려는 욕심이 배어나는 글이기도 하고, 종종 독자의 뒤통수를 후려치며 “어디 한번 반박해보시지”라며 도전하는 글이기도 하다. 독자와 지적인 유희와 논쟁을 벌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글이다.
바로 그런 이유로 폴린 카엘의 독설은 삼키기가 매우 난감하고, 바로 그 때문에 카엘은 귀찮은 논쟁에 자주 휩싸였다. 지난 1965년, 카엘은 <사운드 오브 뮤직>을 “사람들이 먹고 싶어하도록 당의(糖衣)를 씌워놓은 거짓말투성이”라며 난도질했는데, 대중은 카엘의 독설에 맹렬하게 분노를 표했고 당시 비평을 실었던 여성지 <McCall’s>는 결국 카엘을 해고했다. 그러나 카엘은 무뎌지지 않았다. 그녀는 지난 70년 <볼트와 린>이라는 글을 통해 <라이언의 딸>을 위시한 데이비드 린의 영화들을 난도질했는데 이게 정말 장관이다. “데이비드 린은 슈퍼테크니션이다. 그가 원하는 것이라곤 테크놀로지를 통솔하는 것밖에 없는 듯하다. 유머라곤 없이 꽉 짜인 그의 에픽들은 어떠한 감정적인 에너지도 없고, 막대한 기술적 노동을 감출 만한 열정적인 비전도 없다.” 데이비드 린이 어떤 식으로 항의했냐고? 이 위대하고도 심약한 작가는 카엘의 비평에 마음이 상한 나머지 이후 14년 동안 영화를 만들지 않았다. 아메리칸 시네마의 끝물에서 “영화는 죽었다”고 선언하고는 초창기 블록버스터들을 잘근잘근 씹어댔던 카엘은 <스타워즈>도 놓치고 지나가지 않았다. “서정도 없고 감정적으로 끌어당기는 요소도 없는, 꿈꾸지 않는 에픽이다.”
나는 <사운드 오브 뮤직>을 좋아하지만 카엘의 의견에도 동의한다. 내가 <사운드 오브 뮤직>에서 좋아하는 건 바로 그 당의를 제외한 모든 부분들이다. 나는 <아라비아의 로렌스>가 ‘미친 테크니션의 정신나간 야망이 믿을 수 없는 절정에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좋아하지만 <닥터 지바고>는 줄리 크리스티와 <라라의 테마>만 좋고, <라이언의 딸>은 크리스토퍼 존스의 얼굴만 좋다. 나는 <스타워즈>보다는 ‘서정도 좀더 있고 감정적으로도 좀더 끌어당기는’ <스타워즈 에피소드5: 제국의 역습>이 한 일곱배 정도 좋은데다, 그 이유는 조지 루카스가 직접 메가폰을 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Deeper into Movies>를 읽기 시작한 이후로 카엘이 저승에서 열심히 타자기를 두들기고 있는 상상을 종종 한다. 그녀는 아마도 데이비드 린의 <인도로 가는 길>(1984)에 대해 이렇게 썼으리라. “소심한 영국 기숙사 학생처럼 삐쳐서 14년 동안 칩거하지만 않았더라면 <인도로 가는 길> 정도의 영화야 12년쯤 전에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망상에 즐거워하던 중 카엘이 파킨슨병으로 고통받던 1984년에도 열정적으로 글을 썼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인터넷을 뒤져봤더니 그녀는 이렇게 썼더라. “위대하지 않은 원작으로 존중받을 만한 일을 해냈다.” 말년의 그녀는 무뎌지고 마음씨 좋은 할망구가 됐던 것일까? 물론 아니다. 80년대와 90년대에도 카엘의 독설은 여전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데이비드 린은 마침내 폴린 카엘이 만족할 만한 영화를 만들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