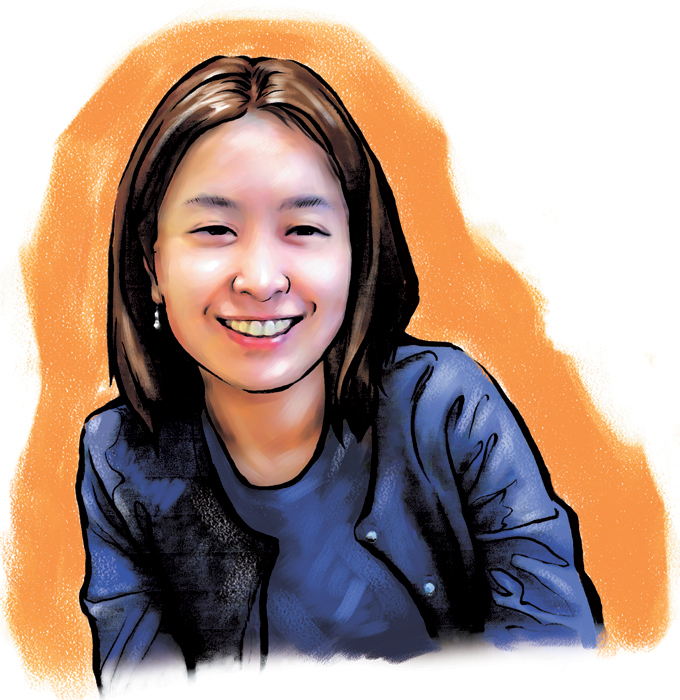3주 전쯤 한 독자가 메일을 보냈다. <씨네21> 기자가 되고 싶은데 주위에 답해줄 사람이 없다며 방법을 알려달라고 했다. 굳이 나를 지목해 메일을 보낸 이유는 ‘입사 초기 지진아에 꼴통이었다’는 요지로 내가 쓴 오픈칼럼을 읽고 용기를 얻어서라고 했다. 일찍 답을 해주고 싶었는데 게으르고 바빠서 며칠 전에야 답장을 보냈다. 언젠가는 <아랑>의 프리뷰에 대해 질문이 있다면서 또 다른 독자가 메일을 보냈다. 어떤 이는 내가 동방신기에 관해 쓴 오픈칼럼을 모 사이트에 올리고 싶다며 괜찮은지 묻기도 했다. 가끔 이렇게, 상대방의 정확한 답을 기다리는 메일들을 받는다.
평소에는 ‘독자엽서’라고 된 온라인 게시판을 종종 확인한다. 자취가 남는다고 해봐야 “기자님, 권상우가 출연한 영화는 <말죽가리 잔학사>가 아니라 <말죽거리 잔혹사>입니다”에 대해 “죄송합니다. 독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혼란을 드린 점, 독자 여러분과 배우 권상우씨 그리고 여러 관계자 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좀더 정확한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도가 전부이긴 하지만 게시판 클릭 수의 5%는 <씨네21> 내부 사람들의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미배달 신고란’이 생기기 전까지 게시판을 찬란히 물들였던 각종 배송사고에 관한 성토들 혹은 접지표지에 관한 불만들을 기자들은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받은 메일에 대해서는 거의 빼놓지 않고 답을 한다. 게시판에 올라온 배송사고나 접지표지에 관한 불만, 기사에 대한 질타들에 대해서는 내가 임의로 답할 부분이 아니므로 그냥 둔다. 그냥 두는데 답답하고 괜히 미안하다. 고생을 사서 하는 성격인데다 누가 내 말에 대꾸하지 않는 건 또 못 참는 성격이라 더더욱 상대방의 ‘아’에 ‘어’라고 메아리쳐주고 싶어하는 것도 같다. 불만이든 단순한 의문이든 바람이든 짜증이든 비난이든, 나에게는 상대방이 무언가를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크게 보인다. 그가 누군가의 반응을 ‘기다릴’거란 생각을 하면 맘은 더 조급해진다.
게시판 글들에 내가 답을 해주게 된다면 뭐라고 하면 좋을지, 오해를 줄이고 정확한 설명을 전할 수 있는 답을 고민하다보면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은 있을 수 없겠다는 결론에 이른다. 개인적으로 받은 메일도 그렇다. 최대한 성실히 답장을 써보내도 그것은 우리가 직접 전화로 대화하는 것만 못할 것이고, 눈을 맞춰가며 표정과 몸짓을 살펴가며 나누는 대화보다는 더 못할 것이다. 만나서 얘기한다 쳐도 여전히 상호 이해의 사각지대는 존재할 것이다. 그래도 묵묵부답인 것보다 반응을 해주는 게 낫다고 믿는 편이라 답을 하고야 말지만, 답장을 쓰다보면 남기는 말보다 지우는 말이 더 많다. 인간관계에서 잡음이 들릴 때마다 ‘낼부터 한마디도 안 하고 산다’고 다짐한 기억만 떠올려도 그 수가 하늘의 별만큼 되지 싶다. 기자시사회장에서 <예의없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말 못하는 킬러로 등장하는 신하균에게 ‘그녀’ 역의 윤지혜가 말했다. “너는 거짓말을 안 해서 좋아.” 아아. 내가 바란 건 그저 당신과 대화를 나누는 것뿐이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