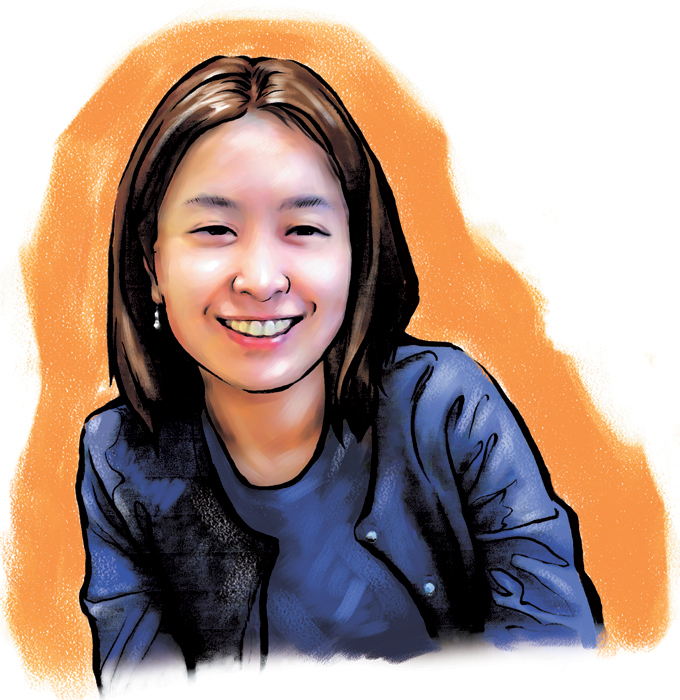언론시사를 놓친 다음에 기사 쓸 일이 생겨 <호로비츠를 위하여>의 일반시사를 찾았다. 저녁을 거른 터라 후배와 함께 노점상에 들러 떡볶이와 순대를 집어먹고 있었다. 갓 입사한 후배가 “며칠 전 <짝패> 보러 간 게 기자시사는 처음이었어요” 한다. “분위기 다르지 않던? 썰렁하잖아” 하고 대꾸해줬더니 후배는 잘 모르겠다는 표정이다.
지난주 금요일 회사 선배와 ‘엠아이쓰리’(<미션 임파서블3>)를 봤다. 극장엔 <달콤, 살벌한 연인>도 걸려 있었다. 두 사람 눈에 <달콤…> 포스터가 눈에 띈 까닭은 영화기자로서 아직도 저 영화를 보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부담 때문이다. “<달콤…>은 다음주면 극장 다 떨어지지 않을까?” “엠아이쓰리는 오래가겠지” 그럼 급한 것부터 봐야 하잖아” “재밌는 거 보고 싶지 않냐?” “그건 그래요” ‘엠아이쓰리’ 표를 두장 끊는데 유후~ 하는 추임새가 절로 나왔다. 며칠 뒤 모 영화 촬영현장을 갔다. 타 잡지사 선배들을 만났다.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엠아이쓰리’ 에 대한 얘기를 했다. “선배도 엠아이쓰리 봤어요?” “돈 주고 극장 가서 봤잖아. 역시 영화는 내 돈 주고 봐야 돼. 영화 재밌더구먼!"
봄날 햇볕 아래 광합성한다고 또 다른 선배랑 옥상 쉼터에 나갔다. 맑고 깨끗하고 따뜻한 것이 근래 들어 최고 날씨다. 둘의 대화는 중심없이 유영하던 중이었다. 선배가 말했다. “첨에 여기 들어와서 1, 2년은 내 인생이 진짜 답답한 거야. 이 밝은 대낮에 시커먼 극장에 일부러 자기를 가둬두고 영화를 봐야 한다는 거잖아. 얼마나 우울하냐.” 나도 그랬었다.
날씨가 좋으면 좋은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활기찬 대낮에 냉랭한 기자들끼리 모여 영화 보는 게 내 일의 중요한 일부라는 것이 오랫동안 서글펐다. 대다수 직장인들처럼 사무실에서 팩스나 복사기와 싸우고 상사랑 신경전을 벌이고 PPT를 쏘아대며 미팅을 하고 사는 것이 건강한 직장생활이라고 나 혼자 단정지어서였는지도 모르겠다. 내 인생은 폐쇄적이 돼버렸다고 생각했다. 4년차가 된 나한테 사람들은 아직도 눈치없이 “너는 영화 공짜로 봐서 좋겠다? 시사회 표 같은 것 좀 주고 그래” 한다. 난 대꾸도 안 한다.
대학 때는 보고 싶은 영화가 있으면 오후 강의 다 째면서까지 극장 달려가는 게 최고의 낙이었다. 대학로 스타벅스의 따뜻한 2층 창가, 삼성동 메가박스의 구석진 의자를 아직도 정겨워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영화를 100% 즐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이다.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내가 보고 싶을 때, 열 일 제쳐두고 달려가 내 돈을 내고 보는 것. 판단할 필요도, 생각을 정리할 필요도, 인터뷰 질문거리를 고민할 필요도 없다. 영화기자라는 내 직업과 아무 상관없이 영화를 즐기는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