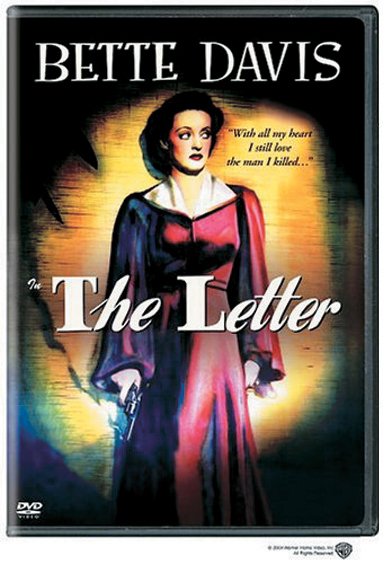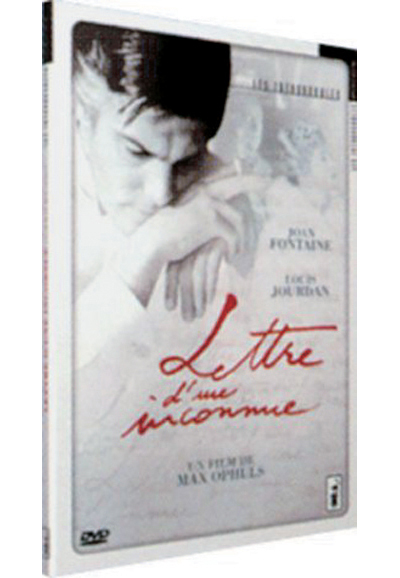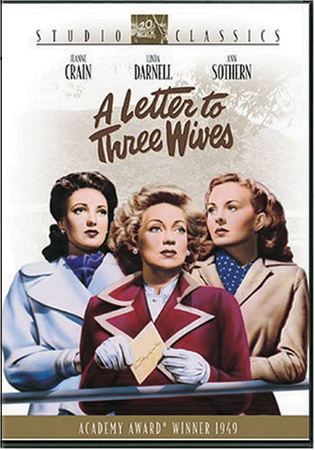그녀들의 죄는 사랑에 빠졌다는 것. 그녀는 떠나버린 연인 때문에 미쳐버렸고, 그녀는 첫눈에 반한 남자에게 모든 걸 바쳤으며, 또 다른 그녀는 사랑의 교만에 빠졌다. 그리고 세 여자는 편지를 쓴다. 그것은 사랑에 대한 확인과 고백과 한숨이었다. 그녀는 왜 남자에게 여섯발의 총알을 쏘았을까? 나를 평생 사랑했다는, 그러나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 그녀는 대체 누구일까? 그녀는 피크닉에 나선 세 부인 중 누구의 남편과 마을을 떠났을까? 이렇게 미스터리로 시작하는 <편지>, <모르는 여인으로부터 온 편지>, <세 부인에게 온 편지>는 결국 희생자로 남은 세 여자의 비가가 되고 만다.
베티 데이비스는 서머싯 몸의 소설과 인연이 깊다. <인간의 굴레>로 스타덤에 올랐던 그녀는 <편지>에서 몸과 다시 만났다. 말레이연방의 이국적 분위기 속에서 벌어지는 살인과 서늘한 복수의 이야기 <편지>의 결말은 원작과 다른데, 달빛 아래 단죄의 의식이 인상 깊다. <모르는 여인…>은 고전적 낭만주의 영화의 극치다. 죽어가는 여인이 남긴 편지가 나직한 목소리로 읽힐 때마다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을까. 세기의 전환점에 유럽에서 태어난 막스 오퓔스 같은 사람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고색창연한 정서가 곳곳에 배어 있다. <세 부인…>과 <이브의 모든 것>으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거푸 수상할 때만 하더라도 조셉 맨케비츠는 자기 앞의 운명을 몰랐을 것이다.
<세 부인…>은 맨케비츠와 니콜라스 레이와 오토 프레밍거가 살아야 했던 1950년대 이상한 할리우드의 전조와 같다. 삶의 진실을 늦게 알아차린, 하지만 영화에선 한번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한 여자가 마지막에 뱉는 작별의 말은 전성기 할리우드에 대한 슬픈 인사처럼 들린다. 펜자국마다 쓴 사람의 마음이 새겨져 있는 게 편지다. 어느 폭풍우 치던 날 편지를 쓴 그녀를 기억한다. 시간이 흐른 뒤 문득 그 편지가 생각나서 목이 메인 적이 한두번인가. 편지가 주는 정서는 그런 것이다. 세 영화는 푸른 물이 흘러내릴 것 같은 시적 낭만의 기록이며, 그 생명력은 동시대의 노벨문학상 수상작인 <메인 스트리트>를 넘어선다. 이런 영화가 다시 만들어지지 못하는 건, 편지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 할 비극이다.
<세 부인에게…> DVD는 폭스가 제작하는 ‘스튜디오 클래식’ 시리즈의 명성을 잇고 있으며, 다른 결말을 포함한 <편지> DVD나 경악할 만한 화질의 <모르는 여인…> DVD 또한 만족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