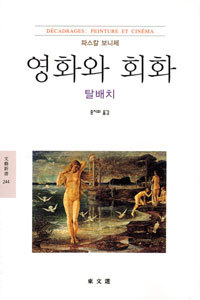국내에 번역되어 있지는 않은 <영화와 회화>(안젤라 댈리 배치, 텍사스대학 출판부 펴냄, 1996)는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의 <붉은 사막>, 에릭 로메르의 , 미조구치 겐지의 <우타마로를 둘러싼 다섯 여인들> 등의 영화들을 각각 한장(章)씩에 할애해 논의를 해가는 책이다. 물론 영화의 제목에서 기대할 수 있듯이, 그리고 ‘미술은 영화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라는 부제에서 또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책이 다루는 그 영화들은 모두가 회화적인 원천이 존재하고 그것을 참조한 것들이고 자연히 여기서 저자는 그것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시각적 이미지를 공통분모로 가진 영화와 미술 사이의 상호관계에 집중한다.
파스칼 보니체의 <영화와 회화>는 사람들에게 그 제목 때문에라도 혹 앞에서 언급한 <영화와 회화> 같은 유의 책은 아닐까, 하는 선입견부터 심어줄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원서의 주제목은 ‘데카드라주’(decadrage: ‘탈배치’라고 번역된 이 용어는 ‘벗어남’과 ‘프레이밍’이란 단어를 합성한 말이다)이고 부제가 ‘회화와 영화’인 이 책에서 보니체는 “영화와 회화 사이의 다양한 접촉, 교통, 교차지점들을 확립하려” 하지만 앞에 예로 든 책과 비교하면 좀더 은밀하고 미묘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려 한다. 흥미로운 예를 하나 들어보자. 이 책에서 보니체는 영화와 연극매체 사이의 중요한 차이로, 전자가 무의지적이고 하찮은 거짓말을 보여주는 데 반해 후자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점을 든다. 보니체에 따르면 그건 연극에는 피사범위 밖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영화는 시계(視界) 밖의 공간이 가진 힘을 작동시킬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이 이미지는 의식(意識)이 된다. 그리고 이건 다름 아닌 회화가 영화에 요청한 것이다. 그렇게 회화와 영화는 흥미로운 만남을 갖는다.
이 예에서처럼 프레이밍을 문제삼거나 아니면 그 밖에도 클로즈업의 문제, 이미지가 관계하는 현실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문제 등등을 꼼꼼하게 고찰하면서 보니체는 이미지의 역사 안에서 영화를 사고하려 하고 영화의 존재론을 밝혀보려고 한다. 그래서 <영화와 회화>는 영화-이미지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가진 독자에게 지적인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하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렇기에 독자로서 이건 따라가기에 그리 쉽지만은 않은 책인데, 게다가 다소 껄끄러운 번역 때문에 읽기의 부담이 하나 더 가중되었다는 점이다. 시퀀스-영상(플랑 세캉스), <탕 모데른>(<모던 타임즈>) 등의 적지 않 실례들은 종종 너무 부주의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파스칼 보니체 지음 | 홍지화 옮김 | 동문선 펴냄]홍성남/ 영화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