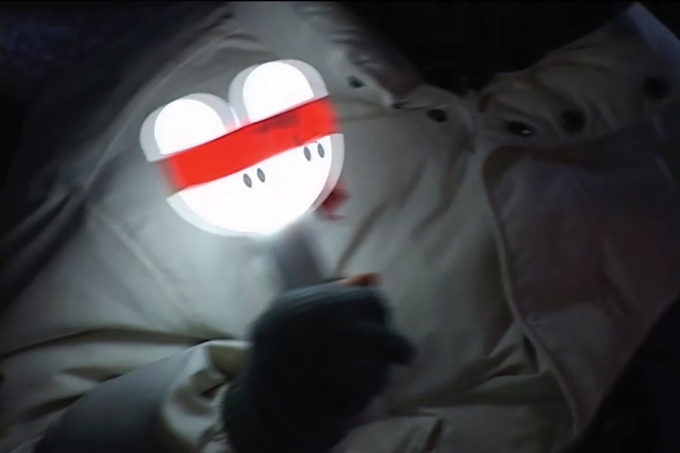이원우 감독이 인스타360 ONE RS 1인치 카메라를 사용해 촬영한 탄핵 집회 현장.
이원우 감독이 인스타360 ONE RS 1인치 카메라를 사용해 촬영한 탄핵 집회 현장.
“벽은 앞으로 자란다.” 작고한 이강현 감독이 <파산의 기술>(2006) 속 내레이션을 통해 말했던 것처럼 시간은 흐르고, 벽은 앞으로 자라며, 사건은 켜켜이 쌓인다. 카메라는 그것들을 기록한다. 지난해 12월3일 국가 계엄이라는 초현실적 사건을 마주한 다큐멘터리스트들 역시 계엄 이후 5달간 이어진 지난한 시간의 연속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여의도, 안국동, 한남동, 경복궁, 한강진, 남태령의 광장이 가지각색의 응원 봉으로 가득 차 일렁이고 있을 때, 수많은 카메라는 언제나 그랬듯 민중의 사이사이를 헤집었다.
그러나 <언더그라운드> 등을 연출한 김정근 감독의 말처럼 “다소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이번 사태는 지금의 다큐멘터리스트들이 자신의 필요성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주기도 했다. 집회에 나선 모든 시민이 스마트폰이라는 자기만의 카메라를 통해 현장의 모습을 유튜브와 엑스(전 트위터)로 실시간 송출할 때 과연 ‘다큐멘터리영화’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영화 매체의 존재론적 위기가 수없이 이야기되는 작금, 다큐멘터리의 영역 역시 자신이 할 수 있는 실천의 고민을 맞닥뜨린 것이다. 그럼에도 다큐멘터리스트들의 발걸음과 시도는 끊이지 않았다. “아, 뭐라도 찍어야겠다”(<잠자리 구하기> 홍다예 감독)라는 마음의 소리는 그들을 현장으로 이끌었다. 아마 지금도, 현장에서 채록한 온갖 푸티지를 가지고서 자기만의 영화를 골똘히 매만지고 있을 다큐멘터리스트들의 현황과 고민, 그리고 실천적 해법을 수집했다. 한편 제작과 공개를 앞둔 몇몇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며 근래의 다큐멘터리영화가 어떠한 갈래로 퍼져나가고 있는지 살폈다.
미디어 환경의 변화, 다큐멘터리영화의 정체성은?
 홍다예 감독이 집회 현장을 기록 중인 시민을 촬영한 사진.
홍다예 감독이 집회 현장을 기록 중인 시민을 촬영한 사진.
12·3 계엄 이후 다큐멘터리스트들의 대응은 급박할 수밖에 없었다. 일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퇴진 집회,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 등 커다란 사회적 사건이 비교적 점진적인 사태로 불거졌던 것과 달리 12·3 계엄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예외적 사례였다. 이를테면 2016~17년 무렵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당시엔 <두 개의 문> <공동정범> 등을 만든 김일란 감독을 중심으로 기존에 활동하던 다큐멘터리스트들이 기록 연대를 펼쳤고 비상행동 미디어팀을 조직해 활동했다. 이로부터 다수의 감독이 참여한 옴니버스 다큐멘터리 <광장> 등이 2017년 6월경 공개되기도 했다. 2000년대 무렵부터 이어진 독립다큐멘터리 신의 점성이 사회적 사건에 대응하는 중추가 되는 편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당시 비상행동 미디어팀에 참여했고, 4·16연대 미디어위원회 활동 등으로 꾸준히 사회파 다큐멘터리 신에 몸담아온 박소현 감독(<야근 대신 뜨개질> <애프터 미투>)에 따르면 “미디어 환경의 변화 때문인지 다큐멘터리 신의 연대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많은 다큐멘터리 감독이 이미 각자의 현장에서 촬영을 이어가고 있었다”. 시급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끈끈한 조직보단 기민한 개인의 힘이 먼저 두드러졌던 셈이다. “아무래도 과거엔 촬영 장비를 전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문 감독들의 재빠른 합심이 중요했다면 지금은 일상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가진 사람 모두가 각자의 아웃풋을 산출하는 모양새”(박소현)가 나타난 것이다.이러한 환경에서 자연스레 찾아오는 고민은 다큐멘터리영화의 정체성 문제였다. <206: 사라지지 않는> 등을 연출한 허철녕 감독은 많은 다큐멘터리 관계자가 ‘현장에 가장 많이 카메라를 들고 다녔던 감독’으로 꼽은 이다. 많은 현장을 경험할수록 그의 고심 역시 깊어질 수밖에 없었다. “기존의 독립다큐멘터리가 신속성이나 현장성, 즉 남들이 가지 못하는 깊은 곳까지 빠르게 카메라를 들고 간다는 ‘본령’을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의 다큐멘터리스트들은 과연 자신의 어떤 의제와 담론을 설정할 수 있을지 생각할 수밖에 없던”(허철녕) 시간이었다. 김정근 감독의 의견 역시 유사했다. “문학계나 디자인 업계는 즉각적으로 뭉쳐서 자신들의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왜 다큐멘터리스트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을까?”란 상념에 빠진 것이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 시시각각 밈과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재생산되고 있으므로 다큐멘터리스트들의 특별한 재해석을 요청하지 않는단 느낌”(김정근)이 다큐멘터리스트들의 고민 전반으로 퍼지게 됐다.
<애프터글로우>(가제) - 허철녕 감독
허철녕 감독은 소니 PD-170 카메라를 들고 각종 현장을 누볐다. 옛날에 사용되던 저화질의 카메라를 쓴 이유는 감독이 보기에 계엄으로 열린 광장이란 공간이 “일종의 환상 같은 느낌”을 주었기 때문이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모였다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지만, 이 광장에서 터져나온 기후·환경·노동·젠더·장애인 이슈 등은 이어질 것이다. 집회에서 동지였던 사람들이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미래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모든 것이 될 것이다’라는 <인터내셔널가>의 가사처럼, 12·3 비상계엄 이후 열린 탄핵 광장의 역동적인 에너지는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진보적 의제를 외치는 시민들로부터 시작되었다. (중략) 그러나 윤석열 파면 너머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외쳤던 광장의 약속들은 극우 세력이 아닌 내 옆을 지켜주던 민주 광장의 동료 시민들에 의해 하나둘 부정당하기 시작한다. 우리의 광장은 너와 나의 다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공간이었을까, 아니면 구분하고 배제하는 공간이었을까. 알록달록한 응원 봉 불빛이 건네는 광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맞이하게 될 미래는 계엄이 아니라 더 큰 파국이 될 것이다.”(허철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