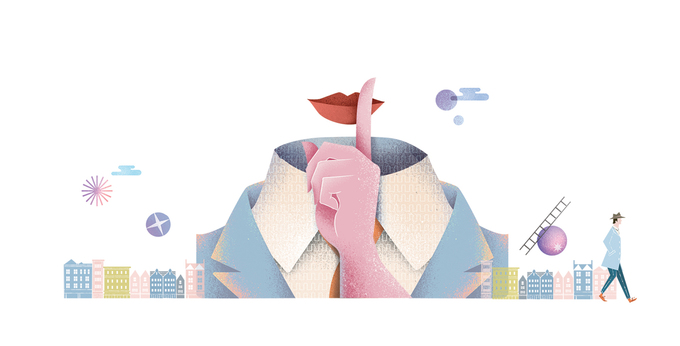그날은 Y가 출근 버스 안에서 졸아 종점까지 가버린 어느 날이었다. 그날 아침 마법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바뀌었다. 정확히는 Y를 뺀 세상 전부가. Y가 출근한 직장에서는 자신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며, 집으로 돌아가자 그곳엔 다른 이가 아무 일 없듯이 살고 있었다. Y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번호였다. 문자 그대로 세상에 자신의 존재와 정보만 증발해버렸다. 세상에 Y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Y의 간절한 바람이 하늘을 움직였던 것일까.
사라지고 싶다. Y는 최근 한숨을 내쉴 때마다 사라지고 싶다는 말을 달고 살았다. Y는 그냥 사라지고 싶었다. 어딘가 떠나버리거나 죽고 싶다는 것과는 달랐다. 그런 일들은 흔적이 남는 일이다. 자기 죽음으로 누군가에게 짐이나 혹은 감정적인 부담을 주기는 싫었다. Y는 자신의 존재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증발했으면 했다. 나라는 존재 바깥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소거하는 방법을 알고 싶었다. Y는 다른 사람을 추적해 개인정보를 캐내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일명 ‘스킵 트레이서’라는 미국인이 지은 책 <흔적 없이 사라지는 법>을 읽기도 했다. ‘실전 잠적의 기술’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Y가 내린 결론은 ‘불가능’이었다. 살아 있지만 죽은 것처럼 살거나 다른 사람처럼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지 않았다. 미국이라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높은 인구밀도와 좁고 다층적인 사회관계망을 보이는 우리나라에서 흔적 없이 사라지는 방법이란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 보였다.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다. Y가 그토록 원했던 일이. 하지만 곧 상황은 자신이 잊히면 자유로워질 거란 예상과는 다르게 전개되었다. 세상이 Y라는 존재를 깨끗하게 잊자 자신의 존재 자체를 증명해내야만 했다. 집도 없고, 예금도 없이 Y라는 이름으로 누렸던 경제활동을 이어나갈 방법이 전혀 없었다. 나라는 정체성을 존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자신의 연속된 기억이라면, 세상의 기억도 마찬가지였다. Y가 사라져버린 세계에서 결국 삶을 다시 이어가기 위해 자신이 Y였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는 역설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때 Y를 도와준 것은 한 방송사였다. Y의 사연을 들은 TV프로그램은 Y를 아는 사람을 공개수배했다. 그렇게 Y의 이야기는 전국으로 알려졌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사람 Y는 순식간에 모든 사람이 알아보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Y를 아는 사람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다. 세상 모두가 ‘아는’ 사람이 되었지만, 정작 Y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Y는 이제 어디를 가도 자신을 알아보는 이들이 말을 걸었다. 방송에 나왔던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냐며 사람들은 그를 알은체했다. Y는 결국 세상에 자신을 아는 사람 없이 자신의 흔적이 완벽히 사라져버렸지만 이로 인해 동시에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아는 이 상황이 혼란스러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