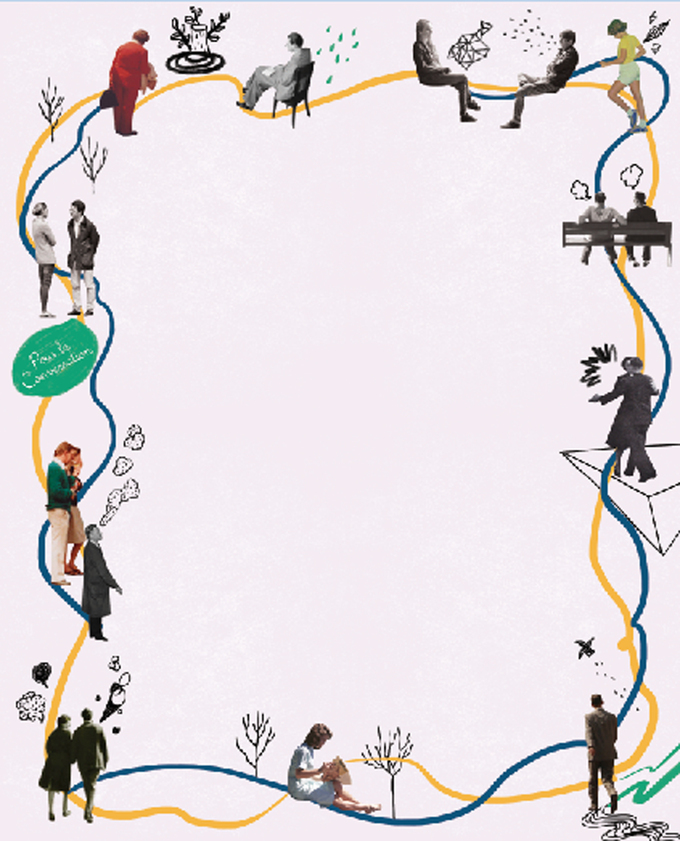미국 중북부의 한 도시에 두달 넘게 머물고 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한국의 1년보다 더 많은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 오해를 살까봐 말하는데, 한국에서 나는 왕따가 아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도 아니다.
이유는 단순하다. 나는 이곳의 친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소개받았고 간혹 초대를 받아 모임에 갔다. 이때 대화 상황은 대부분 ‘집’에서 발생했다. 정원의 화초, 반려견, 준비한 요리…. 대화의 소재는 계속 뻗어갔다. 최근 접한 기사와 책, 참여한 지역 행사와 학회, 이 모든 것을 거미줄처럼 엮는 지식과 경험.
나는 생각했다. 자유로운 거주가 가능한 물리적 장소야말로 대화를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건이다. 그 장소에서 자아와 타인이 연결되는 빈도와 강도는 높아진다. 이는 분명 중산층 이상의 계급에 유리한 조건이다. 그들에게는 정원이 딸린 집과 재정적 뒷받침을 해주는 직업이나 세습 재산이 있다.
그러나 집이 있다고 늘 대화가 가능한 건 아니다. 일단 당신이 집에 누군가를 초대하려면 신뢰할 만한 인맥에 속해야 한다. 당신은 집 안에 기억과 정체성이 녹아든 재료들을 지녀야 한다. 당신은 그 재료들을 다른 재료들과 조합하고 가공해서 ‘서사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대화 상대 또한 적어도 당신만큼의 대화적 자원과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혼잣말은 대화가 아니니까.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집이라는 장소뿐만 아니라 그 장소에 담는 대화적 자원과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대화적 능력이다. 내가 누군가를 집에 초대한 적이 있던가? 혹은 내가 누군가의 집에 초대받은 적이 있던가? 집이 아닌 장소들, 커피숍, 식당, 술집에서 나는 타인들과 어떤 말을 나눴던가?
집은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이 명제는 우리에게 계급적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장소를 점유하고 그 안에 대화적 자원을 비축할 수 있는 한, 우리는 대화적 능력을 학습하고 키워나갈 수 있다.
지금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장소 투쟁은 소유권 너머의 권리를 가리킨다. 당신이 장소를 소유하지만, 잠과 TV 시청을 뺀 모든 활동을 ‘아웃소싱’한다면, 그곳에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당신이 장소를 소유하지 않지만, 거기 거주하며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면, 대화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비록 이런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 테지만.
어떤 순간, 어떤 장소에서 반딧불처럼 명멸하는 대화 상황도 존재한다. 나는 이곳 호숫가의 노점 카페에서 일하는 한 노인 여성에게 담뱃불을 빌린 적이 있었다. 그녀는 “여기서 담배 피우는 사람 정말 찾기 힘들어. 오늘 운 좋은 줄 알아!”라고 유쾌하게 말했다. 우리는 호숫가 벤치에 앉아 함께 담배를 피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내가 한국에서 왔다니까 그녀가 말했다. “한국 가난하지? 여기서 열심히 돈 벌어서 가족한테 부쳐.” 이제 한국은 예전처럼 가난하지 않다고, 평균적으로는 잘사는 축에 속한다고 말했더니 그녀가 부끄러워하며 말했다. “그래? 역시 사람은 배워야 해. 오늘 하나 배웠네. 미안해.”
그때 못한 말을 지금 해본다. 한국은 부자 나라인데 자꾸만 어떤 것들이 사라지네요. 담배와 벤치만 있어도 대화는 가능하네요. 역시 사람은 타인과 대화를 해야 해요. 그날 하나 배웠네요. 고마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