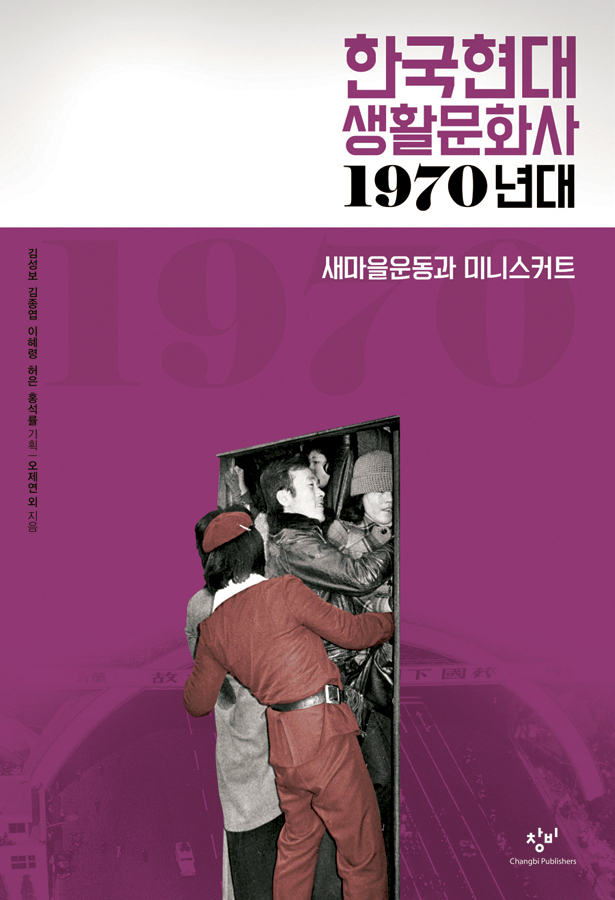건국절 논란부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까지, 언젠가부터 한국 현대사는 우리 사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애물단지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그러는 와중에 정작 중요한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로서의 현대사마저 밀쳐두고 있는 건 아닐까?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우리의 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어머니·삼촌·이모들이 살아온 이야기를 더듬으며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한국 현대사에 대한 편견을 깨보자. 바로 요즈음 각광받는 역사 읽기의 신조류 ‘한국현대생활문화사’를 소개한다.
‘위험한 아이들’의 시대
1970년대는 흔히 통기타와 고고춤,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즐긴 낭만적인 청년의 시대로 기억된다. 그러나 당대의 소위 사회 지도층은 청년들을 그리 곱게 바라보지 않았다. 언론은 ‘조국 근대화’의 과업을 수행하지 않는 청년 세대를 혹독하게 비판했다. 대학생은 ‘퇴폐업소 숲’에서 사치와 낭비풍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여름철 피서지의 10대 남녀들은 “통금시간이 지나면 남녀가 한쌍씩 어울려 천막 속으로 사라지”는 풍기문란을 일삼는다며 당시의 청년들을 ‘위험한 아이들’로 규정하고 선도의 대상으로 삼았다. 정권은 ‘건전하고 명랑한’ 문화기풍을 만들려고 했지만, 1970년대 사람들은 권력자가 볼 때 ‘퇴폐적이고 저속한’ 대중문화를 향유하며 체제의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다. 오늘날 1970년대의 대중문화가 저항정신과 야성이 살아 있는 독특한 문화현상으로 각광받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때는 그랬다.
부동산 불패신화가 시작되다
평생의 소원이 ‘내 집 마련’이던 사람들은 새롭게 쏟아지는 아파트 분양에 목을 맸다. 몇 차례 분양에 당첨되고도 입주금이 없어 돌아섰던 사람들은 분양권을 팔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알아차렸다. 초등학교 교사 출신의 투자 전문가가 등장하는가 하면, 묵혀둔 땅에 아파트가 들어서며 벼락부자가 된 이들이 속출했다. 1963년부터 1979년까지 16년 동안 강북지역인 중구 신당동의 땅값이 3만원에서 50만원으로 17배가량 오른 데 비해 같은 시기 강남구 신사동의 땅값은 400원에서 40만원으로 무려 1천배가 올랐다는 사실은 강남을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1천배가 오른 이후에도 오늘날까지 꺼지지 않는 부동산 가격 덕분에 강남발 부동산 투기 열풍은 여전히 꺾일 줄 모르고 있다.
부유층의 삶, 서민의 삶
1970년대 내내 “중동산 수제 카펫, 매킨토시 앰프, 실내 사우나, 인공폭포”를 갖춘 집에서 호화생활을 하는 부유층의 이야기가 간간이 신문을 장식했다. 이들이 바로 고도 경제성장의 수혜자들이었고, 서민들은 선망과 시기의 눈초리를 동시에 보냈다. 그 반대편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15원 만원버스에 생명을 담보하고 ‘러시아워’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운전수 양반들에게 아첨해야” 하는 고달픈 생활을 이어나갔다. 그런데 그때로부터 반세기 가까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러한 모습이 겹쳐지는 건 왜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박정희 신화’만큼이나 중요한 ‘박정희 시대를 살아간 이들의 신화’를 깊게 들여다보자. 산업전사의 피땀부터 미디어스타의 웃음까지 생생하게 그려낸 생활 문화사가 도움이 될 것이다.(<한국현대 생활문화사: 1970년대> 참조, 다음 회에 계속)
영자의 전성시대. 보따리만 들고 무작정 도시로 올라온 여성의 삶은 그 자체로 영화가 되었다. 1970년대의 도시는 그들에게 가정부, 버스 차장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했다. 그럼에도 이 시대 수많은 영자들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