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에서 배운 것으로 졸업도 하지 못했지만, 이후 대학에 재학한 시간의 3배를 사회생활에 쓰면서 종종, 어쩜 이렇게 대학 때 배운 걸 써먹을 데가 없을까 생각하곤 한다. 그러다 문득 프랑스 요리점에서 주문할 때 서버를 놀래킬 수 있는 프랑스어다운 발음을 구사할 수 있다든가, <르몽드>의 트위터 계정을 팔로할 수 있다는 장점이 떠올랐고, 나아가 그 5년을 기점으로 취향의 축이 이동했다는 데 생각이 미쳤다. 초등학생 때부터 고등학생 때까지 내 세계를 구성한 소설과 음악의 성분은 영미권의 그것에 러시아의 풍미를 살짝 더한 정도였다. 대학에서의 시간은 주재료(영미권)를 바꾸지는 않았지만 프랑스적인 어떤 것을 확실하게 착 향시키는 데 성공한 것 같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몇 작가와 작곡가는 프랑스 사람이고, 그 것은 너무나 결정적이어서 내가 앞으로 100번 이사를 더 다닌다고 해도 버리지 않을 책과 음반들의 컬렉션 중심을 잡는다. 그중 하나만 예로 들면 발자크다. 작가로서의 발자크, 물론 중요하지만 인간 발자크를 나는 정말 좋아한다. 앙카 멀스타인이 발자크 소설 속 음식 묘사에 대해 쓴 책 <발자크의 식탁>을 읽으며, 이 미친 인간, 자기 절제라고는 모르는 인간, 돈과 물건과 음식, 여자에 대해서라면 취향이라고 부를 것도 없었던 인간을 다시 한번 끌어안게 되었다.
내가 좋아하는 인간 발자크의 이야기는 <츠바이크의 발자크 평전>에서 더 잘 말하고 있지만 그 책이 슈테판 츠바이크 자신의 자살을 앞두고 마무리해가던 것임을 감안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문을 두드린다’의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면, <발자크의 식탁>은 ‘사로잡힌 인간’ (무엇에?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의 불안정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마음에 든다.
발자크는 글을 빨리 썼다. 왜냐하면 채권자들에게 쫓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와중에도 그는 방문을 닫아걸고 풍부한 상상력이 채찍질하는 대로 하루 18시간씩 글을 썼다. <고리오 영감>은 그렇게 2달여 만에 초고가 완성된 작품이었다. “창작 기간 내내 발자크는 물과 커피만 마셨고 과일로 연명했다. 가끔 아침 9시에 삶은 달걀을 먹거나, 배가 정말 고프면 버터와 함께 으깬 정어리를 먹었으며 저녁에는 닭 날개나 구운 양고기 한 조각을 먹은 후 맛있게 내린 블랙커피 한두잔을 설탕 없이 마시는 것으로 식사를 마무리했다. 그렇다면 우리의 발자크는 금욕주의자였던 것일까? 어느 정도는 그랬지만 언제나는 아니었다. 최종 원고가 인쇄업자에게 넘어가면 발자크는 레스토랑으로 달려갔고, 먼저 굴 100개를 주문해서 화이트 와인 4병과 함께 먹어 치운 후에 본격적으로 식사를 시작했다. 해수 목초지에서 키운 양고기 커틀릿 12조각을 소스 없이 요리해 달라고 주문했으며 순무를 곁들인 새끼 오리 요리와 오븐에 구운 자고새 한쌍, 노르망디산 넙치를 주문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글을 쓸 때 발자크가 직접 장을 봐 요리를 한 음식을 본 그의 누이들은 쥐가 먹을 법한 음식이라고 평했다. 양극단을 오가는 이런 특징은 그가 감옥에 갔을 때도 발휘되었다(7월 혁명 이후, 파리 시민은 매년 며칠 동안 국민 방위대에서 복무해야 했는데 이를 어겨서 하루 동안 투옥되는 벌칙을 받게 되어 있었다. 발자크는 여러 차례 병역의 의무를 회피했다). “남은 음식을 놓고 옥신각신 다투던 간수들은 이 수감자가 음식에 후한 데다 무심하기까지 하다는 사실에 기뻐했고 발자크를 정이 많은 사람으로 추억하기에 이르렀다.”
발자크라는, 자신이 쓰는 소설 속에서 음식을 통해 인물의 계급과 성격을 설명한 소설가에 대한 책인 <발자크의 식탁>은 발자크가 살던 시대 파리의 음식 문화의 변화도 자세히 다루고 있다. 발자크가 태어난 1799년은 나폴레옹이 프랑스 정부의 첫 번째 통령이 된 해였다. 프랑스 혁명 이후 프랑스는 식문화의 격심한 변화를 겪고 있었다. 혁명 이전, 상류층은 하루에 3번 식사를 했다. 농부나 노동자들은 하루에 2번만 식사를 했다. 서퍼(supper)라고 불리는 저녁식사는 하루의 끼니 중 가장 나중에, 밤 9시에나 먹는 것이었는데, 무도회나 공연을 즐기는 특권층만이 누릴 수 있는 사치였다. 이것이 프랑스 혁명으로 사라졌다. 그후 하루의 마지막 끼니는 디네(dinner)라고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식사를 하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요리 역시 그 중요성이 높게 취급되었다.
<발자크의 식탁>은 아마 평생 입에 대지 못할 음식들을 실컷 만나게 해주는 책일 것이다. 하지만 사실 음식을 빙자해 발자크 소설의 풍성한 일상 묘사의 대목들을 빛나게 한다. 막판에 등장하는 ‘침대와 식탁’, 즉 성생활에 대한 발자크의 조언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기분이 드는 게 사실이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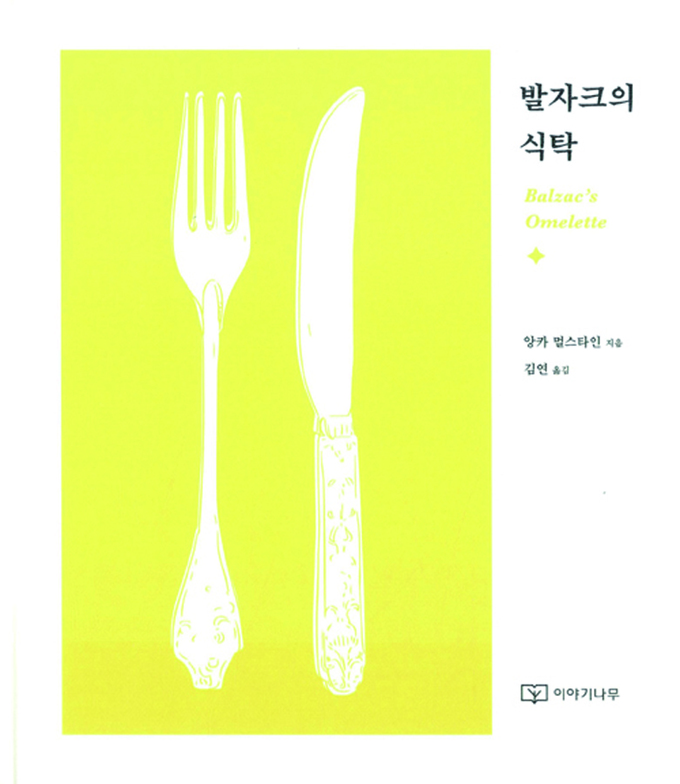
 에서 책구매하기
에서 책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