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는 일을 업으로 하게 된다면 가능한 한 일찍 겪어보면 좋은 것이 ‘(제대로 된) 엄격한 교정’이다. 오탈자 잡기는 기본이고, 습관적으로 반복해 적는 군더더기 표현들을 지운 뒤, 어색한 표현이나 문장 호응을 맞게 수정하고 나면 글이 다이어트라도 한 양 확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된다. 나도 신의 손을 만난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교정지를 들고 그 선배에게 가서 “굳이 왜 이렇게 고쳐야 합니까?”라고 따졌다. 설명을 들으며 이유를 납득했고, 이후로는 그 선배가 고치는 부분을 눈여겨봤다.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를 읽으며 그때 생각이 났다.
원고 교정에 대한 필자들의 원성(혹은 원한)을 모아 책으로 만든다면 지구 세 바퀴 반을 돌 정도로 많다. 최근 책을 낸 사람을 만나 물어보라. 그들의 불만을 요약하면 이렇다. “꼭 이렇게까지 고쳐야 해?” 문법적으로 틀리지 않았다면 그냥 고치지 말고 그대로 두고 싶다는 말이다. 서투른 교정자들이 문장의 뜻을 바꿔버리는 실수를 하는 일이 적지 않고(사실 많다), 그런 경우야 당연히 바로잡아야 하지만, 뜻밖에도 단순한 습관을 자기 문장의 특성이라고 착각하는 필자도 많다.
20년 넘게 단행본 교정 일을 했다는 김정선의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는 기초부터 시작해, ‘의’와 ‘적’을 쓰는 습관이 들어 있지 않나 묻는다. ‘문제의 해결’, ‘사회적 현상’ 같은 표현이 대표적인데, 어찌나 ‘의’, ‘적’에 익숙해 있는지 지우면 ‘자연스럽지 않다’고 느끼는 지경에 이르렀다. “사과나무들에 사과들이 주렁주렁 열렸다” 같은 경우, ‘들’의 반복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들’의 사용은 조금 더 예민하게 살펴야 하는데 번역문의 경우 사과와 사과들, 사과나무와 사과나무들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상황에서 한국어의 자연스러움만을 목표로 고쳐버리면 뜻이 달라진다. 실수가 반복되는 표현들을 언급할 때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가 보여주는 유머도 놓쳐서는 안 된다. ‘굳이 있다고 쓰지 않아도 어차피 있는’이라는 항목은, 보조동사로 쓰는 ‘있다’를 체언을 꾸미는 관형사로 만들어 쓰는 습관에 대해서다. “멸치는 바싹 말라 있는 상태였다”는 “멸치는 바싹 마른 상태였다”로 충분하다.
이 책의 클라이맥스라고 부르고 싶은 장은 ‘당하고 시키는 말로 뒤덮인 문장’이다. 피동형을 쓸 수 없는 동사가 있는데 그 목록을 이 책에서 언급한 것만 골라도 꽤 된다. ‘데다(불이나 뜨거운 기운으로 말미암아 살이 상하다), 배다(냄새가 스며들어 오랫동안 남아 있다), 설레다(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들떠서 두근거린다), 개다(궂은 날씨가 맑아진다)’가 그 단어들이다. 김훈의 문장에 대한 글이나 문장 다듬기 사례는 각별히 재미있으니 놓치지 마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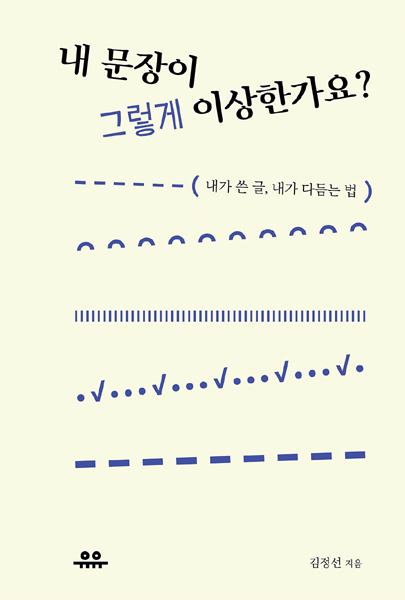
 에서 책구매하기
에서 책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