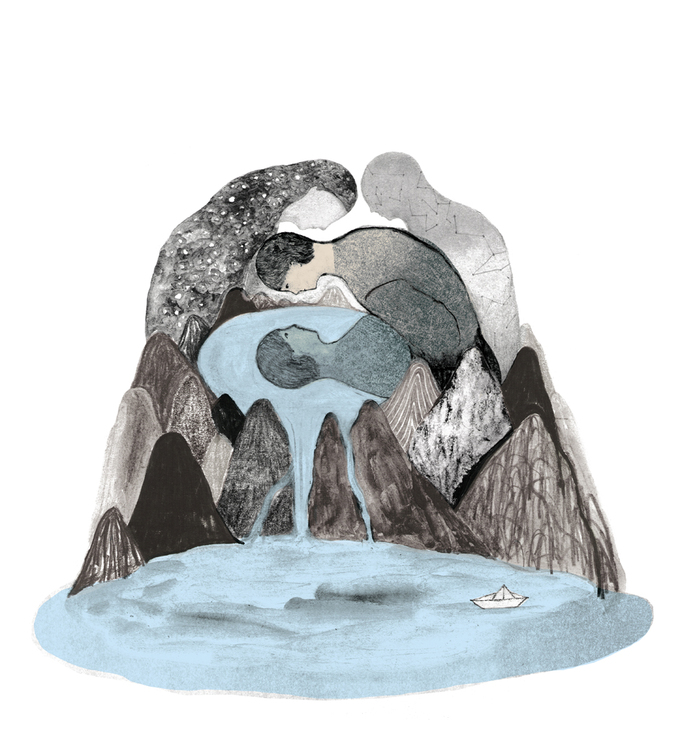흔히들 연말이면 다사다난했던 한해라고 일년을 정리하곤 하지요. 나는 살짝 비틀어 이렇게 말해보고 싶네요. 올 열두달이 아주 ‘가지가지’하더라고. 워낙에 가지를 좋아해서 그 보라에 반해서 요 가지에게만큼은 불평을 싣지 않으려 했으나 어쩌겠어요. 그게 딱 그 맨홀에 그 구멍인 것을요. 생각해보니 집 앞 손바닥만 한 텃밭에 심었던 가지 농사도 올해는 가뭄이 들어 망조였지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요. 가만, 여러분들은 괜찮았는데 나만 매번 실패를 실패에다 감아댔던 걸까요.
며칠 전 3호선 지하철을 탔는데요, 도르르 노란색 실이 두툼히 감긴 실패가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거였어요. 철로의 덜컹거림에 따라 노란 실패는 바퀴도 아니면서 전투적으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지 뭐예요. 그런데 서서 가는 사람이나 앉아 가는 사람이나 누구 하나 줍지를 않아요. 그게 특별한 재주여서 그 묘미를 감상하는 맛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군가가 실수로 흘린 실패였을 텐데 나 몰라라 그저 쳐다보고들 있는 거예요.
순간 나는 그 모두의 내버려둠을 보아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일에 직접 나서서 관여하지는 않고 곁에서 보기만 하는 그 태도가 바로 방관이잖아요. 문제의식은 있는데 직접행동은 하지 않는, 저마다 눈은 있는데 모두가 팔은 감춰버린 듯한 답답함. 그러니까 당장 내 집 안에 비새는 일이 아니라면 윗집에도 비샐까 하는 염려는 절대로 안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집회 현장보다 점집 현황이 그야말로 파죽지세인 건가 봐요. 실은 내가 그날 3호선 지하철을 탔던 것도 누군가의 권유로 들르게 된 한 점집을 가기 위해서였으니까요. 나를 처음 보는 사람이 나에 대해 줄줄 읊어요. 맞는 소리도 있고 틀린 헛소리도 있지만 그래도 대화 틈틈이 어머 진짜요? 그럼 어떡해야 하나요? 정도의 추임새는 거저 흘러나오기 마련이더라고요. 왜? 앞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존재니까요. 제 죽을 날과 시를 물으러 가는 사람도 혹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점집 대문을 밀고 들어가는 건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고 싶어서라는 게 합당한 이유 중 하나라죠.
양반다리를 하고 상다리를 마주한 상황에서 내가 앞에 계신 분께 물었죠. 녹음을 해도 될까요, 머리가 워낙 나빠 돌아서면 까먹어서요. 그러십시오, 녹음이 아주 잘될 위치에 녹음기를 놓으세요.
30분 뒤 나는 점집 맞은편 카페에 앉아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녹음 내용을 손으로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들을 말만 듣고 말아버릴 말은 버려도 되련만 나는 그와 내가 ‘나’를 놓고 벌이는 대화를 나도 모르게 쓰고 있더라고요. 왜? 나는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니까요. 그러려면 나 자신에 대해 보다 정확히 아는 일이 중요할 것 같았으니까요.
내가 모르는 나를 안다고 말하는 이와 나눈 대화록을 가끔 펼쳐보고는 해요. 평생지기 친구가 없어 삶의 순간순간을 더 갈팡질팡하게 되는 사람이라면 이 노트가 아주 요긴하게 도움이 될 거라고도 믿어요. 돈을 묻고 연애를 물을 작정이라면 결단코 반대인데요, 내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다면 일년에 한두번쯤의 방문에는 찬성이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