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2년(영조 38년)에 벌어진 임오화변은 말 많고 탈도 많은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스캔들이다. 영조가 사도세자를 산 채로 뒤주에 가둬 8일 뒤 세자가 사망한 이 사건은, 친자살해라 부를 만한 말초적인 키워드만으로도 350년을 넘긴 현재까지 세간에 오르내리고 있다. 사도세자가 까다로운 아버지의 기대에 괴로워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한 가엾은 사람이라는 의견은 정설처럼 전해져 수많은 대중문화로 재생산됐다.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 한석규와 송강호가 각각 영조를 연기한 드라마 <비밀의 문>(2014)과 영화 <사도>가 그리 길지 않은 간격을 두고 세상에 나왔다는 건, 임오화변이라는 사건의 힘이 여전히 유효함을 증명하는 지표다.
국문학자 정병설은 (문학동네 커뮤니티에 연재한 글을 묶은) <권력과 인간>을 통해, 기존의 해석과는 전혀 다른, 사도세자가 영조를 반역하려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는 주장을 펼친다. 태도는 퍽 공격적이다. 서두부터 임오화변이 당쟁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을 굳힌 특정한 글과 그 작가를 지목해 비판하길 서슴지 않는다. 정병설이 국문학자로서 무기로 삼은 건, 사건에 관한 자료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눈이었다. 그는 혜경궁 홍씨의 격정적인 글 <한중록>이 사도세자의 죽음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유독 완곡한 태도를 취하고, 정조가 제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승정원일기>의 일부를 파기했다는 데 의혹을 품은 채 감춰진 행간을 읽어내며 나름의 진실을 좇았다. 이준익 감독은 <권력과 인간>이 나온 지 3년이 지나 <사도>를 만들면서, 정병설의 주장에 동의하고 그에게 영화의 감수를 부탁했다.
<권력과 인간>은 사도세자의 죽음뿐 아니라 조선 왕조에서 일어난 일을 드러내고자 했다. 그래서 임금, 왕비, 대비, 후궁, 세자, 내관, 내인 등 궁궐 안 사람들의 현실과 욕망에도 시선을 돌려 권력을 향한 이해관계가 뒤엉킨 궁중의 모습을 끈질기게 그렸다. 군데군데 배치된 ‘궁중 요리의 진수’, ‘사도세자의 친필시’, ‘임금 침실의 풍경’ 같은 보너스는 질식할 듯한 본문의 공기를 환기시킨다.
사건에 관한 자료를 정확하게 읽어내는 눈
권력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권력은 부자, 형제까지도 싸우게 한다. 대비가 임금에 버금가는 권력을 지녔다면 둘 사이의 충돌은 피할 길이 없다. 대비와 임금의 충돌은 이미 선대에도 여러 차례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인수대비와 연산군, 인목대비와 광해군간의 갈등이다. 두 절대권력의 충돌은 통상 표면적으로는 실제 권력을 쥔 임금의 승리로 귀결된다. 하지만 대비를 이긴 임금이 승리를 영원히 누릴 수는 없다. 어머니를 거역했다는 것은 유교의 절대 덕목인 효(孝)를 어긴 셈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존재 기반인 유교를 버리고 조선에서 임금 노릇하기는 힘들다. 대비를 꺾은 임금은 모두 왕좌에서 쫓겨났다.(4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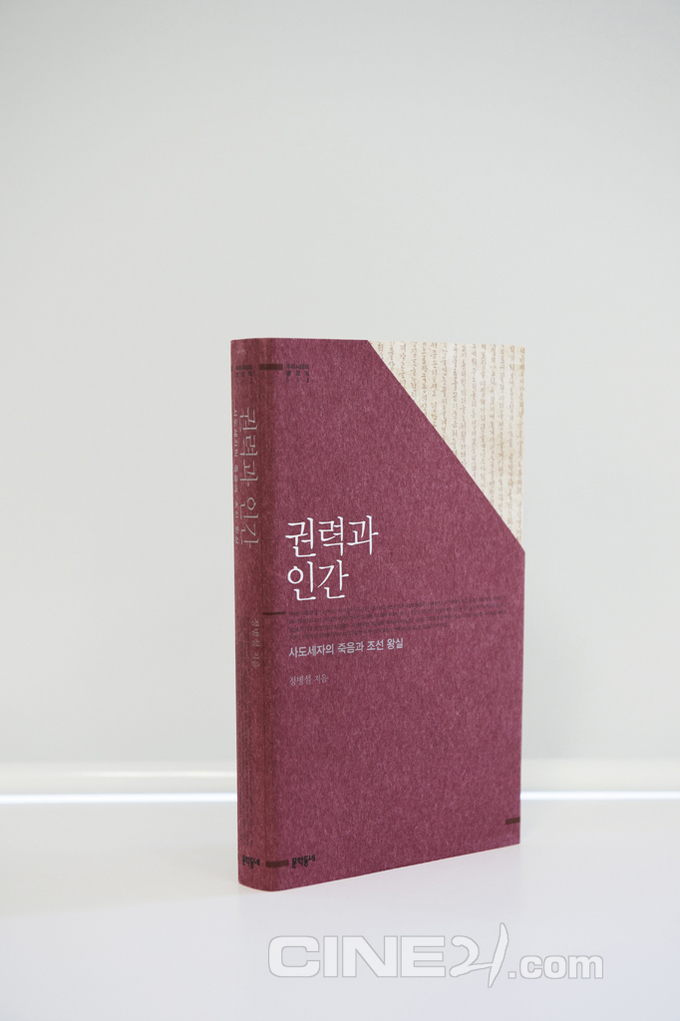
 에서 책구매하기
에서 책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