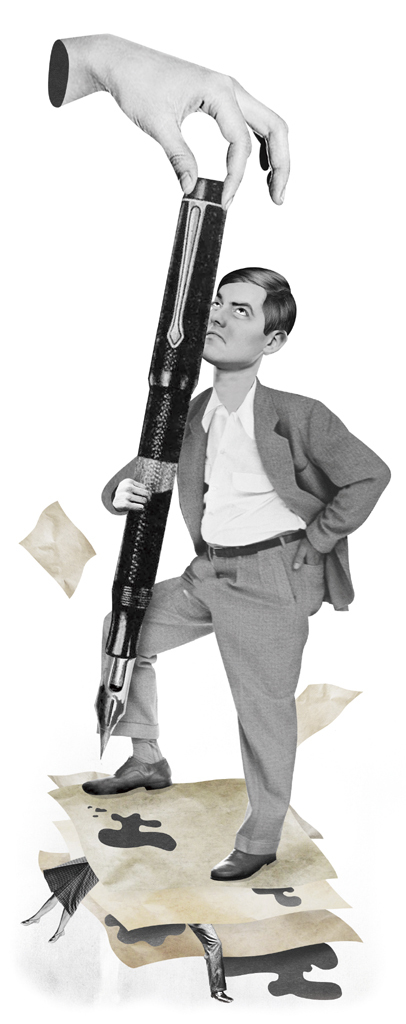일전에 한국 TV를 본 어느 유럽에서 온 외국인이 ‘한국은 게이 인권이 많이 보장된 국가 같다’고 말했다.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수많은 남성 예능들, 게이 패션으로 치장한 남성 아이돌의 떼군무가 구라파 파란 눈에 그리 보일 수도 있겠지 싶었다.
10년도 넘었다, 남성 예능들이 공중파를 장악한 게. 하긴 예능뿐이랴. 영화, 드라마에서 여배우 중심의 서사는 드물어졌을 뿐만 아니라 여배우가 원톱으로 나오는 영화들은 졸지에 천연기념물 신세가 됐다.
IMF 직후 집중 조명된 아버지들의 ‘눈물’은 남성 대서사시의 서문 격이었다. 이후 TV와 영화, 잡지 등 한국의 거의 모든 매체들은 경쟁적으로 남성의 서사를 재구축해왔다. 남성들이 아기를 돌보고, 함께 여행을 하고, 요리를 하고, 남자의 자격증을 따고, 연애와 결혼에 대해 훈수를 두고, 자아를 찾는 이 기나긴 서사의 여정은 지난 한반도 역사에는 남성이 아예 없었다는 듯 마치 한풀이처럼 계속 이어져왔다.
서사시의 역사가 그렇듯, 한 시대의 지배적 서사는 기존 체제의 ‘위기’에서 배양된다. 서사가 없으면 주체도 없다. 상처 입은 주체는 서사를 통해 구원을 요청한다. IMF 위기에 처한 한국의 가부장적 자본주의는 한편으론 신자유주의를 적극 내면화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론 상처 입은 ‘한국 남성’의 이미지를 도전적으로 재구성해왔던 것이다. 물론 그 끝에는 박정희라는 남성 영웅 신화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한편, 체제의 위기에 대응하는 가장 졸렬한 서사시는 언제나 ‘희생양’을 필요로 한다. 손쉽게 대상화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들이 희생 제의의 단골 캐릭터들이다. 지배적 서사가 재구축되는 과정에 희생양에 대한 배제와 혐오가 바로 극작의 ‘갈등구조’에 해당된다. ‘돈 잘 버는 이성애자 남성’의 보편적 서사를 위해 여성들은 김치녀와 김여사 같은 ‘악녀들’로, 이주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위협하는 ‘악당’으로, 성소수자들은 강제적 이성애주의를 흠집내는 ‘위험한 세이렌’으로 주변화된다.
이 장대한 오디세우스 신화는 애초에 괴물들에 대한 혐오와 억압 없이는 불가능한 서사시다.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줄기차게 구가되고 있는 한국 남성 서사시는 혐오의 노래이기도 하다. 요컨대 ‘일베’는 한국의 예외적 사태가 아니라 보편적 증상일 뿐이다. 장동민을 비롯한 개그맨들의 혐오 발언과 그들을 옹호하는 남성들 역시 이 서사의 중독자들이다.
상처 입었다고 징징거리는 것밖에 못하는 미성숙한 존재들에게 한 시대의 서사를 맡기는 것처럼 위험한 일도 없다. 참 지겹게도 많이 우려먹었다. 이제 다른 서사를 진행시킬 법도 되지 않았나. 장동민 퇴출 요구는 개인에 대한 단죄가 아니라 바로 이 일방적 서사에 대한 통렬한 부정에 가깝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여성 혐오에 격렬하게 반응하기 시작한 이 움직임이야말로 새로운 이야기의 서막일 가능성이 높겠다. 아니, 이제 충분히 그럴 때도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