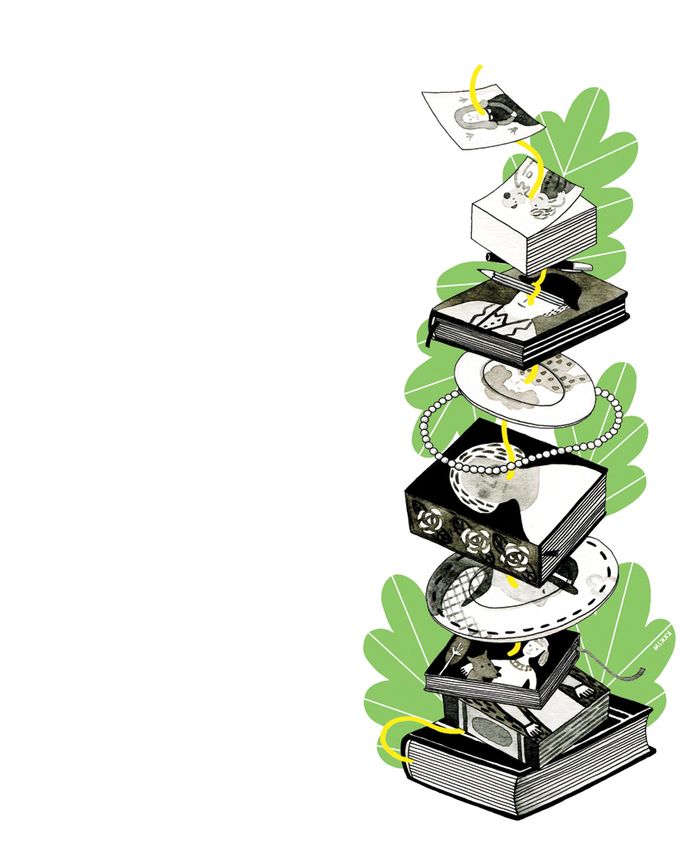업이 책에 관한 것이다 보니 하루가 멀다 하고 새 책을 만지고 또 하루가 멀다 하고 하루 만에 헌책이 된 새 책을 만난다. 일주일이면 어림잡아 내 허벅지까지 책이 쌓이는 것 같다. 그 중 2/3는 구입을 하고 나머지 1/3이 지인들로부터 도착하는 사인본 정도 되겠다. 여름 지나 아침에 살살했다가 저녁에 쌀쌀한 바람 불기 시작하니 특히나 시집 출간이 느는 모양이다.
내게 뭐라 썼는지 면지에 남긴 시인의 글씨체에 채 흐뭇해지기 전에 또 다른 시인의 시집이 도착한다. 짧은 엽서는커녕 잘 받았다는 인사를 겸한 안부의 메시지마저 자꾸 놓친다. 처음에는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어느 순간 에라, 모르겠다 너도 내 시집 받고 입 씻지 않았던가, 슬쩍 좋은 게 좋은 거지에 묻어간다. 불량식품도 아닌데 나쁜 습관은 참으로 쉽게 일상이 된다.
그러던 어느 날 벽돌 사이즈에 두부처럼 하얀 노트 한 덩어리가 내게 왔다. 친하게 지내는 인쇄소 직원이 잘라내고 버린 종이들을 모아 풀칠을 해서는 내 책상 위에 슬그머니 놓고 갔던 것이다. 족히 300페이지는 넘어 보였고 다행히 500페이지는 넘어 보이지 않아 그 쓰임에 대한 곤궁한 고민을 재미 삼게 되었다. 쓰라고 준 노트이니 써야 제맛이지 않겠는가, 하고 이 방 저 방 거니는데 기둥처럼 쌓아놓은 책들 가운데서 내 무릎에 치여 툭 한권이 떨어졌다. 그림책 작가이자 에세이스트인 선현경의 <날마다 하나씩 버리기>였다. 더욱 흥미로운 건 부제였다. ‘아무것도 못 버리는 여자의 365일 1일1폐 프로젝트’라나.
순간 번뜩 하고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다. 그렇다면 나는 ‘날마다 하나씩 줘보기’ 프로젝트를 감행해보자라는 결심이 섰던 것이다. 일단 여러 개의 통 속을 가득 채운 다양한 필기구들이 눈에 들어왔고, 서랍장 속에 상표도 안 뜯은 팬티가 여러 장 눈에 들어왔으며, 그릇장 속에 겹겹이 겹쳐놓은 접시들이 눈에 들어왔다. 하물며 책장마다 가득가득 쏟아질 듯 꽂혀 있는 책에 대해서는 두말해서 무엇하랴.
휴대폰을 열고 노트의 첫장을 펼친 뒤 액세서리 보관함을 열었다. 비즈 공예를 테마로 하는 책을 만들면서 저자 선생님에게 선물로 받았던 온갖 액세서리가 철 지나고 유행 지난 옷들처럼 꾸깃꾸깃 처박혀 있었다. 그중 핑크색 장미가 알알이 장식된 귀걸이, 목걸이, 반지 한 세트를 꺼냈다. 이걸 그토록 탐내던 후배가 있었는데, 어차피 난 하지도 않을 거였는데, 그때 난 무슨 욕심으로 선뜻 내주지 못했을까.
노트에 ‘1. 핑크색 장미 비즈 액세서리 세트’라고 쓰고 후배의 이름을 썼다. 후배에게 문자를 보냈으나 하루가 지나도록 답은 오지 않았다. 10년 넘은 세월이니 번호가 바뀌기도 했을 것이고 또 혹여 나에 대한 미움 같은 감정이 남아 내 번호를 지워버렸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그렇게 한 사람을 지우는 훈련이 오늘로 열세 번째다. 참으로 신기하지, 사물마다 사람들이 이렇게도 각기 달리 떠오를 수 있다니. 교훈이라면 있을 때 주자는 거다. 달랠 때 주자는 거다. 뒷북치려니까 배보다 배꼽이라고 글쎄, 택배비가 어마어마하다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