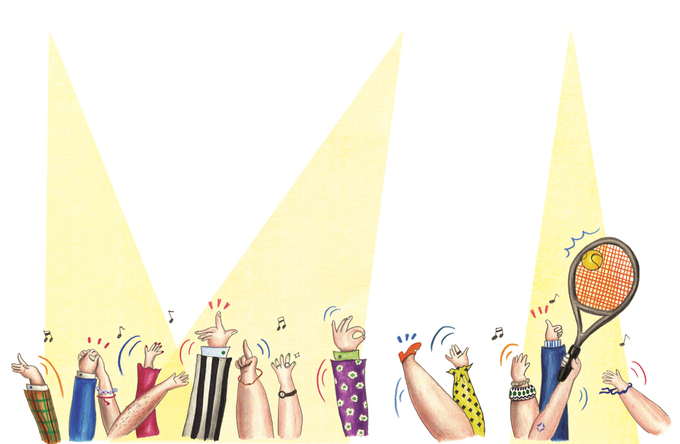요즘 즐겨 듣는 노래가 로잔느 캐시의 2014년 앨범 ≪The River & the Thread≫인데, 오후에 이어폰으로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며 거대한 풍경이 눈앞에 그려진다. 미국엔 한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오래전부터 봐왔던 익숙한 풍경이다. 아버지 조니 캐시의 영화 <앙코르>(원제 <Walk the Line>)에 나왔던 풍경 같기도 하고, 코언 형제의 영화에서 본 장면 같기도 하고, 영화 <미스틱 리버>에서 가장 좋아했던 경치 같기도 하다. 음악에는, 더구나 특정한 장르의 음악에는 장소와 풍경을 환기시키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다. (로잔느 캐시의 음악을 컨트리로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컨트리 음악만 들으면 늘 광대한 풍경이 떠오르며 아득해지고, 너무 아득해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방향을 잃고 우두커니 서 있다가 문득 편안해진다.
한국의 컨트리 음악이라 부를 수 있을 트로트 음악을 들을 때도 특별한 풍경이 떠오른다. 우선 내가 자란 동네의 시장이 생각난다. (이렇게 말하면 무척 시골 같아 보이겠지만 그렇진 않았고) 5일장이 설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던 곳,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약을 팔기도 하고 흥에 겨우면 시장 사람들이 갑자기 춤을 추기도 하던 곳, 생계를 위해 나물을 뜯어서 팔던 할머니들과 떡볶이를 먹기 위해 분식점으로 향하던 아이들이 뒤엉키던 곳, 신바람 이박사의 추임새보다도 격렬하고 흥겨운 박자에 맞춰 상인들이 발을 구르던 곳이 생각난다. 어린 시절의 내게 트로트 음악은 생계를 위한 배경음악처럼 들렸다.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은 영등포 사거리의 풍경이다. 한때 직장 다니던 시절 영등포 시장 근처를 지나다닐 일이 많았는데, 콜라텍에서 나와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은 뭐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했고, 가격도 무척 쌌고, 거리의 배경음악은 당연히 뽕짝이나 트로트였다. 콜라텍이란 곳을 한번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르신들은 그 안에서 뭘 하는지 무척 궁금했던 기억이 난다.
요즘 방영되고 있는 김운경 작가의 <유나의 거리>를 보면서 그때의 궁금증을 조금씩 풀고 있다. <유나의 거리>는 콜라텍이 주요 배경인 드라마이고, 콜라텍과 주변에 얽힌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매력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드라마이고, 에, 그리고…, 최근 10년 이내 본 모든 드라마 중에서 압도적으로 훌륭한 작품이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는 50회 분량 중 절반쯤 지난 드라마이고 아직 20회가 넘는 분량의 이야기가 남아 있지만, 나는 미리 단언할 수 있다. 이 드라마는 걸작이다. 한때 <서울의 달>을 재미있게 보았던 사람으로서 추억 속에 갇혀 지나치게 후한 점수를 주는 건 아닌가 따져보았지만 그건 확실히 아니다. 나는 <서울의 달>보다 이 작품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유나의 거리>의 훌륭한 점은 밤을 새워서 얘기해도 모자라지만, 그중에서 가장 훌륭한 점 하나만 얘기하라면 ‘그 어떤 것도 뻔하지 않다는 것’이다. 주인공의 사연도, 조연들의 사연도, 아이들의 이야기도, 어른들의 대화도 뻔하지 않다. 뻔하다는 것은 늘 생각하던 대로 생각한다는 뜻이고,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다른 사람과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새롭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유나의 거리>에서는 뻔한 순간이 거의 없다.
춤에 대한 태도도 그렇다. 콜라텍은 어르신들이 모여서 음악도 듣고, 춤도 추고, 부킹도 하는 곳이다. 어떤 이들은 ‘다 늙은 사람들의 불륜을 조장한다’며 곱지 않은 시선으로 콜라텍을 바라보지만, 늘그막에 춤바람 난다며 걱정하지만, 드라마를 보고 나면 콜라텍이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집에 가서도 계속 스텝을 연구하는 할아버지들, 멋지게 차려입고 가방을 카운터에 맡긴 다음 신나게 놀아보려는 ‘여사님들’, 서로 맞잡은 손을 확인하며 지터벅(지르박) 스텝을 밟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한번쯤 생각해보게 된다.
콜라텍의 춤 선생님은 드라마의 주인공이자 콜라텍 지배인인 창만(이희준)에게 빨리 춤을 배우라고 충고한다. 하루라도 빨리 춤을 배워서 플로어만 바라보다 손 한번 잡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여사님들 손을 잡아주라는 것이다. 춤이란 그런 것이다. 춤이란 서로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것이다. 같은 스텝으로 같은 리듬을 타며 서로의 몸에 기대는 것이다. 미친 듯 춤을 춰본 사람은 모두 알 것이다. 내 춤을 내가 의식하지 않게 되는 순간, 몸이 생각을 이기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순간, 그런 뜻밖의 순간에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 서로에게 기대어 춤을 추다보면 그런 뜻밖의 순간이 오지 않을까. 마냥 즐겁고 기뻐서 자신의 나이 따위, 살아온 이력 따위 잊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그 맛에 콜라텍을 다니는 게 아닐까.
콜라텍 사장님의 어린 아들이 집 마당에서 옆방 할아버지와 ‘지르박 스텝’을 연습하는 장면이 나온다. 다른 드라마였다면 동네 사람들이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거나 ‘빨리 들어가서 공부나 하라’며 혼을 내겠지만 <유나의 거리>에선 아무도 그러지 않는다. 기특해하고, 응원해주고, 가르쳐준다. 이토록 꼰대스럽지 않은 드라마가 있을까.
페터 회의 소설 <스밀라의 눈에 대한 감각>의 이런 문장이 생각난다. “나는 패배자들을 좋아한다. 장애인, 외국인, 뚱뚱해서 놀림을 받는 친구들은 말할 것도 없고 누구도 춤을 추려고 하지 않는 모든 이들을 사랑한다.” 페터 회의 문장이 아니라 김운경 작가의 문장이라고 착각할 정도다.
니체는 음악과 소리가 신경계를 총체적으로 자극하는 힘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다. 니체는 ‘음악’이 우리를 추진하게 만들고 동작을 유발시킨다면, ‘리듬’은 동작의 흐름을 이끌고 명료하게 맺고 끊는다고 생각했다. 말하자면 콜라텍의 어르신들은 ‘뽕짝’과 ‘트로트’에 의해 추진되어 지르박의 리듬 속에서 자신의 삶을 명료하게 만들고 있는 중이다. 니체는 ‘비제’를 그 예로 들었지만 비제나 트로트나 뭐 큰 차이 나겠나. 뽕짝과 트로트는 여전히 내 음악 취향과 많이 다르지만 음악에 맞춰 스텝을 밟는 어르신들의 모습은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든다.
올리버 색스의 <뮤지코필리아>에는 아마추어 테니스 선수의 사례가 하나 나온다.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그에게 라켓을 보여주며 그게 어디에 쓰는 물건이지 물어보았다. 그는 라켓을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테니스 코트에서 그의 손에 라켓을 쥐어주자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았다. 그는 멋지게 테니스를 쳤다. 우리의 몸은 인식보다 강력하며, 기억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닐 수 있으며, 안다고 해서 영원히 기억할 수 없으며, 우리가 대체 어떤 존재들인지 영원히 모르고 죽을 확률이 클 것이다. 아직 인생의 비밀 같은 것은 전혀 모를 나이이고, 앞으로도 모를 것 같은 강한 예감이 들지만, 죽을 때까지 팔다리를 흔들어야 하는 운명이라면 버둥거리기보다 춤을 추며 살고 싶다. 춤을 추며 죽고 싶다. 조르바처럼? 아니, 지르박을 추며. 예~, 털-ㄴ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