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학 후 조선일보사에 근무할 무렵의 백석은 ‘녹두빛 더블부레스트’를 젖히고 한대의 바다의 물결을 연상시키는 검은 머리의 ‘웨이브’를 휘날리면서 광화문통 네거리를 건너가는 한 청년이었다. 그는 남들이 자주 잡는 문의 손잡이를 잡지 않던, 결벽증이 심한 모던보이였다. 그런 백석이 삼수군 관평에서는 누구보다 인사성이 밝고 겸손했으니 삼수군 사람들 중에는 백석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
시인 안도현이 <백석 평전>을 썼다. 백석이 쓴 글과 삶의 궤적을 엮어, 글 읽는 이의 손을 잡고 국경을 넘는다. 그래도 잘 알려진 편인 그의 삶의 초반 40년 정도와 ‘이쪽’에서는 알기 참 힘들었던 그 이후의 시간을 전한다. 죽기 전까지의 40여년간의 세월을 좇으며 수시로 울컥하는 까닭은 그가 쓸 수 있었던 글이 그가 써왔던 글과 너무도 달라야만 했기 때문이고, 그것이 그의 선택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1960년 <문학신문> 좌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설명을 보자. “좌담회에는 조선작가동맹 부위원장 박팔양을 비롯해 현지에 파견되었던 작가들 20여명이 대거 참석했다. 시인 함영기와 김광섭, 극작가 박혁은 탄광의 광부로 일하다가 왔고, 시인 박근은 어부로 일하고 있었고, 소설가 리춘진은 타이어공장에서, 평론가 박종식은 제강소에서 노동을 하다가 참석했다. 시인 상민은 백석처럼 농업협동조합에 파견되었다가 평양으로 왔다.” 그리고 그 모임은 백석을 비롯한 작가들에 대한 비판으로 향한다. 평양은 변한 게 없었다. 1962년, 북한에서 시인으로서 백석의 역할이 끝났고, 그는 죽기까지 34년을 더 살았다. 그 시간의 백석에 대해서는, 이 평전에서조차 알 수 없다. 2005년 평양에서 열린 민족작가대회에 참석한 남쪽의 작가들이 백석에 대해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이라고는 “백석 시인은 말년에 전원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정도가 고작이었다. 누구를 붙들고 물어봐도 그 대답만이 돌아왔다. 평안북도 정주군에서 태어났고 해방 이후 생을 마감할 때까지 북한에서 살았던 백석은 북한에서 아직까지 완전한 복권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백석의 말년을 비통한 마음으로 떠올리는 이들에게 안도현은 분명하게 자신의 생각을 밝힌다. “해방 전 남한에서 그는 가장 주목받던 시인의 한 사람이었지만 해방 후 북한에서 시인으로서의 말년은 행복하지 못했다. 하지만 개개인이 겪는 특수한 순간들이 모여 삶의 전체를 구성하는 법이다. 시인으로서 백석은 방황과 절망의 쓴맛을 보았지만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이승에서 보낸 시간을 결코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시를 쓰는 자유를 내려놓음으로써 백석은 오히려 더 많은 자유를 누렸던 것은 아닐까?” 모르겠다. 백석이 자연인으로서 행복할 수 있었을지 정말 모르겠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려 해도, 그가 더 쓸 수 있었을 시들을 포기하고 잊어버리는 일은 불가능하다. 이 평전이 그 안타까움을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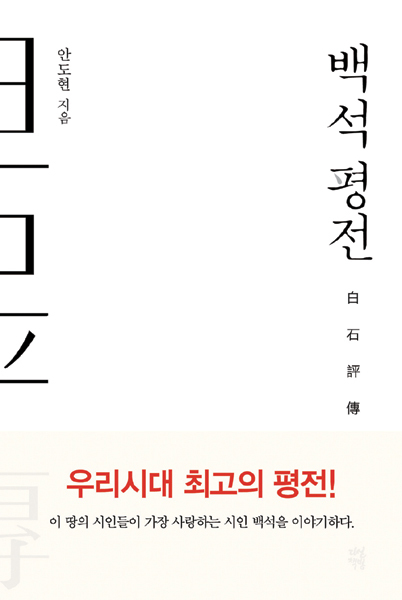
 에서 책구매하기
에서 책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