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가진 엄마들과 대화를 해보면 나이의 많고 적음을 떠나 ‘딸의 결혼’에 대해 생각이 복잡하다는 걸 알게 된다. ‘남들처럼’(한국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들 생각하는 가치!) 결혼해서 애 낳고 살면 좋겠다 싶다가도, 세상이 아무리 달라졌다 해도 살림과 육아 때문에 날개를 못 펴지 않을까 하는 근심에 굳이 결혼을 하지 않아도 본인만 행복하다면 좋겠다고 느끼기도 한다. 서른둘과 서른하나 연년생 남매의 어머니이자 33년차 주부(25년은 시집살이)인 김재용의 <엄마의 주례사>는 그 두 가지 상반되는 생각 사이에서 딸의 행복을 함께 고민하고 돕고자 하는 노력의 결실이다. “결혼,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라고 입을 떼는 이 책은 딸에게 신혼 때부터의 추억을 전한다. “결혼해서 혼자 있을 때 외로움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고 한 뒤, 자신의 팁을 덧붙인다. “일단 몸을 움직여줘야 해. 난 사우나에 가.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있으면 따뜻한 물이 ‘괜찮다, 괜찮다’ 내 몸을 어루만지며 위로해주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엄마가 나이 들어서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결혼에 대한 충고가 이렇게 아프고 어려운 기억들과, 그 모든 것을 홀로 씩씩하게 이겨낸 경험담과, 의도치 않은 남편과 시집 식구들에 대한 은근한 험담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하는 생각도 든다. 남편에게 기념일과 선물을 기대하지 말고 자신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라는 조언은 지혜로우면서도 슬프다. 딸에게서 “나도 결혼하면 엄마처럼 살 거야”라는 말을 듣는 지은이조차 이럴진대, 딸에게서 “난 결혼하면 엄마같이 살지 않을 거야”를 듣는 엄마들의 결혼생활이란 어떤 것일까. 읽다보면 엄마가 보고 싶어진다. 첫 질문은 “엄마, 엄마는 결혼하고 언제 외로웠어?”가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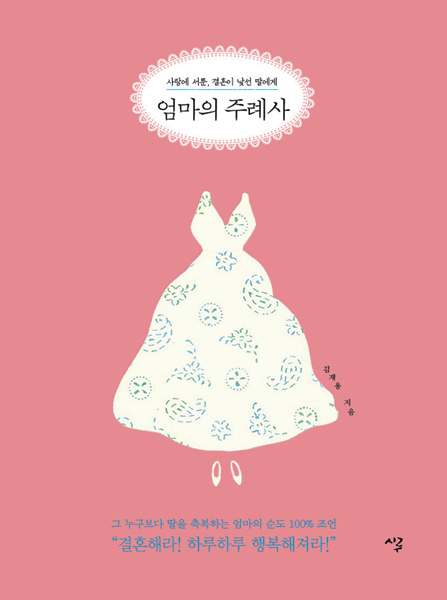
 에서 책구매하기
에서 책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