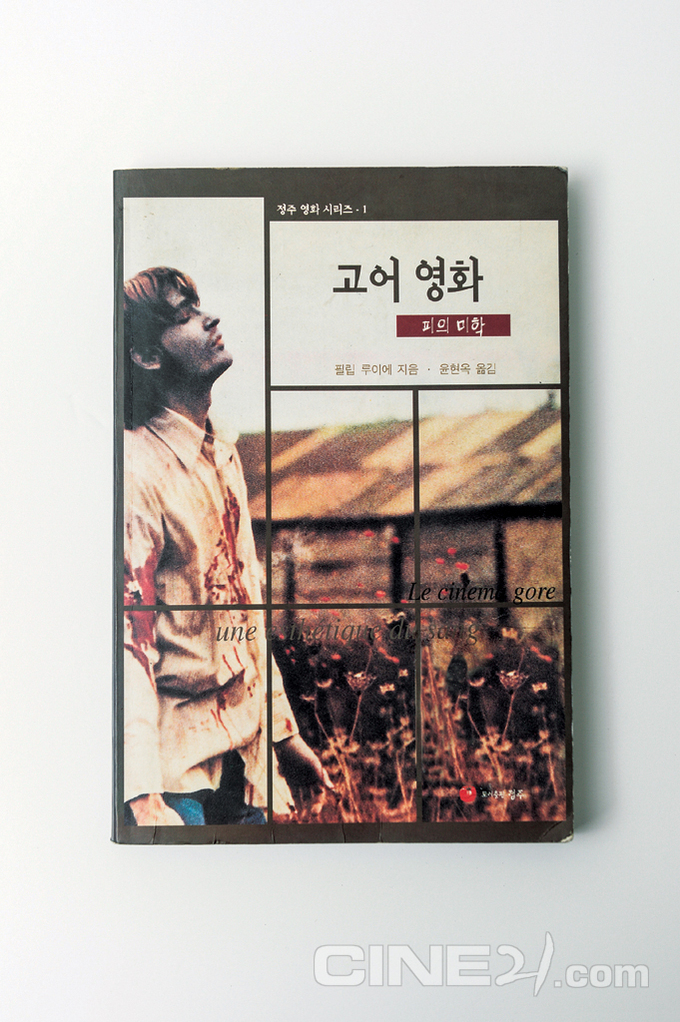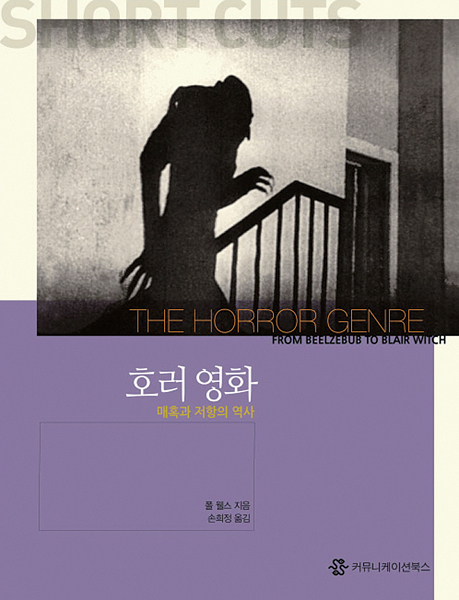이런 책도 있었다고? 광범위한 영역을 아우르는 장르 서적이 아니라, 미시적인 접근법이 꽤 흥미로웠던 몇권의 책이 있었다. <카사블랑카>(1942)부터 <록키 호러 픽쳐 쇼>(1975)에 이르기까지 ‘컬트’ 현상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컬트영화, 그 미학과 이데올로기>(곽한주 엮음 / 한나래 펴냄)가 있었고 프랑스 영화지 <포지티프>의 비평가였던 필립 루이에가 쓴 <고어 영화: 피의 미학> 또한 표지부터 신선했다. 특히 후자의 경우 장르 서적이 드물었던 당시 분위기를 감안하면(1999년 출간) 호러영화 전문서적이라는 것부터 획기적이었다. 본격 연구서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도 조지 로메로, 존 카펜터, 스튜어트 고든, 다리오 아르젠토, 루치오 풀치, 클라이브 바커는 물론 <네크로맨틱>(1987)의 요르그 부트게라이트까지 소개하고 있다. 심지어 요르그 부트게라이트의 두 번째 장편영화인 <죽음의 왕>(1990)에 대해서는 “데이비드 핀처의 <세븐>(1995)을 앞질러 한 주일의 7일과 자살의 7가지 방식에 일치하는 7개의 스케치로 구성돼 있는 영화”라고 말한다.
그런데 적어도 한국 출판시장에서는 시대를 앞서간 책이었는지, 목차나 본문이 시작되기도 전에 등장하는 ‘역자의 말’이 압권(?)이었다. “내가 이 책을 번역한다는 소리에 나를 아는 이들은 모두의아해했었다. 전쟁영화도 제대로 못 볼 만큼 폭력적인 것에 민감한 나이고 보면 그럴 만도 하다”라며 호러영화의 팬이 아님을 당당히 선언함은 물론, 심지어 “원서 중에 삽입된 사진들을 일일이 종이로 가려놓고 작업을 했다”라며 장르 자체에 대한 애정이 별로여서 ‘읽어나가는 것 자체가 큰 용기’였다고 밝히고 있다. 많은 영화인들이 보통 한국 호러영화의 문제점에 대해 ‘장르에 별 애정이 없는 감독이 연출을 맡아서’라고 입을 모으는 것을 보면, 이 책 또한 비슷한 처지였다는 점이 무척 흥미롭다. 하지만 고어영화라는 특정한 성격의 영화를 단순한 하위 장르 이상으로, 역사적으로 당대의 대중영화와 긴밀히 호흡해온 장르로 언급하고 분석하는 대목은 그런 허점을 떠나 효과적이다. 그 원조로 19세기 말 프랑스 파리에서 유행한 살인이나 폭동 따위를 다룬 전율적인 연극인 ‘그랑 기뇰’(Grand Guignol)을 언급하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분석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화 속 ‘피의 역사’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다. 허셀 고든 루이스의 <피의 축제>(1964)를 첫 번째 고어영화로 평가하면서 시작한 뒤, 에드거 앨런 포의 원작을 각색한 로저 코먼의 일련의 영화들과 윌리엄 캐슬, 테렌스 피셔 같은 감독들을 지나 1960년대 후반 조지 로메로를 ‘고어영화에 귀족적 양식을 부여한 감독’으로 평가하며, 어떻게 더 많은 세계영화들이 피로 물들어 갔는지 훑는 것이다. 흥미로운 대목은 ‘메이저들의 피’라는 소제목으로, 개봉 당시 논란을 빚기도 했던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1967)와 <와일드 번치>(1969)의 마지막 장면에서 ‘피투성이의 탈주자들’을 보여주며, 고어영화의 대중화와 할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가 스크린에 점점 더 과도한 폭력성을 투사하는 것을 연결짓는 부분이다. 그러면서 두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마틴 루터 킹과 로버트 케네디의 암살을 떠올리기도 한다. 더 나아가 대대적인 성공을 거둔 스필버그의 <죠스>(1975), 리들리 스콧의 <에이리언>(1979)에서 드러나는 ‘고어 효과’도 언급한다. 결국 그 피의 역사는 오래 전 그 기원으로서의 표현주의는 물론 현대 특수효과와도 동떨어져 있지 않다. 말하자면 고어영화 특유의 그 ‘과잉의 미학’이 현대영화의 화법과 스타일을 발전시킨 중요한 동력이었던 것이다.
당신이 당장 위의 책을 읽을 수 없다면, <호러영화: 매혹과 저항의 역사> 폴 웰스 지음 / 손희정 옮김 / 커뮤니케이션북스 펴냄 를 추천합니다
호러영화 혹은 원초적 공포에 대한 수많은 질문들을 아우르는 책이다. 호러영화의 역사를 근본적인 20세기 ‘불안의 역사’로 읽으며 ‘괴물의 형성’으로부터 접근한다. <노스페라투>(1922)를 시작으로 해머 스튜디오의 ‘고딕 호러’ 등 <고어 영화: 피의 미학>보다는 너른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어쩌면 그래서 처음부터 딱딱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으나 <싸이코>(1960)와 <피핑 톰>(1960), 그리고 시리즈물인 <나이트메어>(1984) 등 다채로운 사례들을 소개한다. 그 과정이 결코 지루하지 않은 것은 “전율은 이론을 앞서 간다”는 저자의 태도 때문이다. 그래서 이성을 초월하여 호러영화를 낄낄거리며 볼 수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