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말의 겨울, 저는 몇해 전부터 친구들을 차례로 잃고(그런 나이에 접어들었습니다) 울적한 상태였습니다.” 소설가 오에 겐자부로가 ‘그런 나이’에 접어들어서도 변함없이 왕성하게 세상을 향해 발언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말의 정의>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아사히신문>에 연재한 글을 고쳐 써서 묶은 책이다. 일본에서는 그 이름만 들어도 통용되는 지식인일지라도 한국에서는 각주를 보고도 좀처럼 감을 잡기 어렵기 마련인데, 그런 주변인과의 일화가 꽤 등장한다는 점 때문에 읽기 어려운 대목이 적지 않지만, 반전(反戰)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글을 쓰고 읽는다는 것에 대한 철학, 머리에 기형을 갖고 태어났지만 음악적 재능을 꽃피운 아들 히카리와의 일화는 언제 어떤 책에서 읽어도 늘 마음 깊이 와닿는다. 상투적인 찬사지만 사실이 그렇다.
제주 4•3사건처럼 오키나와에는 오키나와전(戰) 당시 일본군이 집단자결을 두 섬의 주민에게 강요한 이른바 ‘공사’(共死)가 있었다. 그런데 2006년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 집단자결이 “일본군에 의해 강제되었다”는 기술을 삭제했고 그에 관한 글을 쓴 오에는 재판에 시달리게 되었다. 재판에 오가는 불안으로 시작한 글은 주어 없는 수동형 문장의 탈정치성과 그 위험성에 주목한다. “집단자결로 ‘내몰린’”이라고 표현한 교과서들을 두루 살핀 뒤, 누가 혹은 무엇이 그들을 내몰았는가, 왜 주어는 사라지고 능동형 문장이 쓰일 수 없는가를 주목해야 한다고 첨언한다. 교과서와 관련된 일본의 논란만큼이나 한국의 상황까지 생각하게 만든다. 또한 젊은 시절에 “너 따위가 루쉰을 떠받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쓰여있는, 요즘의 악플에 준하는 투서를 받은 일이 등장하는가 하면, 처남이었던 영화감독 이타미 주조가 살아 있던 당시에 대한 추억을 곱씹기도 한다. 어렸을 적에는 곧잘 대화에 참여했던 큰아들 히카리가 이제는 가족과도 자주 말을 섞지는 않지만 특유의 음악적 감수성으로 자신이 잊고 있던 곡을 찾아주어 함께 듣던 밤의 추억은 어떤가. 과장 없이 단정한 문장으로 읽고 쓰고 듣고 말하는 자신의 일상을 전하는 노작가의 행간에서 읽히는 것은 한숨과 회한이 아닌, 확신과 주장이 아닌, 미소와 제안이다. 이쪽에서 기꺼이 마주잡고 싶게 만드는, 내민 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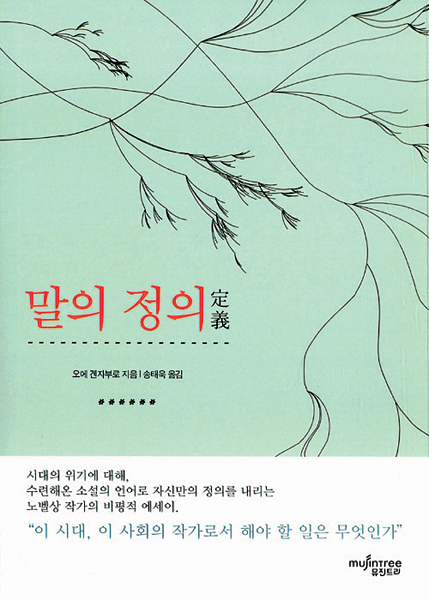
 에서 책구매하기
에서 책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