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들 로맹 가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자신의 이야기를 소재로 자서전인지 소설인지 구분하기 힘든 책을 종종 써온 이 작가는 여덟살짜리 애인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금붕어, 거미, 심지어 고무신 한짝을 먹어치우고 병원에 실려갔던 사연을 매혹적으로 펼쳐놓는 재주가 있다(<새벽의 약속> 중에서. 개인적으로 책에서 찾아볼 수 있는 최고의 구애 장면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때는 작가의 나이도 여덟살이었다). 실제로도 소설 같은 인생을 산 로맹 가리는 러시아에서 단역배우 출신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 유럽을 떠돌다가 프랑스에 정착하고, 2차대전 때는 자유 프랑스 공군에 입대해서 나치와 싸우고 레지옹 도뇌르 훈장을 받는다. 프랑스 태생도 아니면서 우리로 치면 일제 시대에 독립군으로 활동한 정도의,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경력을 쌓은 셈이다.
종전 뒤 외교관으로 근무하면서 1956년 <하늘의 뿌리>라는 책으로 프랑스 최고 문학상인 공쿠르상을 타고, 다시 “에밀 아자르”라는 가명으로 <자기 앞의 생>이라는 책을 써서 공쿠르상을 받는다. 같은 사람에게 두번 수상하지 않는 공쿠르상의 전통이 제2의 자아를 창조한 작가에 의해서 깨진 것.
<흰 개>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고, 그만큼 넓은 이해심을 가진 이 코스모폴리탄마저 분노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아내인 배우 진 세버그가 영화를 찍는 동안 함께 지내려고 로스앤젤레스에 와 있던 작가는 우연히 집에 찾아든, 잘생긴 셰퍼드 한 마리를 기르게 된다. 드나드는 사람들 대부분에게 친근하게 대하던 이 개는, 그러나 몇몇 사람들에게는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든다. 로맹 가리는 개가 달려든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고 충격을 받는다. 그들은 모두 흑인이었던 것이다.
전문가에게 개를 데려간 그는 더 큰 충격을 받는다. 개가 흑인들에게 그런 반응을 보인 것은 인위적인 훈련에 의한 것이었던 것이다. 드문 일도 아니었다. 인종주의에 찌든 미국 남부사람들에게 아내와 딸을 지키기 위해서 흑인만 물도록 훈련을 한 ‘흰 개’를 키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얼마 뒤 찾아온 개 주인을 로맹 가리는 혹독하게 비난하지만, 인종차별은 그 피해자인 흑인들도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힘을 약화시킨 지 오래였다.
흰 개를 앞에 두고 “역사 속에서 지성은, 본질이 어리석음에 있는 인간의 문제를 단 한번도 해결해내지 못했다”라고 단언하는 작가에게 우리가 반대 증거를 제시하기란 쉽지 않다. 충격적인 결말 부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한 회의를 벗어나기 힘들게 만드는 책. 이 사랑스러운 작가가 끝내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것도 우연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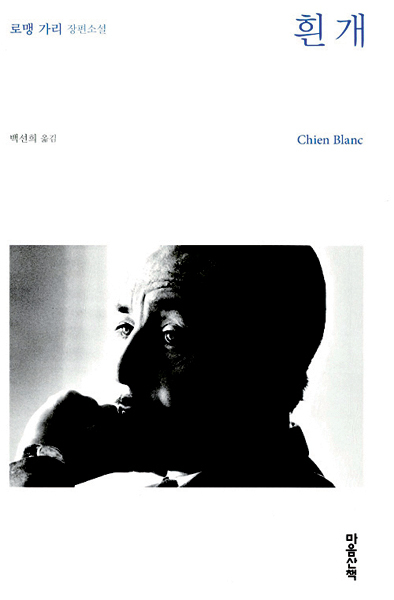
 에서 책구매하기
에서 책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