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 첫머리에는 너무도 끔찍한 사형집행 장면이 나온다. 판결문에서 지시하는 집행방법은 이렇다. “처형대 위에서 가슴, 팔, 넓적다리, 장딴지를 뜨겁게 달군 쇠집게로 고문을 가하고, 그 오른손은 국왕을 살해하려 했을 때의 단도를 잡게 한 채 유황불로 태워야 한다. 계속해서 쇠집게로 지진 곳에 불로 녹인 납, 펄펄 끓는 기름, 지글지글 끓는 송진, 밀랍과 유황의 용해물을 붓고 몸은 네 마리의 말이 잡아끌어 사지를 절단하게 한 뒤 손발과 몸은 불태워 없애고 재는 바람에 날려버린다.” 실제 집행과정에서는 말들이 잡아끌어도 팔다리가 떨어지지 않아 결국 집게로 어깨와 넓적다리 근육을 잘라낸 뒤에야 집행이 완료됐다.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형수 중의 한 사람, 1757년 3월 국왕 루이 15세를 살해하려다 처형된 다미엥이란 사람의 이야기다. 푸코의 책에는 직접 다미엥에게 이런 고통을 가한 사람의 이름도 나온다. ‘파리의 남자’(뮤수 드 파리)라는 별칭으로 불리던 사형집행인 상송이다. 아다치 마사카쓰의 책 <왕의 목을 친 남자>는 이 상송 가문에 관한 책이다.
당시에는 공개처형이 빈번하게 행해졌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지역 축제와 같은 성격이 강했다. 모여든 군중 틈에는 먹을거리와 음료수를 파는 장사꾼까지 있었다. 사람들은 처형과정이 조금이라도 길고 고통스럽기를 희망하면서 사형집행인을 응원했다. 그러나 사형집행인이 주목과 관심을 받는 것은 집행 당일뿐 평소에는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기피의 대상이었다. 때문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사형집행인은 대대로 물려받는 직업이었다.
상송 가문이 이 길에 뛰어든 것은 역설적이게도 사랑 때문이다. 군인이었던 샤를 드 롱발은 폭풍우로 사고를 당했다가 그 지방 사형집행인에게 구조되고 딸인 마르그리트의 간호를 받는다.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고 샤를 드 롱발은 고민 끝에 그녀와 결혼하기 위해 장인의 직업을 이어받기로 결심한다. 그가 바로 초대 상송이다. 그 뒤 6대에 걸쳐 상송 집안 사람들은 파리의 사형집행인을 담당한다. 상당한 수입이 보장되어 귀족 못지않은 생활을 누렸으나 사람들의 천시를 받으며 잔혹한 고문과 처형을 담당하는 것은 이들의 피할 수 없는 숙명. ‘좀더 인도적인 사형’(사형수의 고통을 줄여주기 때문에)이라는 역설적인 요청에 따라 등장한 기요틴으로 인해 대량 처형이 이루어지는 이중 모순을 이들만큼 실감한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결국 6대 상송인 샤를 앙리는 <상송가문 회고록>에서 사형제 폐지를 주장하지만, 프랑스에서 그 주장이 실현된 것은 그로부터 175년이 지난 1981년의 일이다.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도 쉽게 읽히는 책. 좀더 소설적인 재미를 원한다면 미셸 폴코의 <사형집행관>을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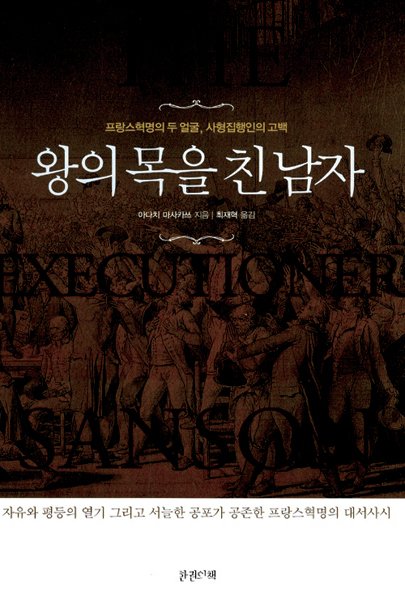
 에서 책구매하기
에서 책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