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3년 세기의 여름>을 읽는다는 것은, 우디 앨런의 <미드나잇 인 파리>의 주인공 길이 되는 것과 같다. 그때 그 순간을 살았던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겠지만, 당시 그들에게는 단지 조그만 한 발짝에 불과했던 사건이 이후 전 인류에 하나의 큰 도약이 되었고, 독자는 그들이 그 발걸음을 내딛던 순간들을 훔쳐보게 된다. 길과 달리 이 책의 독자에게는 파리라는 장소적 제약이 없다. 이 책이 기록한 첫 번째 사건은 1913년 0시1초, 뉴올리언스에서 새해 환영인사를 하려고 훔친 리볼버를 폭죽처럼 쏘아댄 소년이 경찰에 잡혀간 일이다. 소년이 날뛰자 경찰관은 트럼펫을 쥐어준다. 소년의 이름은 루이 암스트롱이다. 다음 순간은 자정을 알리는 축포 소리를 글로 적어 알리는 남자의 사연이다. 프라하에서 쓴 이 편지는 베를린의 여인이 읽게 될 것이었다. 그의 이름은 프란츠 카프카다. 파블로 피카소는 루브르박물관에서 도난당한 <모나리자> 건으로 경찰의 심문을 받았고, 러시아에서 빈 북부역에 도착한 사나이는 이해의 1월부터 스스로를 이오시프 스탈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나는 이 책의 359쪽 중에 고작 4페이지를 거칠게 요약했을 뿐이다. 논픽션이지만 소설처럼 극화에 능숙한 책이다.
이 책을 쓴 플로리안 일리스가 베를린에 거주 중인 독일인이라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베를린의 반짝이는 순간들을 수시로 만날 수 있다. 다른 도시에서 벌어진 일들보다 자세하고 생동감 있게 묘사된다. 하지만 철학, 역사, 예술사(음악, 문학, 미술)를 비롯한 지식에 어두운 편이라면 이 책은 검색엔진 없이는 웃을 수도 감탄할 수도 없는 암호문이 되어버린다. 달리 말하면 지적 허영을 오르가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백과사전. 프로이트, 릴케, 카프카, 브레히트의 사적인 순간들은 우리가 아는 책으로 완성되었다. 알마 말러는 그 전설적인 남성 편력의 한복판에 있고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이 초연되었다. 그때는 그저 모든 게 진행형이었다. 참고로, 이 책이 말해주지 않는 1913년의 한국은 이랬다. 최남선이 월간 <새별>이라는 잡지를 창간했고, 김환기가 전남 신안에서 태어났다. 일제는 송도 거북섬에 휴게소를 설치하고 인근 해안가를 해수욕장으로 개발했다. 신채호는 상하이에서 박달학원을 세워 한국사를 강의했다. 1200년간 잘 보존되던 석굴암은 이해에 일제가 시멘트 보수공사를 시작해 지금까지 누수와 습기 문제로 고생하게 된다. 안창호는 샌프란시스코에서 흥사단을 조직했다. 식민지 조선이었다. 어쩌면 2013년도 후일, 이런 식으로 기록될지 모른다. 지리멸렬하고 고통스러우며 정말이지 아무짝에도 괜찮은 구석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이런 해일지라도 미래의 재능, 변화, 희망과 악몽의 씨앗이 어딘가에서 숨죽여 사랑을 속삭이거나 댓글 요원으로 활약 중일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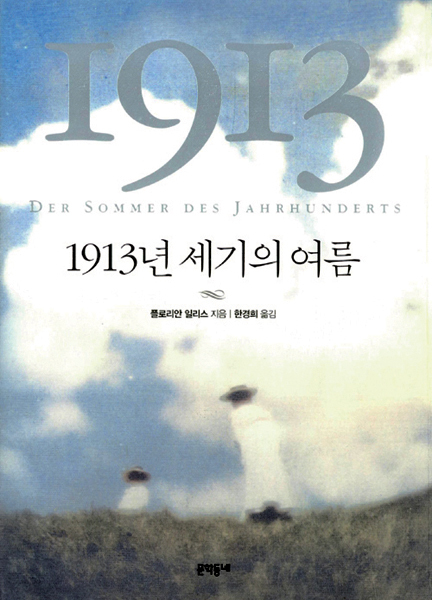
 에서 책구매하기
에서 책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