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정말 읽기가 어렵고 고통스러운 책이 있다. 그러나 그중에는 일단 읽어내기만 하면 힘들었던 과정의 수천배가 넘는 만족감을 주는 책들이 있다. 윌리엄 포크너의 <소리와 분노>가 여기에 속한다. 장담하건대 이 소설을 읽기 시작하면 최소한 다섯번 이상 새로 시작하는 좌절을 맛보게 된다. 첫 페이지부터, 어렵다기보다는 이상한 문장이 계속된다. “그들이 깃발을 뽑았다. 그리고 그들이 치고 있었다. 그러더니 그들이 깃발을 도로 놓고 테이블로 갔다. 그리고 그가 치고 딴 사람이 쳤다.” 번역이 어색해서 그런가, 하면서 원서를 들춰봤다. 역시 마찬가지. 어려운 단어는 없는데 10여 페이지를 읽어도 도무지 무슨 얘긴지 짐작도 할 수 없었다. 책꽂이에 고이 모셔두고 가끔 쳐다만 봤다. 도대체 포크너를 읽어내는 사람들은 얼마나 천재란 말이냐, 남몰래 한탄을 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네 부분으로 구성된 이 소설의 첫 번째 화자(話者)인 벤지의 정신연령이 세살도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확한 어휘 구사는커녕 과거와 현재도 구분하지 못하는 백치의 이야기가 어떻게 쉽게 이해가 가겠는가. 그러나 그 뒤를 잇는 부분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중간에 끊어지는 문장, 시도 때도 없이 변하는 시점, 심지어 단어 대신에 그림이 그려져 있기도 하다.
줄거리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 소설은 퀜틴, 캐디, 제이슨 그리고 벤지라는 네 남매의 이야기를 통해서 콤슨 가문의 몰락을 그리고 있다. 둘째인 캐디는 한없는 애정으로 백치인 벤지를 돌보지만 난잡한 연애 끝에 임신을 하고는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가 이혼을 당한다. 캐디에 대해서 근친상간에 가까운 감정을 가지고 있는 퀜틴은 (실제 근친상간 여부는 불분명하다) 집안의 토지를 팔아서 하버드에 진학하지만 누이와의 관계에 대한 괴로움으로 자살을 한다. 가장 실제적인 성격의 제이슨은 돈 버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면서 캐디의 딸인 퀜틴(외삼촌과 이름이 같다)의 남자관계를 단속하려고 들지만, 결국 조카에게 평생 모은 돈을 도둑맞고 만다. 어떻게 보면 아침 드라마 같은 스토리지만 화자의 인식을 따라서 전개되는(그렇다. 이 소설은 국어시간에 말로만 듣던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한다) 서술을 통해서 독자는 인식과 현실의 차이, 기억하는 것과 실제 일어났던 일의 충돌을 끊임없이 경험하게 된다. 등장인물 저마다의 이해할 수 없는 집착과 그로 인한 몰락은 우리의 삶과 욕망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설명을 통하지 않고도 실감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극복하기 어려운 소설을 읽고 나면 마치 여러 개의 인생을 살아본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된다. 소설을 좋아한다면 아무리 힘이 들어도 반드시 읽어내야 할 책. 물론 “종이 닳지 않도록, 가게 문을 여는 순간 갓 구운 따끈한 빵 냄새와 함께 울리는 그 소리로부터 정적이 회복되는 데 너무 많은 정적이 소요되지 않도록, 작고 맑은 소리가 단 한번 울리게 종을 계량하여 조율한 듯했다”와 같은 아름다운 문장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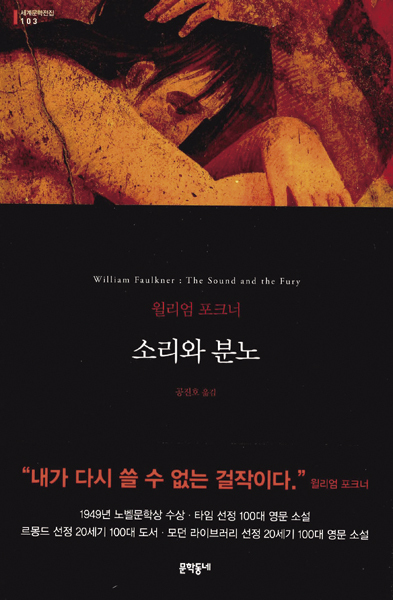
 에서 책구매하기
에서 책구매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