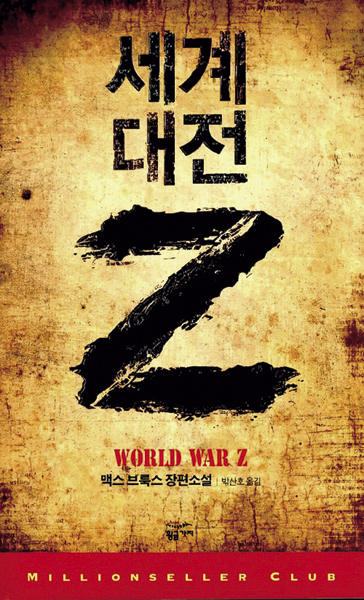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가상의 역사를 소재로 한 소설이 재미가 있으려면 무엇보다 그럴듯해야 한다. 우주로 진출한 인류의 전쟁사를 통하여 민주주의에 대해 자못 철학적인 접근을 시도한 <은하영웅전설>이나 2차대전에서 연합군이 패배한다는 가정 아래 식민지 미국의 모습을 그린 필립 K. 딕의 <높은 성의 사나이> 등이 모두 진지하고 논리적인 것도 그래서다.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이 실패로 돌아가는 데서 출발한 복거일의 <비명을 찾아서>는 온건파인 이토가 살아남으로써 일본이 무모한 진주만 공습을 포기하고 전승국이 된다는 줄거리로 이어지는데, 고개가 끄덕여질 만큼 설득력이 있다.
그렇다면 전혀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상황을 바탕으로 쓴 소설은 어떨까. 예를 들면 전세계에 좀비가 출현해서 인류를 공격하는 이야기라면? 맥스 브룩스의 <세계대전Z>는 잘 쓰기만 하면 이런 스토리까지도 정말 그럴듯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소설은 유엔의 위임을 받은 화자(話者)가 지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좀비와의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중국 충칭에서 최초로 좀비를 발견한 의사의 회고로부터, 초현대식 무기로 수백만의 좀비를 공격했다가 처참한 패배를 한- 미사일을 발사해도 수많은 좀비의 머리를 모두 파괴할 수는 없었다- 미군 보병의 경험담까지 생존자들의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것처럼 생생하다.
슬프게도, 좀비 전쟁에서 역전의 발판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비인간적인 전략에서 나온다. 인종차별이 만연할 당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인 정부는 흑인들이 전면적인 봉기를 할 경우 백인 일부를 희생양으로 제공함으로써 공격을 분산시키고 주요 인사와 전략적 거점을 지키는 비밀 대비책을 가지고 있었다. 넬슨 만델라로 보이는 등장인물이- 실명이 나오지는 않는다- 이미 오래전에 용도 폐기된 이 잔인한 대책의 실행에 동의한다. 다수의 힘없는 민간인이 좀비들에게 미끼로 제공되고, 전열을 정비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전세를 역전시킨다. 다른 나라 정부도 이 방법을 따른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 슬프면서도 설득력있게 다가오는 장면은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좀비가 나타난 이후 갑자기 북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판문점에 있던 인민군들까지 사라진다. 대한민국 국정원 차장 최형철은 비무장지대 너머를 바라보며 이렇게 회상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북한 사람들은 지하로 대피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하에서 전쟁 프로젝트를 수행하느라 여념이 없거나 혹은 땅굴 속에서 2300만명의 좀비가 되어서 풀려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죠.”
과연 좀비와의 전쟁에서 북한은 전멸하게 될까. 인류는 정말 비인간적인 작전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면 미리 좀비와의 전쟁에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을지 모른다. 작가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을 하는 독자들을 위해서 ‘좀비 서바이벌 가이드’라는 실제적인(!) 책도 써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