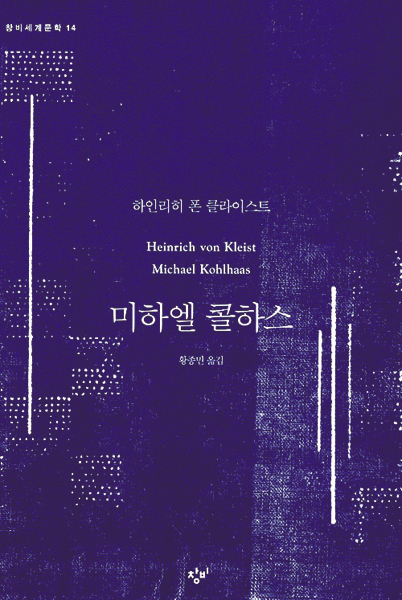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의 중/단편은 경제적인 이야기 진행으로 따지면 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촘촘함은 현대의 독자에게 무겁게 느껴질 성질의 것이다. 예컨대 요즘 TV드라마가 1회 만에 예전 4회 분량의 이야기를 속도감있게 보여준다면, 클라이스트의 소설에서는 한 문장이 거인의 발걸음처럼 몇년의 세월을 가뿐하게 쿵 건너뛰는 일이 예사로 발생한다. 다섯 페이지짜리 장중한 묘사가 그의 무기는 아니다. 게다가 한 문장에 중요한 정보들이 예사롭게 배치되어 ‘줄거리’ 중심으로 흘려 읽으면 재미라고는 맛보기 힘들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O. 후작부인>은 “그러고선 (장교는) 이 모든 소동에 말을 잃은 부인을 불길이 미치지 않은 성의 다른 쪽 곁채로 데리고 갔고, 여기서 부인은 까무러쳐 쓰러졌다. 그런 뒤-하녀들이 깜짝 놀란 얼굴로 곧바로 몰려오자, 장교는 의사를 불러오게 했다”라는 문장에서 장교의 기사도 이면의 이것과 저것을 고작 ‘그런 뒤-’라고 슬쩍 뭉개는데 생각할수록 이 한마디가 잊히지 않는 이유는 <O. 후작부인>이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이다. “북부 이탈리아의 한 주요 도시 M.에서 바른 행실로 이름 높은 귀부인이자 두 아이를 곱게 기른 어머니였던 미망인 O. 후작부인이 여러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다. 저도 모르는 새에 아이를 가졌으니, 태어날 아이의 아버지는 연락해주기 바랍니다.”
한때 클라이스트처럼 소설을 쓰고 싶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문제의 ‘그런 뒤-’가 압축인지 생략인지를 아주 오랫동안 궁금해했었다. 34살에 권총자살한 이 소설가는 현대의 대중소설 작가들이 각종 문장부호를 동원한 대화문으로 처리하는 속도감있는 전개를 가전제품 사용설명서 같은 문장의 연쇄로 마무리했고, 형용사를 쓸 때는 아름다움보다는 도덕에 관련된 어휘들을 중요한 위치에 놓았다. 낙관에 코웃음치면서도 이상을 포기하지 못한 젊은 작가의 큰 걸음걸이가 압축과 생략을 동시에 가능하게 한 것은 아닐까. 이보다 더 뜨겁게 확신에 찬 발걸음을 문장으로 내딛는다면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이 될 것이다. 클라이스트는 어디까지나 소설가. 중편 <미하엘 콜하스>는 “정의감이 지나쳐 콜하스는 도적이자 살인자가 되었다”는 사내에 관한 이야기다. 자신이 겪은 억울한 일이 타인에게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굳이 어려운 일을 자청한 이 남자는 자신을 말리려는 아내에게 단호하게 말한다. “내가 생업을 계속하기 위해 부당함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기 위해 필요한 자유를 나에게 허락해주시오!” <마의 산> <부덴브로크 가의 사람들>의 토마스 만은 “하인리히 폰 클라이스트가 없었더라면 클라이스트란 성은 허섭스레기일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 과장된 수사야말로 클라이스트를 상찬하는 데 있어 최적의 것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