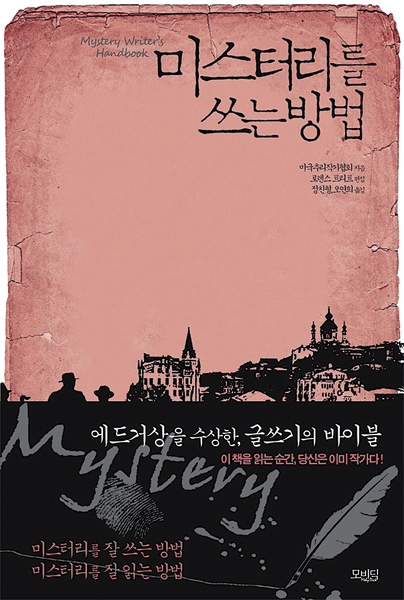<미스터리를 쓰는 방법>은 설문을 통해 완성되었다. 미국 추리작가협회의 모든 회원에게 여섯개의 질문을 발송, 수백통이 넘는 회신 중 엄선된 내용을 묶어 엮었다. 첫 번째 질문 “왜 쓰는가?”에서 시작해 상투성을 피하는 법, 언제 어떻게 쓰는지의 요령, 잘 쓰는 비결이 언급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비결은 없고, 이 설문에 응답한 사람들도 다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가엾은 영혼들이라는 정도가 되려나. 확실한 성공으로 가는 하나의 방법은 있지도 않고 이 책도 그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꽤나 시시콜콜한 조언들은 이런 식이다. “퍼트리샤 하이스미스(<리플리> 시리즈의 저자-편집자) 같은 많은 작가들은 스프링 노트를 사용한다고 밝힌 반면에, 또 다른 작가들은 분류카드나 클립보드를 선호한다고 이야기했다.”
설문의 내용이 전부는 아니다. 미스터리의 하위 장르 구성이나 이야기 구조 짜는 법, 범죄사건 수사에 대한 기초 사항 같은 초급자를 위한 기본 상식도 실려 있다. 글을 완성한 다음에 가장 골치아픈 문제인 ‘편집자를 사로잡는 법’도 한 자리를 차지한다. 다만 이 책은 1976년에 처음 쓰였다는 것. 글쓰기라는 것의 기본 성격이 장르나 시대가 달라진다고 해서 크게 바뀌지는 않지만 세부사항에 이르면 펜이나 타이프라이터로 글을 쓰지 않는 시대에 무용해 보이는 조언들도 종종 눈에 띈다. 스티븐 킹의 걸출한 작법서 <유혹하는 글쓰기>에서처럼 이 책에서도 가장 빛나는 대목은 원고 수정과 삭제에 대한 글이다. “널리 알려져 전설이 된 소수의 예외적인 작품을 제외하고는, 사실 제대로 된 문법을 구사하고 정확한 철자를 사용하면 소설의 매력은 더욱 돋보이기 마련이다. 특히 초보자의 작품인 경우에는 편집자가 이런 요소를 고려하는 비중이 크다. 초안을 쓰느라 진땀을 뺀 나머지 더이상 사전에 손을 뻗고 싶지 않겠지만, 원고를 발송하기 전에 사전에서 필요한 부분을 반드시 확인할 각오를 해야 한다.” “각 문장과 문단에 대해 ‘이야기 구조를 훼손하지 않고 지울 수 있을까?’라고 자문하면서 글 전체를 읽어보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몇몇 대목은 장르적 글쓰기만이 아니라 글쓰기 전반에 대한 조언이다.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이 책의 백미는 작가들의 설문 답변이다. 시시콜콜한 하소연(“나의 가장 큰 장애물은 첫 쪽의 첫 단어다.”-<특별요리>의 스탠리 엘린)과 경험에서 오는 과장된 비장함(“한 쪽을 끝낼 때마다 항상 그것이 최종본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써라. 그러면 그 쪽을 또다시 다른 내용으로 수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수정할 기회가 있다는 편안한 마음으로 글을 쓰면 작품이 너무 느슨해지고 산만해져서….”-<푸른 작별>의 존 D. 맥도널드)에서 전달되는 불안과 기쁨이 있다. 모르긴 해도, 설문에 답한 작가 중 몇은 소설이 잘 풀리지 않아 한숨 돌리려고 이 설문에 열심히 답을 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