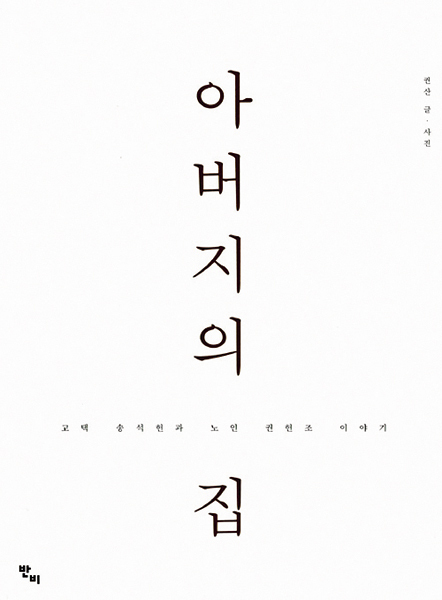9월 말에 부석사에 다녀왔다. 차 없이 대중교통만을 이용해, 새벽에 청량리역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풍기역으로 가서 버스로 부석사에 가는 여정이었다. 기차에서도 버스에서도 내가 최연소 승객이었다. 부석사까지의 버스에서 본 밖의 풍경 중 가장 잊을 수 없는 것은, 그 차를 타고 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살고 있는 시골집들이었다. 이리저리 기울어 있는 집에서 허리가 잔뜩 굽은 할머니가 마당에 빨래를 넌다. 할머니의 옷가지뿐이다. 경기도 인근의 농가에서는 피부색 다른 며느리도 드물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날 그곳에는 온통 할머니, 할아버지뿐이었다. 폐가를 이웃해 사는 마지막 주거자들. 어떤 집도 처음부터 폐가는 아니었으리라. 마지막으로 집을 지키는 노인이 세상을 떠나면, 그 집은 그대로 죽어버린다. 그 명징한 사실이 삼십여분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붉게 물든 사과와 더불어 나를 잡아끌었다(한편으로는, 그 누구의 죽음으로도 집의 수명이 다하지 않는 도시의 주거문화도 생각해보게 된다. 도시의 집은 오로지 자산가치로만 평가된다).
<아버지의 집>은 전면 보수에 들어가는 고택과 그 고택 최후의 거주자를 포착한 책이다. 글보다 사진이 말한다. 경북 봉화에 있는 송석헌은 중요 민속자료 제246호로 지정된 옛 살림집으로, 영남 지방 사대부 저택의 면모를 고루 갖추고 있는 가옥이다. 이 책을 쓴 이는 누군가에게는 <시골에서 농사짓지 않고 사는 법>으로, 누군가에게는 ‘지리산닷컴’ 운영자로 알려져 있을 권산이다. 풍기에 가기까지의 이야기 같은 것을 반쯤 흘려보내듯 책장을 넘기다가 2010년 7월9일 금요일 새벽 5시39분 송석헌의 문이 열리고 갓을 쓴 어르신이 쑥 튀어나오면 그때부터 다급하게 책장을 넘기면서 어르신의 뒤를 쫓는 권산의 기분이 되어 급히 발을 놀리며 눈길을 여기저기로 돌린다. 말없이 앞장선 노인이 가끔 멈추어 서서 숨을 고르며 향한 곳은 부모와 조상들의 산소가 있는 뒷산이다. 아침 문안 인사를 하고 산소를 둘러보신다. 자주 숨을 고르지 않으면 다음 발걸음을 하기 힘든 어르신, 전면 공사를 앞둔 고택. 권산은 말한다. “노인과 집은, 하나였다.” 그리고 “집도 사람도 추억으로 현재를 연명하고 있었다”. 그가 사진을 찍지 않은 집의 일부에 대해 생각하는 일은 아프고 쓸쓸하다.
할아버지 혼자 사는 집. 꽤 큰 규모의 한옥임에도 사용하는 공간은 사랑채 한칸과 부엌뿐. 갓을 쓴 할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이백자 원고지에 붓글씨를 쓰는 방. 원고지의 칸을 하나씩 채워나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갈하고 충만한 글씨. 안동 권씨 가문의 후손 권헌조 옹의 어느 하루는 그렇게 사진으로 남았다. 그리고 두번의 방문이 더 이루어진다. 한번은 수리 중인 송석헌과 집수리의 소음을 피해 병원에 입원한 권헌조 옹을 만나기 위해, 또 한번은 세상을 떠난 권헌조 옹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책장을 넘기는 손이 점점 무거워지고 느려진다. 나이들어가는 나를 위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도 서늘한 그림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