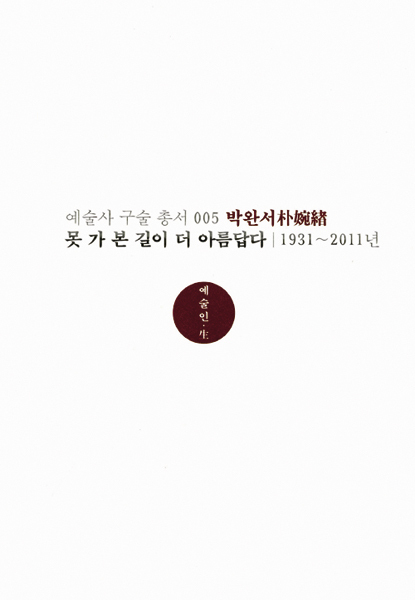어떤 책을 ‘소장용’이라고 부르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내용이 좋아서, 혹은 필요해서 두고두고 봐야 할 경우가 그 첫째, 물건으로서의 아름다움이 빼어나 애착을 갖게 된 경우가 두 번째, 작가에 대한 애정이 특별한 경우 등. 가장 좋은 경우는 그 모두가 이유일 때다. 국립예술자료원이 기획하고 수류산방이 펴낸 예술사구술총서(시리즈 1권은 한반도 르네상스의 기획자 박용구 편이었다) 다섯 번째 책 <박완서, 못 가 본 길이 더 아름답다>가 그렇다. 소설가 박완서의 사진자료를 포함한 그의 인생의 매 순간에 대한 정리,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 사회활동까지를 정리했다. 집으로 더듬어보는 작품의 궤적과 딸 호원숙의 참고 구술도 실렸다. 어디까지나 구술을 기본으로 한 기록물이기 때문에 그 읽는 맛을 살리기 위해, 오른쪽 페이지에 구술이 흐르는 동안 왼쪽 페이지를 구술 내용과 연관된 각주로 처리했다. 예술사구술총서가 소장용으로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이 풍부한 각주 때문으로, 구술과 각주가 서로를 보완하며 20세기 한국사를 문화인들의 삶을 통해 새로 구성하고 생각해보게 돕는다는 데 있다. 오른쪽 페이지의 말과 왼쪽 페이지의 부연이 대화하면서 세월을 밀어가며 진행되는 셈이다. 물론, 들고 다니기 벅찬 크기와 무게도 집에 모시게 만드는 까닭이긴 하지만. 책 표지는 이중으로 되어 있어 겉표지는 마치 보물지도처럼 크게 펼칠 수 있으며, 표지의 글과 사진은 책 전체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보여준다.
박완서를 알기 위해서는 박완서의 산문을 읽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박완서와 그 독자인 우리를 이해하는 데는 이 책이 믿음직한 안내인이 되어준다. 1970년대에 대한 박완서의 시선은 박정희의 독재에 대해서만큼이나 우리 내부를 향한다. “산업사회화돼가면서 사람들이 온통 ‘잘살아보세’ 할 때예요. 지금에 비하면 가난하지만 정말 극빈했을 때에 비하면 나아질 때지요. 새마을운동이 일어나고 경제 제일주의가 막 일어날 때예요. 그럴 때 인간성은 얼마나 메마르고 타락해지나.” 독재의 칼날이 나를 피해가고 경제발전의 열매를 내가 딸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기꺼이 속물이 되는가. “우리 중산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경제적 상승 욕구가 강할 때 심성은 얼마나 황폐하고 속물스러워지나, 1977년이면… 거의 30년 된 얘긴데도,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지금까지도 거의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유기해버린 것, 그전에 믿었던 인간성의 회복. 박완서가 계속 쓰고 읽혔던 이유.
글을 읽는 것 말고도, 박완서의 사진들을 크게 만나는 순간들의 벅찬 반가움이 여기 있다. 어깨를 살짝 위로 치켜올리고 두눈은 초승달처럼, 입은 반달처럼 웃는 얼굴. 그 모든 대화를 통과해 박완서의 ‘얼굴’을 마주하는 일의 기꺼움. 다시, 박완서를 읽을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