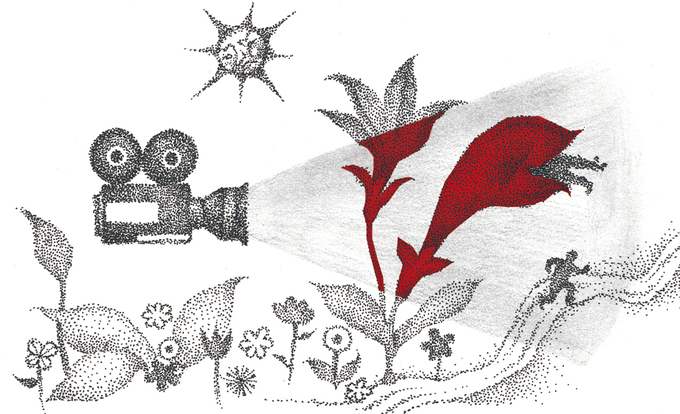요즘 제작 중인 다큐멘터리는 40년대 해방 전후의 내용을 주제로 하고 있다. 그 덕에 때늦은 역사 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다. 워낙 배경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어떤 자료든 한줄 읽어내려가다 보면 새롭게 찾아야 할 인물이나 사건이 꼭 하나둘씩 등장하는 식이다. 정규교육과정에서 내가 근현대사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접하지 못했는지 피부로, 아니 뼛속 깊이 체감하고 있다.
하지만 나를 서글프게 하는 건 단지 나의 무식함만은 아니다. 오히려 조금씩 더 유식(?)해질수록 해방 전후의 대한민국의 상황이 지금의 현실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바로 그 점이 나를 가장 서글프게 만든다. 아니 어디 지금의 현실만 그렇겠는가? 해방 이후 60여년간의 우리나라 사회는 당시의 모순과 굴레를 그대로 간직한 채 계속 같은 상황을 반복하고 있다. 도대체 몇 번째 매트릭스이고 몇 번째 네오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
<매트릭스>를 떠올리니 ‘스미스’가 생각이 났다. 모든 대상을 오직 자신으로 치환해버리는 극중 악당 스미스 말이다. 영화를 볼 때만 하더라도 딱히 구체적인 무언가를 떠올리지 않았는데 요즘 우리나라에 몰아치는 색깔론을 보니 스미스에 정확하게 대입이 됐다. 부정이냐 부실이냐로 촉발되었던 통합진보당 경선 사태는 그 본질은 사라진 채 어느덧 스미스에 의해 색깔론으로 완벽하게 치환되어 있었다.
사건의 본질만이 아니다. 수구언론은 물론 진보언론, 진보지식인들까지 스미스에게 점령당해버렸다. 마녀사냥을 그토록 경계하던 많은 진보지식인들 역시 색깔론 앞에선 무력하다. 해방 전후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우파 독립운동가들, 민족주의 독립운동가들, 심지어 중도 좌파 독립운동가들까지 ‘빨갱이’라는 한마디에 무력화되고 말았다. 이승만은 바로 그 ‘색깔론’을 통해 권력을 잡았고 이후 모든 권력자들에게 롤모델이 됐다.
이처럼 특정 대상에 대한 극단적 혐오감과 공포심을 자극하는 방법은 나치의 선전장관 괴벨스가 가장 애용하던 방법이었다. 그렇게 수백만명의 유대인과 집시들이 아무 죄없이 죽임을 당했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었다. 그 과정에서 독일인들은 보편적인 상식에서 벗어나 극단적 사고를 체화한다. 정상적인 사회라면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야 할 ‘중도’적인 입장은 묵살되고 가장 소수여야 할 ‘극단성’이 오히려 판을 치게 되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극단성은 색깔론으로 몰려 배척의 대상이 되는 이들에게 ‘희생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들은 ‘희생자’가 됨으로써 색깔론과 관련없는 자신들의 잘못을 면죄받게 된다. 의도적이든 아니든 일종의 ‘적대적 공존’의 시스템이 마련되는 셈이다. 그 시스템 안에서는 ‘통일’이란 상식적 수준의 논의는 사라지고 대신 북진통일을 염원하는 이들과 북한체제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하지만 실제로는 북침을 하지도 않고 북한의 체제 속에서 살지도 않는 극소수가 좌지우지하는 대한민국이 되고 만다.
안타깝게도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이러한 오래된 실수를 아주 정확하게 다시 반복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