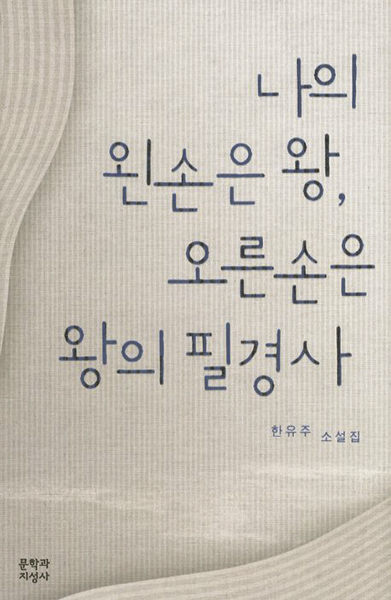작가는 전생에 죄지은 사람이라 했다. 글을 쓸 여건이 안돼도 기어이 쓰고야 마는 작가 일반의 습성을 가리킨 말이리라. 그런데 한유주의 신작은, 글쓰기 자체에 대해 머뭇거린다. 소설의 역사가 이토록 길고 작품들이 박물관의 유물들처럼 쌓여 있는 마당에, 새롭게 뭔가를 쓴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질문. “베끼고 베껴지는 것은, 우리가 공유하는 숙명과도 같은 것.” 그래서 작가는 본인이 영향을 받았을 고전들, 서사들을 해체하고 재조립한다. <자연사 박물관>은, 극장 주위에서 만난 두 남자의 이야기인 베른하르트의 단편 <희극입니까? 비극입니까?>를 새로 쓴다. 원작에선 이름 없던 남자 둘에게 이름을 부여하고, 그들의 가족사를 상상한다. 또 숙부의 겉옷에 대한 몽상에 잠기는 <머리에 총을>은, 자살한 숙부의 비옷에 대한 베른하르트의 단편 <비옷>을 떠오르게 한다.
미래는 보이지 않기 때문일까, 소설은 산뜻하고 경쾌한 톤을 잃지 않지만 속내는 울적하고 비관적인 인상이다. “나와 여러분의 운명이란, 불시에 어디선가 죽음을 맞게 되리라는 것뿐.” 역시 베른하르트에게서 영감을 받아 제목을 지었을 두 단편 <인력입니까, 척력입니까> <인력이거나, 척력이거나>는 대재난으로 세상의 절반이 물에 잠겨 사람들이 헤엄쳐다닌다는 설정이다. 핵심은, 종이책이 대부분 젖어버렸기 때문에 많은 책들이 소실되고 남은 책들은 스스로 진화한다는 것. 이렇게 대재난에서조차 부각되는 건 책의 소멸. 그렇다면 질문을 반대로 던질 수도 있지 않을까. 왜 소설의 불가능성에 강박적으로 매달리는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픽션들이 생산되고 있지 않은가. 비슷비슷한 것 투성이고, 과거의 텍스트 더미를 뒤져보면 베낀 거나 다름없을 작업들이겠지만 손쉬운 대답은, 소설이 영화와 드라마와 게임 등에 침식당하는 위태로운 상황을 맞이하여, 자신만이 갖고 있는 요소, 언어 실험이나 문학의 본질 탐구에 파고들게 된 것 아니냐는 얘기. 대답이 무엇이건, 세상에 무의미한 말들이 너무 많다 느껴질 때, 말의 뼈를 만져보고 싶을 때, 집어들면 좋을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