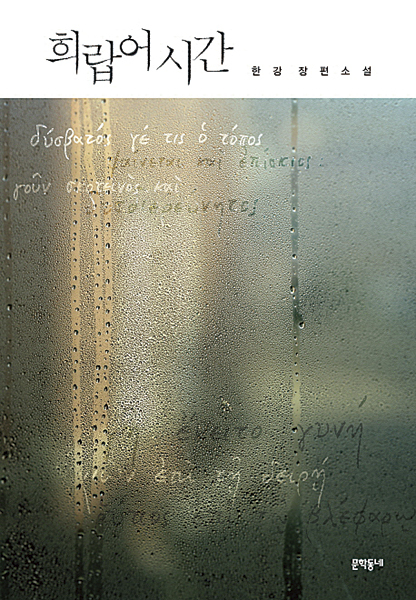이번 신작도 한강의 문장은 여전하다. 손쉬운 찬사는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필사적으로 쓴 문장들. 내용은 단순하다. 양육권을 잃고 실어증에 걸린 여주인공이 말을 다시 하고자 언어의 본질을 건드리는 고어인 희랍어를 배우면서, 시력을 잃어가는 강사와 친해진다. 한강의 소설평에 늘 언급되듯 이야기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 그녀의 묘사를 따라, “어둑한 은숫가락” 같은 달, “희끗한 혼령 같은” 민들레 홀씨 등 지나치기 쉬운 자연을 되새기고, 희랍어를 “우렁우렁 따라 읽는” 변두리 교실을 엿보고, “검고 단단한 숲” 같은 밤을 거닐다 “오래되고 희미한 적의 같은” 침묵이 밴 막차를 타자. 읽다보면 어둑어둑한 도시의 거리를, 소리를 제거하고 촬영한 동영상을 감상하는 기분이 든다. 문장의 달인이 도시를 활보하다 이미지를 채집해 매끄럽게 편집한 조각물이라고 할까. 실제로 보면 무감각하겠지만, 문장을 통해 무척 아름다워진 풍경.
캐릭터들도 한강식의 익숙한 모습 그대로다. 마르고, 영민한 눈을 지녔고, 바람이 불면 보풀이 인 코트 단추를 꼭 여미고 꼿꼿이 걸어가는, 식물 같은 여자. 그런 여자에게 잘 어울리는, 과묵하고, 점잖고, 얼굴의 흉터가 사연있어 보이는 남자. 그들은 밤새 술을 마시고 춤을 추거나 카드를 긁어 여행을 떠나는 도시적 쾌락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다. 여자는 수입이 얼마 없어 이혼한 남편이 양육권을 가져갔는데 무작정 소송에만 목을 매고, 남자는 시력이 좋지 않은데도 가족을 떠나 위험하게 홀로 서기를 고집한다. 그런 점에서 환상에 가까운 인물들이다. 세계에서 소외된 일종의 피해자들이라는 환상. 이런 식의 환상은 손쉬워 보이고, 애초에 언어의 문제를 부각하기 위해 실어증에 걸린 여자를 내세우는 것부터 쉬운 선택 같지만, 이 책이 상정하는 독자들에게 문제가 될 것 같진 않다. 곱고 단호한 말글에 젖어 마음이 단련되고 정화되는 아날로그적 독서 경험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