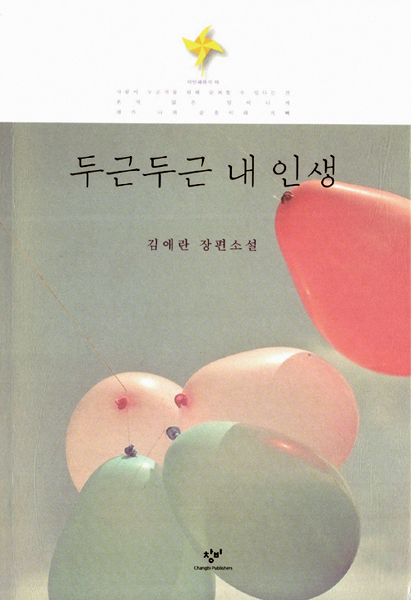이야기 뼈대는 인간극장이다. 열일곱에 사고 친 “어리고 철없고 어여쁜” 부모와 올해 열일곱이나 조로증에 걸려 신체나이 팔십살인 아이 한아름.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아름은 병원비를 벌기 위해 전화 한통에 1천원씩 기부하는 TV프로그램을 촬영한다. 마음 두근거리는 만남도 가지고, 일탈이라 부르기도 뭣하지만 쇠약한 그에겐 쉽지 않은 일탈도 저지른다.
빤한 얘긴가 걱정은 버리시라. 작가의 입안에서 몇번이고 굴려진 끝에 탄생했을 곱고도 적확한 김애란표 말들이 넘실댄다. 특히 “가슴 한쪽이 쿡쿡 아렸지만 마음이 그런 건지 심장이 나빠 그런 건지 구별할 수 없었다”, “저는 마음보다 몸이 빨리 자라서, 그 속도를 따라가려면 마음도 빨리빨리 키워놓지 않으면 안되거든요”처럼 의뭉스럽게 돌려 말해 감동의 잽을 날리는 표현들이 쑥쑥 들어온다. 유머도 여전하다. 부모 되어 돈이나 벌자고 아버지가 연 나이키 매장이 망한 다음 가족들은 나이키 옷으로 빼입는데 “모든 것이 진품인데도 우리 식구가 걸치면 가짜처럼 보인다는 거였다”.
작가의 고향이었을 시골의 90년대 묘사도 통통 튄다. 관광단지 건설로 “비싼 영양제를 맞은 환자”처럼 잠깐 시끌벅적해진 마을 분위기라든지 도시서 전학 온 소년이 선물하는 ‘빈소년합창단’ 테이프가 고급 취향의 상징이고 캘빈클라인 팬티는 부유함의 상징이고 미팅코스는 찻집과 노래방인 학생들 모습이 함박웃음 짓게 한다. 작가의 첫 장편인 만큼 이전 단편들의 그림자가 짙게 배어 있다. <달려라 아비>에서 가족 이야기를 마음 찡하게 그려냈던 애늙은이 같은 시선 말이다. 그러고 보면 아름이 조로증에 걸린 설정과도 통한다.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 어른스러운 아이니까. 등장인물 모두가 파국적인 갈등없이 인생에 통달한 대화를 다정하게 나누는 모습이 동화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갈등이 끓어넘치는 현실에서 물러서고 싶을 때, 평범하고 단점도 있지만 유머감각 하나는 참 괜찮은 사람들이 진실하게 사는 세계가 반가우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