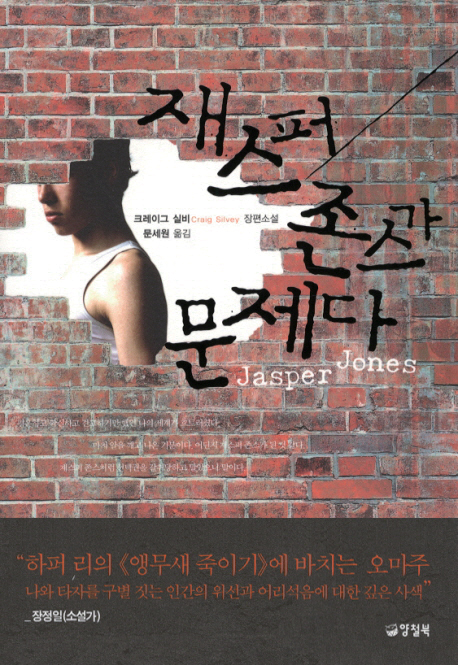찜통처럼 무더운 밤, 동네 공식 문제아 재스퍼 존스가 허약한 문학소년 찰리 벅틴을 찾는다. 여자친구 로라 위셔트가 살해당했기 때문이다. 찰리와 재스퍼는 로라의 시체를 일단 숨기고 범인을 찾기로 한다. 신고해봐야 재스퍼가 범인으로 몰릴 게 뻔하다. 고작 열다섯살 소년이 어떻게 살해범으로 지목될 수 있는지 의아한데, 1960년대 말 오스트레일리아의 작은 마을 코리건에서는 가능하다. 스포츠를 사랑하는 건전한 백인이 사는 곳. 그러나 ‘왕따’들이 테러를 당하면 침묵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결속을 은밀히 확인하는 곳. ‘왕따’ 대상자는 혼혈인이자 제멋대로 사는 소년 재스퍼, 전쟁을 피해온 베트남인 제프리 루의 가족, 미치광이 살인마 취급을 받는 은둔자 잭 라이어넬 등이다.
소설은 시체 유기로 시작하나 본격 추리로 흐르지는 않는다. 로라의 실종을 계기로 공포가 횡행하는 마을에서, 끔찍한 비밀을 껴안은 찰리와 친구들이 성장하는 과정을 그린다. 찰리는 “남들보다 가난하고, 피부색이 어둡고, 또 부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타인을 차별하는 세상에 분노한다. 마크 트웨인의 소설들을 끼고서 ‘허구’와 ‘사실’을 섞어 이야기를 만든다. 친구 제프리는 자신을 따돌리는 크리켓팀에 끼려고 끈질기게 도전한다. 그리고 재스퍼는 홀로 살아남는 기술을 익힌다. 이처럼 억압적인 세계와 투명한 영혼을 지닌 청소년들의 대결은 <호밀밭의 파수꾼>을 비롯한 성장소설의 전형적인 구도다. 이 소설만의 매력이라면, 분노가 넘실대지만 건강한 유머를 잊지 않는다는 점이다. 간결하면서도 힘이 넘치는 문체가 때로 지나치게 어른스럽고 올곧은 말을 토해내는 찰리와 재스퍼에게 생기를 부여한다.
결론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선해 보이는 자들이 사실은 가장 악했느니라. 베트남전에 휘말린 오스트레일리아 사회의 억압적인 면이 흥미롭다. ‘빨갱이’라는 말로 따돌림과 테러가 이루어지는 장면은 21세기 한국사회에서도 낯설지 않아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