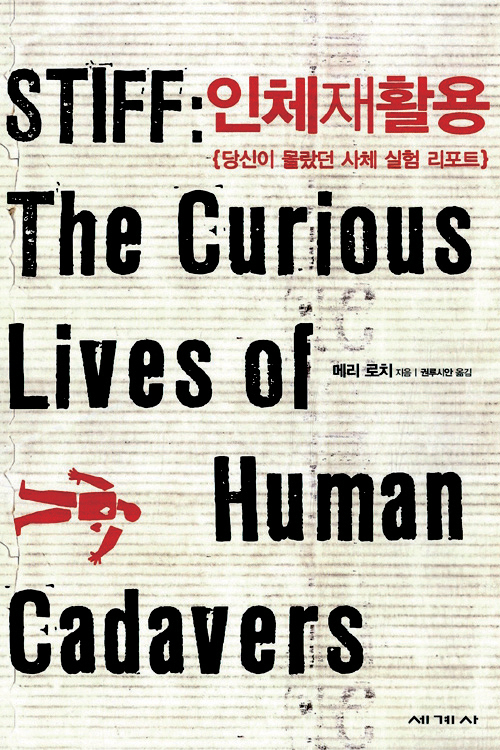<CSI>나 <크리미널 마인드>를 비롯한 범죄물에는 분기탱천해 총을 들고 용의자의 집 문을 박차고 들어가는 경찰이나 FBI가 자주 나온다. 용의자의 집에는 범죄사건을 모은 스크랩이나 해부학, 폭발물 관련 책이 쌓여 있어서 “이런 인간이 제정신일 리 없어” 하는 의심을 더하게 마련이다. 그런 장면을 볼 때면 내 방이 저 사람들에게 수색당할 상황에 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싶은 근심이 묵직하게 양 어깨에 올라탄다. 책장에는 미스터리 소설과 범죄심리학이니 하는 책들이 너무 많다. 방 안은 어수선한데다가 여기저기 각종 술이 켜켜이 누워 있다. 컴퓨터를 뒤져도 나을 건 없다. 대체 나 같은 사람이 수상하지 않다면 누가 수상하다는 말인가. … 벽지라도 핑크색으로 바꿔볼까.
<스푸크> <봉크>의 메리 로치는 이런 ‘수상해 보이는’ 걸로 따지면 테드 번디급이다. “시체는 우리의 슈퍼히어로”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로치는(이름도 하필 바퀴벌레다) 죽은 상태에서만 할 수 있는 주목할 만한 업적에 대한 논픽션 <인체재활용>을 썼다(2004년 출간된 <스티프> 개정판인 이 책은 메리 로치 최고작이다). 의대생들의 해부학 실습 정도를 다루겠지 하고 이 책을 본다면 청계천을 보고 바다를 상상하는 우를 범하는 것과 똑같다. 성형외과 의사들이 주름제거 실습을 위해 시체의 목을 잘라 일렬로 늫어놓은 광경을 묘사한 대목은 상상하기가 너무 쉬워서 작가가 원망스럽다. 목을 자르는 일을 하는 담당은 따로 있다. 굳이 목만 자르는 이유? 나머지 부분은 다 다른 용도로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주름제거 수술을 받은 머리들은 월요일에 코 성형을 이미 한 차례 받았다고. 사체 기증서에 서명을 할 때 상상하지 못했던 용도. 심지어 기증된 피부가 화상 환자에게 이식되지 않을 경우 처리 과정을 거쳐 주름살 제거나 남성 성기 확대에 이용되기도 한다. 심지어 그 전설적인 80년대 도시전설! 인육만두와 관련된 이야기도 등장한다는 사실. “중국인들은 기자들, 특히 외국인 기자들을 경계한다. 그 가운데에서도 돈을 내고 찾아온 손님의 가족을 자기 직원이 절단하여 만두로 만들지 않았느냐고 묻는 외국인 기자들은 특히 더 경계한다.”
많은 대학들이 이런 기증된 시신을 위해 영결식을 따로 거행해 예를 다한다. 하지만 이런 영결식이 있기 이전, 시체를 훔치고 팔고 비인간적으로 대하던 오랜 역사가 있었다. 이 모든 과정이 아주 유연하게 흘러간다. 옷을 벗긴 사체에 총격 실험을 하는 장면까지도. 메리 로치는 인간의 육체가 사후 재활용되는 모든 현장에 독자를 끌어들인다. 너무 살갑고 다정하고 친절해서 가끔은 무섭… 아니, 실감난다. 무엇보다 사체 기증이 얼마나 의미있고 위대한지를 뼛속 깊이 새길 수 있는 책이기도 하다. 하지만 나는 죽어서도 의미있고 위대한 인간이 될 수는 없겠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