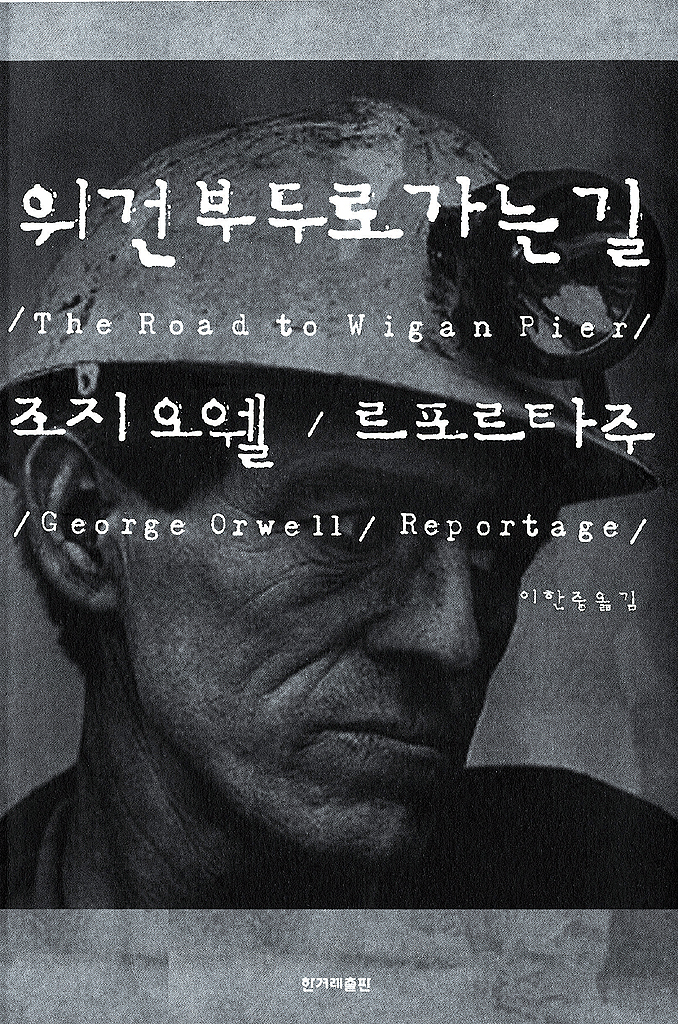조지 오웰에 반하다 지수 ★★★★★ 친구에게 꼭 권하고 싶다 지수 ★★★★★
“탄광의 여건이 지금보다 열악했던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젊을 때 땅속에서 허리에 마구馬具 같은 띠를 차고 두 다리를 사슬로 이은 채, 팔다리로 기고 광차를 끌며 일하던 할머니들이 아직도 더러 살아 있다. 그들은 임신한 상태로도 그런 일을 하곤 했다. 나는 심지어 지금도 만일 임신한 여자들이 땅속을 기어다니지 않으면 석탄을 얻을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석탄 없이 살기보다는 그들에게 그런 일을 시키리라 생각한다. 어떤 육체노동이든 다 그렇다. 그것 덕분에 살면서도 우리는 그것의 존재를 망각한다.”
노동과 계급, 그리고 삶(의 질)에 얽힌 문제는 조지 오웰을 따라다녔다. 아니, 조지 오웰이 기꺼이 그런 문제들을 찾아다녔다는 쪽이 옳을지도 모르겠다. 1903년 영국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태어난 그는 자칭 ‘하급 상류 중산층’이었다. <위건 부두로 가는 길>은 그가 랭크셔와 요크셔 지방 일대의 탄광 노동자들의 실업 문제에 대한 르포를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1936년 초 두달에 걸쳐 행한 조사결과를 반영한 저작이다. 앞선 인용문처럼 영국사회와 인간 본성이 낳은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이어지는데, 이 비판의 대상은 산업가나 지배계급뿐이 아니다. “모든 사회주의자들이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끔찍한 전문용어도 문제다. 일반인들은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니 ‘프롤레타리아의 연대’니 ‘수용자들에 대한 수용’이니 하는 말을 들으면 영감을 받는 게 아니라 정나미가 떨어질 뿐이다. 심지어 ‘동지’라는 말 한마디만 해도 사회주의 운동을 불신하는 데 적지만 한몫을 했다.” 덜된 좌파 지식인들 역시 그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뜻이다. 이 책이 다루는 사회문제는 지금의 한국과도 꽤 닮아 있는데 “반즐리의 경우, 노동계급을 위해 공중목욕탕은 물론이요 적어도 신규 주택 2천채가 필요하다고들 하는데도 최근에 시 청사 신축에 15만파운드를 썼다”는 대목만 해도 고유명사와 화폐단위만 바꾸면 한국 신문에서 읽었을 법한 이야기다. 그리고 이 르포타주는 이후 조지 오웰이 <동물농장>과 <1984>를 쓰는 근간을 이룬다.
조지 오웰은 이 글을 쓰면서 거리를 두거나 ‘객관적’인 체하지 않았다.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이 바로 거기에 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려고 애쓰는 동시에 그릇된 현실을 냉소하는 데는 힘을 아끼지 않았다. 비명이 절로 나게 처절한 생존의 이야기에 통찰이 스미고 블랙유머가 깃든다. 너무 쫄깃하게 잘 읽혀서, 이런 비극적 현실담에 이렇게 매혹되는 게 올바른 일일까 죄책감이 들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