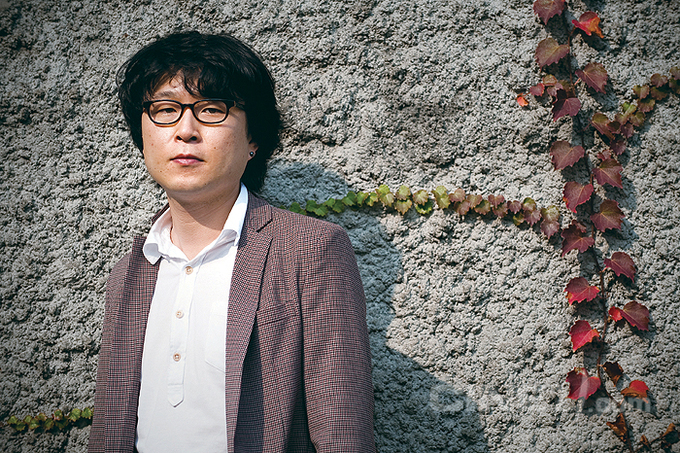김영진(35) 프로듀서도 한때 그렇게 여겼다. 유능한 프로듀서의 조건은 뛰어난 ‘머리’가 아니라 부지런한 ‘발’이라고. 그래서 제작부 막내 때부터 부지런히 뛰었고, 그토록 원하던 프로듀서가 됐다. 10년 가까이 일했던 싸이더스FNH에서 나와 1년 전 로케트필름을 차리기도 했다. 독립 선언을 했지만, 그러나 설 자리가 없었다. 공들여 매만진 <잠시 다녀오겠습니다> 시나리오는 ‘프로듀서가 기획했다는 이유로’ 투자사의 관심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현실은 여전히 프로듀서의 ‘머리’보다 ‘발’을 원했다.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이하 PGK)과 부산국제영화제가 공동으로 마련한 ‘KPIF(Korean Producers in Focus) 2009’에 지원했던 것도 그런 이유 때문. <블루문>(권선국), <좋은 친구들>(최은화), <잃을 것도 없다>(신철), <천도>(윤준형) 등과 함께 ‘KPIF 2009’에 선정되어 해운대를 찾은 투자자들과 뒤늦게 미팅을 가진 그를 만났다.
-<잠시 다녀오겠습니다>는 ‘KPIF 2009’에서 1등 격인 ‘프라임초이스’도 수상했다. =시놉시스 단계에서 인정받은 거니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현장에서 프로듀서가 시나리오 썼다고 하면 관심을 안 갖는다. 프로듀서들이 무슨 기획을 해, 하지. 유명 감독, 유명 작가가 썼다고 하면 그 자체만으로 ‘어, 재밌겠는데’ 하겠지만. 적어도 KPIF 행사가 프로듀서들에게 큰 격려가 되는 것은 사실이다. 행사를 후원해준 프라임엔터테인먼트의 용기도 고맙고.
-심사 총평 중 ‘저예산’을 장점으로 내세운 프로젝트들이 많아서 씁쓸했다는 지적이 눈에 띄더라. =나는 반대로 했다. 예산 제대로 들여서 찍고 싶다고 했더니 다들 좋아했다. (웃음) <잠시 다녀오겠습니다>는 개성공단을 배경으로 한 남북 청년들의 사랑 이야기다. 예선 피칭 때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박지성-정대세 선수의 악수 등을 담은 영상을 준비했는데, 너무 구린 것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다. 실제 시나리오는 예쁘고 슬픈 정통 멜로다. 다만 너무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보일까봐 시의성있는 영상을 붙였는데, 통일에 대한 도덕적, 의무적 강요를 떼고 가는 게 어떻겠냐는 조언도 나왔다.
-오랫동안 준비한 프로젝트였나. =지난해 봄에 <1724 기방난동사건> 끝내고 오랜만에 사무실에 갔다가 최종현(<어린왕자>) 감독을 만났다. 10년 넘게 알고 지낸 형이다. 88만원 세대에 관한 아이템 이야기를 하기에 재미없어, 했다. 그랬더니 내놓은 것이 개성공단 통근버스 안내양 이야기였다. 나도 <스펀지>에서 버스 안내양이 있다는 이야길 들은 적이 있다. 더듬이가 쫑긋했다. 개성공단을 지키는 북쪽 군인과 개성공단 통근버스 안내양의 사랑 이야기라. 그 다음날 아예 조효민 작가를 불러서 셋이서 술집에서 대부분의 이야기를 짰다. 버스 짐칸에 타고 내려오면 <로마의 휴일> 같은 데이트도 가능할 테고. 그 뒤로 사무실에서 모여 매일 치고받고 싸우는 형태로 시나리오를 완성했다.
-일반적인 분업 형태는 아니었던 것 같다. =큰 제작사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내가 마니커 닭고기 같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다. (웃음) 사료 먹고 알 낳는. 설계도 받아서 물건 만드는 게 오래 하니까 지겹더라. 아이템 한줄로 시작해서 같이 디벨로핑하는 것이 재밌어 보이고. 그래서 로케트필름을 차린 거다. 대표라고 해서 책상을 따로 놓고 일하지 않는다. 같이 머리 맞대고 만들어내는 거지.
-한때 한국영화의 중심에 프로듀서가 있었다. 프로듀서가 존재감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라고 보나. =방만했다. 젊은 프로듀서들의 경우, 나를 포함해서 예산 잘 짜고 스탭들에게 욕 안 먹고, 촬영만 무사히 끝나면 된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새 판을 만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 없었다. 스스로를 ‘뉴스트림’이라고 부르면서도 정작 흐름을 이끌 힘은 갖지 못했다.
-선배 제작자들에 대한 불만은 없나. =KPIF 행사에 참여하기 전만 해도 기성 세대들은 꼰대라는 생각을 했다. 올해 부산에서 행사하면서도 몇몇 제작자들로부터 ‘어, 쟤들 봐라’ 하는 식의 눈총도 받았다. 하지만 선배들 때문에 설 자리가 없었다고 여기진 않는다. 피칭 준비하면서 심사하던 선배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 특히 꼬맹이들 뒤풀이까지 챙기셨던 신철 대표님께 감사한다. 그동안 일한다고 자식들 못 챙겼는데, 이제라도 좀 챙겨줘야겠다는 눈빛을 여러 차례 읽었다.
-한국영화의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어떤 프로듀서가 필요하다고 보나. =모든 영화를 프로듀서가 기획할 순 없다. 감독 중심, 작가 중심의 영화도 있어야 한다. 다만 그 비율만큼 프로듀서 중심의 영화도 나와야 한다. 합리적인 제작과정이 가능하려면 프로듀서가 크리에이티브한 사고를 가져야 하고, 그걸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성공 모델이 필요하다. 피칭 행사만으로는 안되고.
-그동안 <서울> <히어로> 같은 합작영화에 참여했다. 외국어에도 능하다고 들었다. 불어, 영어, 일어까지 한다면서. =언어 능력이 합작 프로젝트 성사와 진행에서 열쇠는 아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면 된다. 프로듀서가 박쥐처럼 날아다녀야 싸움이 안 난다. 합작영화는 아직도 콘텐츠보다 네임 밸류 중심이다. 로케트필름에선 박은영 프로듀서가 준비 중인 <굿바이 레슬리>라는 합작 프로젝트가 있다. 장국영을 소재로 한·중·일 3국이 참여하는 형태의 프로젝트다. 다만 신생 영화사라는 점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는 다들 아이템에 흥미를 보이면서도 갸우뚱한다. 센 감독을 붙일 수 있는지, 한류 파워가 있는 배우가 붙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따라붙는다. 다들 간만 보는 거다. 하지만 콘텐츠로 끝까지 승부해서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