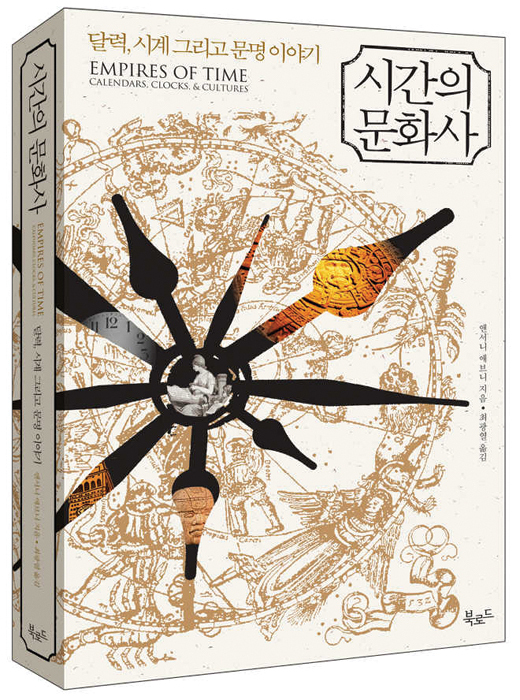<시간의 문화사-달력, 시계 그리고 문명 이야기> 앤서니 애브니 지음/ 북로드 펴냄
시간은 보편적 개념이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고유의 특성도 지니고 있다. 문화권에 따른 문학작품들 속의 시간은 각기 다르다.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하루는 새벽에서 저녁까지의 변화였고, 한해는 여름에서 겨울까지의 변화였다. 로마인들에게 시간은 날씨처럼 흐르는 것이었다. <시간의 문화사-달력, 시계 그리고 문명 이야기>는 시간을 비교문화의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책으로, 생물학에서 문학, 문명, 역사 등 시간과 관련한 다양한 문헌들과 자료를 통해 시간에 대해 이야기한다.
시간은 사실상 측정 불가능한 존재지만, 그것을 파악하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은 달력과 시계를 낳았다. 그리고 인간은 시간에 의미부여를 하기 시작했는데, <시간의 문화사…>가 보여주는 문화권별 시간 해석법은 풍속화를 보는 듯한 재미를 주기도 한다. 세계에서 가장 놀라운 구조물 중 하나라고 불리며 5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수수께끼로 남아 있는 스톤헨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스톤헨지는 달력일까 천문대일까. 저자 애브니는 스톤헨지가 천문대인 한편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일러주는 달력이기도 하다고 말한다. 천문대인 이유는, 누구라도 둥그렇게 늘어선 돌들 한가운데 서면 시간과 관련한 사건을 목격할 수 있기 때문이고, 달력인 이유는 암호를 해독할 수 있는 관찰자의 눈에는 어떤 사건의 흐름에 대한 기록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영민한 사용자라면 몇번의 관찰을 통해 미래에 일어날 일을 스톤헨지의 돌들을 통해 예측할 수 있다는 말이다. 무엇보다도 생명체는 그 자신이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가 될 수 있다. 밤을 새서 일을 해도 아침이 되면 극도의 피로감이 조금 줄어드는 것을 느끼고, 반대로 태양이 지는 모습을 볼 때면 무감각 상태에 빠지며 더욱 피곤해진다. 인간의 생물학적 주기가 엄격하게 지구의 낮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시간의 문화사…>는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이 만나는 접점이다. 인류가 살면서 만든 거의 모든 것이 시간을 이야기하기 위해 동원된다. 천문고고학 분야 미국 10대 교수 중 한명으로 선정된 적이 있는 저자 앤서니 애브니는 고대천문학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시간의 주름을 낱낱이 펴 보여준다. 마야의 달력, 아스텍과 태양, 잉카의 역법, 중국의 시간 측정에 이르는 4개 장은 결코 풀 수 없을 것으로만 보였던 문명의 신비에 접근해가는 비밀 통로처럼 보인다.
인간이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시계로 측정하고 달력으로 기록하기 위해 겪어야 했던 온갖 시행착오는 <웹스터 사전>을 펼쳐보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시간’이라는 말은 어떤 단어보다 많은 설명이 필요한 항목이지만, 어떤 설명으로도 있는 그대로의 시간을 정의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인간은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욕망을 버리지 않는다. <시간의 문화사…>가 흥미로운 까닭은 그래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