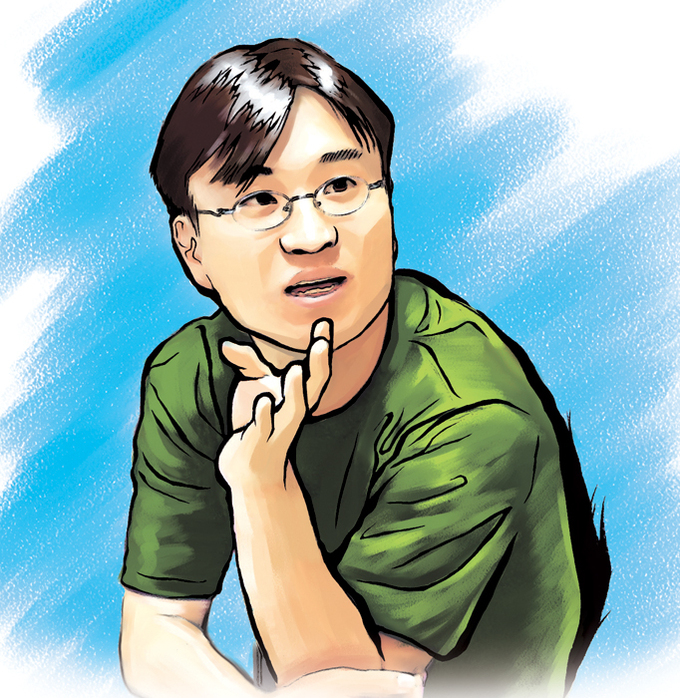시골 가서 사는 게 꿈이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이 아니어도 좋다. 단적으로 몇 십년 서울에서 일한다고 두 다리 뻗고 잘 만한 집을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가. 억대를 넘나드는 집을 소유하기 위해 불투명한 미래, 무가치한 공간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건 ‘삽질’일 뿐이다. 서울 탈출은 그래서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단, 도피여선 곤란하다. 서울 탈출은 공간에 대한 복수여야 한다. 무력한 낙향이 아니라 혁명적 귀향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조건이 있다. 나 홀로 짐을 싸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전체 인구의 48%인 2274만2천명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고 하지 않나. 나 홀로 귀향은 티도 안 난다. 뭔가 도모하기도 어렵지 않겠나.
그러니 기회가 되면 아직 서울에 묶여 있으면서도 동료, 취재원들에게 설교한다. 맞선, 소개팅 자리? 가리지 않는다. 아니, 가려선 안 된다. 물론 성공률이 높진 않다. ‘가자, 남으로’를 외칠 때 그들은 대개 딴청을 부리고 있다. 속으로는 ‘미친놈’ 할 것이다. 서울에서의 장밋빛 미래를 서둘러 장만하려고 나왔는데, 이 무슨 봉변인가 탄식할지도 모른다.
그나마 말이 통하는 후배에게도 내 설교는 안 통했다. 후배는 동의하지만, 본인은 갈 수 없다고 했다. 서울이라는 공간의 문화적 수혜를 쉽게 버릴 수 없다고 했다. 상대적으로 영화를 골라 볼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적은 곳에 가긴 싫다고 했다. 하긴, 내 고향도 광역시 표찰을 달고 있긴 하나 영화문화에 있어선 불모지나 다름없는 곳이니.
돌이켜보니 후배의 말이 조금 이해가 갔다. 군대에 있을 때 휴가 나오면 영화를 몰아서 보곤 했다(태생이 영화광이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문화적 갈증이었을 뿐). <사탄의 태양 아래> <달콤한 인생> 등 중앙 시네마테크에서 나온 비디오를 구하겠다고 종일 시내를 쏘다니다 허탕을 친 적도 있었고, 수소문 끝에 대형 비디오숍을 발견하긴 했으나 이미 폐기처분했다는 주인의 말에 가슴을 치기도 했다.
10년이 지났지만, 지역의 영화문화적 토양은 더욱 메말랐을 것이다. 부산과 전주 등에서 굵직한 국제영화제가 열리긴 하지만 원하는 영화를 상시적으로 골라 볼 수 있는 환경은 거의 제로 수준 아닌가. 물론 지자체들이 그런 데 관심을 가질 리 없다. 영진위에 따르면, 여기저기 지자체들에서 경쟁적으로 영상 관련 테마파크를 유치하는 바람에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4년 수명의 지자체에 너무 무리한 바람일 수 있으나, 시네마테크나 예술영화전용관을 만드는 데 그 돈을 쏟아 붓는다면 어떨까. 테마파크의 비현실적인 수익률에 목숨을 거느니 문화공간의 잠재적 가능성에 베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남는 장사가 아닐까. 꿈의 성취가 언제 이뤄질지 모르겠지만, 유예기간 동안 영화문화 불모지를 가꿀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을 해야겠다. 그건 나를 위한 싸움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