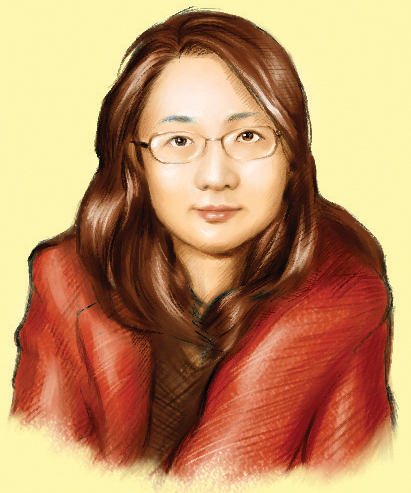어느 방송기자가 쓴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그 기사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르겠다.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는 건 그녀가 마이크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한순간뿐이다. 그녀는 (아마도 버스사고였다고 짐작되는) 참사 현장에 달려가 유가족들을 인터뷰하려고 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받아들일 시간도 주지 않고는, 마이크를 들이댈 수가 없었다. 나도 취재를 해야 했던 걸까. 가장 생생한 순간을 놓치고 돌아온 그녀는 저널리스트의 책임을 외면한 것이 아닌가 후회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자인한다. 다시 돌아가도 차마 그렇게는 못할 거라고.
나는 그 글을 잊고 있었다. 장국영을 만나고 싶어서 영화기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정했던 나는 단순한 동기에 걸맞게도 몇년 동안 저널리스트의 책임이나 고뇌 따위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당장 손에 붙들고 있는 기사를 해결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찼다. 2003년 4월1일 밤까지는, 그랬었다. 그날 장국영이 죽었다. 무술감독 원화평을 취재하기 위해 홍콩에 있었던 나는 선배의 전화를 받고선 “아무리 회사가 요금을 지불한다고 해도 국제전화로 장난을 치는 건 너무 심하지 않나”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엔, 목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만히 있었다. 슬프다기보다 억울했다. 누군가 내게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정도였던 듯한 한마디만 백지가 되어버린 마음속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꼭 겪지 않아도 좋았을,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나서, 화가 났다.
그리고 그날 밤 나는 가족을 잃은 누군가가 아니라 내 마음에 마이크를 들이대야만 했다. 냉장고에 있는 술을 몽땅 꺼내놓고 마시면서, 장국영의 기록화면을 방영해주는 채널을 찾아다녔고, 알아볼 수 있는 한자 자막을 기억해두었다. 기사를 써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코팅한 비닐에 흠집이 나는 것도 아까워했던 그의 얼굴을 보면서, 그를 한번도 만나보지 못한 나는, 그가 죽은 순간 홍콩의 표정을 마음에 새겼다. 기사를 쓰겠다고. 다음날 아침엔 홍콩 공항에서 신문을 사모았다. 나는 내가 끔찍했다.
한국에 돌아온 내게 편집장은 매우 미안해하면서 추모 기사를 쓰라고 말했다. 너의 애정을 담아서, 하지만 감정을 절제하고. 그래서 나는 원고지 수십매 분량의 기사를 쓰면서도 그가 죽어 슬프다는 짧은 문장 하나를 꺼내지 못했다. 쉽게 내뱉어버린다면, 그건 기사가 아니었을 테니까. 하지만 그렇게 쓰고 싶었다. 우리가 왜 그를 좋아했던가 설명을 붙이는 대신 내가 지금 슬프다고 떼를 쓰고 싶었다. 한 사람이 없어져서, 싸늘해진 자국 때문에, 정말 가슴이 아프고 팔이 아프고 눈이 아프다고. 그런 식으로는 한번도 쓰지 못했다. 혹시 정말 아는 사람이 죽는다 해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가 어떤 인물이었느냐고 묻고 다니지 않을까. 먹고 산다는 건 가끔은 너무 남루하다.
올해 4월1일엔 새벽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시면서 <아비정전>과 <영웅본색2>와 <백발마녀전>을 봤다. 여럿이 함께 본 탓도 있겠지만, 나는 <영웅본색2>를 보면서 웃고 있었다. 세월이 약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지는 않았다. 내가 변했다. 다시는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을까 싶다. 장국영이 죽던 해에, 이유도 판단도 붙이지 않고 무작정 좋아할 수 있었던 나의 어느 한부분도, 죽어버렸나보다. 그런 부분은 유독 수명이 짧은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