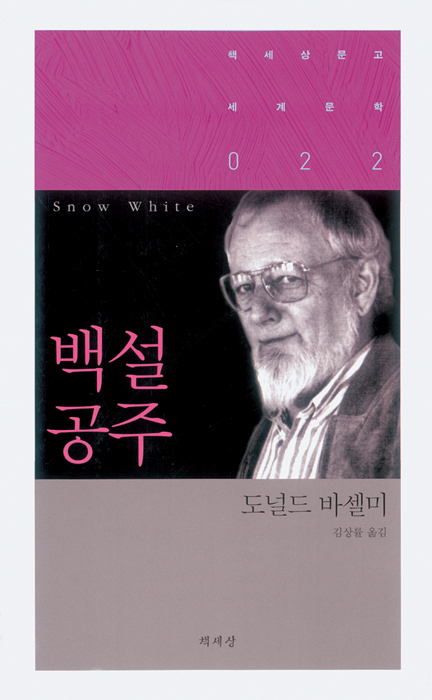도널드 바셀미의 <백설공주>는 그림 형제가 음침하게 묘사한 슈바르츠발트의 컴컴한 숲속 대신 맨해튼의 그리니치 빌리지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시작된다. 바셀미의 백설공주는 대학에서 여성학을 전공했고 따분하고 산문적인 현실에 진저리를 치는 지식인이고 백설공주와 함께 사는 일곱 난쟁이들은 빌딩 유리창을 닦고 이유식을 만들어 파는 왜소하고 건조한 현실주의자들이다. 이들뿐만 아니라 백설공주를 갈망하는 포고, 못된 새엄마 역의 제인, 백설공주를 구해주는 왕자여야 마땅하지만 야심도 희망도 없는 폴은 모두 그림 동화의 고전적인 세계 대신 1960대 미국 현대사회에 속해 있다. 당연한 일이지만 기계적으로 이들을 한 방향으로 몰아내려는 원작의 그림자도 결말에 이르러서는 통제력을 잃는다.
최근에 유행하는 ‘정치적으로 공정한 동화책’류의 패러디 동화를 기대하고 바셀미의 책을 읽는다면 실망할 것이다. 적어도 그런 책들처럼 쉬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은 아니다. 바셀미의 <백설공주>는 단선적인 이야기 대신 단편적인 일화, 독백, 패러디, 언어유희들로 범벅이 된 자잘한 장들로 분리되어 있다. 캐릭터들은 깊이 분석되지 않고 논리는 흐르지 않고 이야기는 정체되며 등장인물들은 모두 필요 이상으로 책을 많이 읽은 대학원생처럼 맥없이 인용구들을 내뱉는다.
바셀미의 <백설공주>를 읽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그림 동화에서 기본 설정만 살짝 훔쳐온 이 자칭 동화에 반영된 60년대 미국의 문화적, 사회적 분위기를 읽어내는 것이다. 아마 백설공주는 70년대에 본격적으로 꽃피우기 시작한 백인 페미니스트일 수도 있으리라. 일곱 난쟁이들은 지나치게 빨리 현실에 적응해버린 지루한 노동자 계급 남자들일 수도 있으리라. 조금만 더 노력하면 폴, 포고, 제인, 가끔 등장하는 대통령 나으리까지 이 게임에서 적절한 자리를 찾을 수 있다. 물론 좀더 적극적인 독자들은 작정하고 흐트러진 이 텍스트에서 또 다른 의미를 찾아내는 게임을 새로 시작할 수도 있다. 그런다고 누가 자의적 해석을 나무라지도 않을 것이다. <백설공주>는 처음부터 작가의 통제를 포기한 책이니 말이다.
그러나 작품이 쓰여진 67년 미국에서는 급진적이었을 문학적 실험인 이 책이 21세기 초를 사는 한국 독자들에게 어떻게 읽힐 것인가는 미지수이다. 이미 포스트 모더니즘의 유행을 한차례 거쳤고 팝컬처의 수다스러운 인용이 쿨한 문화적 태도의 일부가 되어버린 지금 바셀미의 실험이 얼마나 강한 자극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