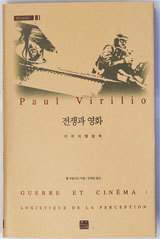“단지 죽은 자들만이 전쟁영화의 종말을 봐왔다”라는 (플라톤식의) 말이 있다. <전쟁과 영화>(폴 비릴리오 지음 | 권혜원 옮김 | 한나래 펴냄)라는 제목의 책과 마주할 때, 아마도 우리는 전쟁 자체와 그에 대한 이야기의 항구성을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언급을 떠올릴지도 모르겠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폴 비릴리오의 이 책을 직접 펴보는 순간 우리는 자신이 가진 사고의 폭이라는 게 얼마나 협소한지 자책을 할 수도 있다. 이건 스크린 위에 재현된 전쟁의 양상들을 다룬 영화비평 혹은 영화사 기술 정도에 머무는 책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비릴리오의 논의에 중심이 되는 문장을 다시 고른다면 충분히 흥미로우면서도 언뜻 다소 과격해 보이기도 하는 이런 것이다. “전쟁은 영화이고 영화는 전쟁이다.” 비릴리오의 <전쟁과 영화>는 그처럼 전쟁과 영화 사이의 은밀한 교감을 다루는 책이다.
비릴리오가 전쟁을 영화와 관련지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전쟁이란 스펙터클의 생산을 목표로 삼는 행위이고 따라서 무기를 지각(知覺)의 도구로서 활용하는 행위이며 필연적으로 표상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는 “전투의 역사는 무엇보다도 그 지각 장(場)의 형태 변환(metamorphose)의 역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같은 기본 입장을 취하고서 비릴리오는 전쟁에서 어떻게 영화적인 재현 방식이 (어떨 경우에는 영화보다 앞서서) 이용돼왔는가를 흥미로운 사례들을 들면서 이야기한다. 물론 이것이 전쟁과 영화의 관계에 대한 유일한 이야깃거리인 것만은 아니다. 할리우드는 어떻게 1차 세계대전에 귀속되었는가, 스타 시스템은 어떻게 지각의 병참술의 효과가 되었는가, 히틀러는 어떤 면에서 야심 많은 영화 제작자의 하나로 볼 수 있는가 등의 다양한 문제들이 전쟁과 영화의 착종된 관계에 대한 논의의 소재로서 다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혹 이것이 문제에 대한 광범위하고 독창적인 사례 모음에 그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오해를 가질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저자인 비릴리오가 시각의 문제에 대한 한 현존하는 가장 권위있는 학자 가운데 한 사람임을 상기하자. 그런 이답게 여기에서도 그는 영화사와 사회사, 철학, 신화학 등을 풍성하게 활용하면서 매우 심원한 논의를 진행해나간다. 그럼으로써 그는 <전쟁과 영화>를, 단지 전쟁과 영화에 대한 고찰에 그치지 않는, 본다는 것과 그것을 위한 테크놀로지에 대한 성찰로 격상시켜놓는다. 머리말에 쓰인 문장을 슬쩍 바꿔 이야기하면 <전쟁과 영화>는 시각과 그 테크놀로지에 대한 것으로서 지금까지 거의 존재하지 않았던 접근을 전개하는 책이다. 홍성남/ 영화평론가 gnosis@ya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