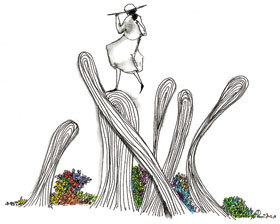nec spe nec metu.
라틴어 nec=영어 not,
라틴어 spes=영어 hope,
라틴어 metus=영어 fear.
‘꿈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시오노 나나미의 처녀작 <르네상스의 여인들>이 다루는 첫 번째 여인은 “타고난 정치적 재능과 예술적 영혼을 한껏 발휘하여 강대국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를 슬기롭게 지켜낸 만토바 후작 부인 이사벨라 데스테”. “이사벨라에게는 눈앞에 있는 현실이 곧 인생이었다. 설령 그 현실이 청결하거나 아름답지 않다해도, 그게 바로 인생이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간 그의 좌우명이 ‘꿈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다.
주인공이 한 여자에게 질문을 받는다. “지금의 삶에 만족하세요?” 주인공이 대답한다. “희망이 없으니까 만족이지요. 만족이란 지금 있는 그대로에서 어떤 희망도 목표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만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임영태의 소설 <비디오를 보는 남자>에 나오는 이야기. 주인공은 자기 앞에 놓인 생을 딱 그만큼만 보면서 살고 있다. 만족한다. 끓어오르는 질투나 야망 따위가 없다는 것. 그것이 그의 만족을 만들어낸다.
죽어 있는 문자들의 덩어리인 책을 앞에 놓고, 그것을 읽고, 여백에 뭔가를 쓰고, 맘에 들지 않는 부분에 가위표를 하고, 아주아주 못마땅하면 군데군데 찢어낸 뒤 재활용 쓰레기로 내다버리고, 가끔씩 책에서 읽은 걸 이면지에 옮겨 적고, 그러다가 머리에 담긴 것을 어디 가서 떠들어내고, 심심하면 텍스트 편집기에서 타이핑을 하고, 누가 그걸 책으로 만들자고 하면 그렇게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나온 책이 영 마땅치 않아서 또 다른 책을 읽고. 껍질이 책의 이념에 걸맞은 것을 찾으려는, 내용이 책의 이념에 합치하는 것을 골라내려는 꿈도 없이 자신이 떠든 말, 자신이 쓴 글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무슨 배짱이냐.
보르헤스의 한 구절을 읽는다. “제가 글을 쓸 때, 저는 독자를 의식하지 않고(왜냐하면 독자는 가상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아마도 저 또한 가상의 인물일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표현을 믿었습니다… 이제 저는 표현을 믿지 않고 오로지 암시만을 믿는다는 결론(그리고 이 결론은 슬프게 들릴지도 모릅니다)에 도달했습니다. 결국 단어들이란 무엇입니까? 단어들은 공유된 기억에 대한 상징입니다. 만일 제가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면, 여러분은 그 단어가 상징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경험을 꼭 갖추어야만 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 단어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없는 경험은 차치하고 자신에게도 없는 경험이 얼마나 많은데 글을 쓰고 책을 쓸 생각을 하는 이는 무슨 배짱일까?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 로자도 만나보지 못했고, 버지니아 울프도 다 읽어보지 못했다. 회사를 다니지만 자본가는 된 적이 없다. 영화를 몇개 본 적은 있지만 그것에 가담한 어느 누구도 만나보진 못했다. 몇개 되지도 않는 이 경험들이 모여서 기억 속에 새겨져서 텍스트가 되었는데 결국에는 그것이 확정된 정의(定義) 속에 표현되지 못하고, 허망하게 흩어져 버린다.
서로가 서로를 더듬다가 그렇게 끝나버리는 게 텍스트 쓰기와 텍스트 읽기 아닐까? 그러면 어때. 그림이 있건 없건, 글을 잘 썼건 못 썼건, 디자인을 잘했건 못했건 서로가 함께 겪지 않은 일들은 영원히 나눌 수 없는걸. 나쓰메 소세키의 단언이 떠오른다. “사람들 사이에는 다리가 없다.”강유원/ 회사원·철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