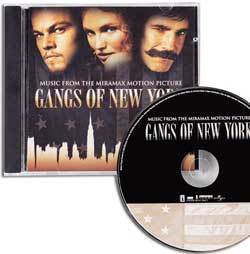마틴 스코시즈만큼 음악감각이 탁월한 감독도 드물 것이다. 그의 영화는 한마디로 리듬의 영화다. 그는 짧은 호흡과 긴 호흡 둘 모두에 능하고 그때그때 그 리듬을 탄다. <택시 드라이버>에서의 인터컷, <성난 황소>에서의 롱테이크, <우드스탁 다큐멘터리>에서의 화면분할 등 호흡 자체가 음악적이다. 이렇게 음악감각이 탁월하니 다른 어떤 감독들보다도 음악 사운드트랙에 많은 관여를 하는 감독으로 알려진 그. 리드미컬한 그의 커트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음악하기가 쉬울 수도 있고, 또 너무 음악에 해박하고 음악을 사랑하는 감독이니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갱스 오브 뉴욕>에서 음악을 맡은 하워드 쇼어는 어느 쪽이었을까. 아마도 후자였을 것이다. 하워드 쇼어가 오리지널 스코어를 쓰긴 했지만 전체적인 음악적 분위기는 단연 마틴 스코시스의 구상에 따라 움직인다. 음악하는 사람이 이 영화 속에서 자유롭게 자기 느낌을 담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마틴 스코시스는 음악을 되는 대로 쓴다. 다른 말로 하면 리듬이나 느낌에 맞으면 그 어떤 음악도 장르를 불문하고 영화 속으로 들어온다는 것. <갱스 오브 뉴욕>은 한마디로 음악의 전시장이다. 사운드트랙만을 들으면 도대체 이게 어느 시대의 어느 분위기를 기준으로 줄을 서 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영화를 보면 이 잡다하다 싶을 정도로 다양한 음악들이 아무렇게나 자리잡고 호흡하는 공간이 바로 영화의 배경인 19세기의 뉴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영화의 중심공간인 ‘파이브 포인츠’는 아일랜드, 독일을 비롯해 프랑스, 중국, 흑인 등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이민자들이 난장판을 벌이고 있는 인종 전시장이나 다름없었다. 그 분위기가 이 음악들의 잡다함과 어울린다. 사운드트랙에는 중국의 <베이징 오페라>에서 흑인 가스펠, ‘아프로 셀트 사운드’의 월드 퓨전, 심지어 피터 가브리엘의 조금은 구닥다리 일렉트로니카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음악들이 자리잡고 저마다 자기 감성과 자기 입장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음악의 중심은 역시 아일랜드 계통의 셀틱음악이다. 아일랜드 출신 슈퍼밴드 U2가 주제가라 할 수 있는 <아메리카를 지은 손>을 부르고 있으며 피리, 바이올린 등이 중심이 된 셀틱 사운드를 구사하는 다양한 밴드들의 음악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끌어간다. 셀틱음악이 앞장서기는 하나 이번 사운드트랙이 보여주는 흐름은 한마디로 ‘월드 뮤직’이다. 사운드트랙을 들은 사람이라면 월드 뮤직에 대한 마틴 스코시스의 감각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각 지역의 민속 음악 중 사운드의 개성이나 멜로디, 분위기나 리듬을 통해서 그 ‘지역성’을 가장 대중적이고 일반적으로 반영한다 싶은 음악들을 귀신같이 고르고 있다. 물론 이 음악들은 순수한 ‘민속음악’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귀에 ‘그렇게 들리는’ 음악들에 더 가깝다. 그러므로 이 감각은 대중적인 감각이다. 이러한 감각은 그 자신의 것이라기보다는 그의 생각을 구체화하는 데 동원된 스탭들의 것일 가능성이 더 높긴 하지만, 어쨌든 마틴 스코시즈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차원에서도 철저하게 미국적이다. 잘 전시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성기완/ 대중음악평론가 creole@hite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