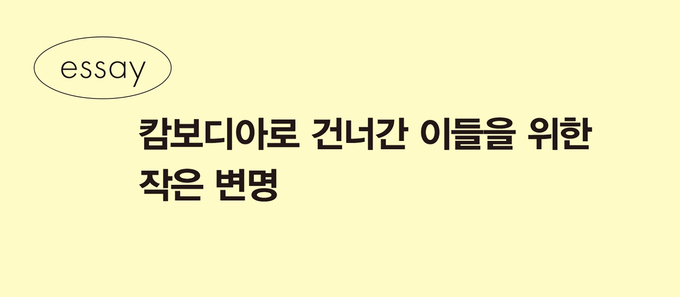2007년 5월, 다세대주택으로 거처를 옮겼다. 창문 없는 지하 고시원에서 2년, 옥탑방 2년의 삶에서 벗어나는 순간이었다. 거실이 없는 구조였지만 그래도 방이 세개였다. 이사한 첫날, 얼마 되지도 않은 짐들을 구석에 쌓아두고 텅 빈 공간에 홀로 누우니 괜히 뿌듯했다. 이 방은 침대, 저 방은 작업실로 꾸밀 생각을 하니 구입할 용품도 많았다. 내일은 마트에 갈 계획을 세우며 사르르 잠이 들었다. 일하랴, 공부하랴, 정신없었던 지난 몇년간의 나를 칭찬하면서.
한 시간쯤 지났을까? 꿈에 놀라 잠에서 깼다. 사방에서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나는 머리 잡고 괴로워하는 내용이었다. 피곤해서 꿈이 사납다고 여기고 다시 잠을 청하려는 순간,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다. 그 고성이 직접 들렸다. 아, 꿈이 아니었네. 옆집 소리였다. 그것도 망치질 같은 고의적인 강한 소리가 아니라 그저 사람들이 약간 다투는 그런 소리였다. 아, 망했다. 이 집은 방음이 전혀 안되는구나.
옆면이 그러한데, 위아래는 멀쩡하겠는가. 20여년 된 집인 걸 감안해도, 총체적 난국이었다. 보일러는 그 크기부터가 심상치 않을 정도로 괴이했는데, 가동을 하면 천둥번개를 동반하는 태풍 소리가 멈추질 않았고 배관의 울림은 모든 벽면을 타고 흘러 다녔다. 고장 수리를 위해 온 기사가 살다 살다 이런 제품은 처음 본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방충망의 진실을 알았을 때는 기절할 뻔했다. 집 보러 갔을 때 왜 방충망이 없냐고 묻자 주인은 교체 예정이라 뜯어놓았다고 했다. 이때 의심했어야 했다. 뜯어놓다는 떼어놓다가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연락도 없이 찾아온 그는 이런저런 장비를 한가득 들고 있었다. 내가 끼울 테니 창문만 달라고 하니, 막무가내로 들어와 부산을 떨었다. 아뿔싸! 방충망이 좌우로 열고 닫는 개폐형이 아니었다. 사각의 틀에 박힌 톱니에 그물을 부착하는 게 다였다. 부착 후 탈착은 불가능했다. 이 집에서 창문 밖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건 가능하지 않았다.
알았으면, 계약하지 않았을 거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았다. 말했듯이 나는 지하 고시원과 옥탑방에 살면서 좁은 공간의 서러움이 극에 달한 상태였다. 겨우겨우 모은 목돈으로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는 게 최대 과제였을 뿐이다. 그 상태에서 집을 보러 다닌다는 건, 배고플 때 마트 가는 것과 같다. 정신력이 한없이 약해진 상태니까 말이다. 공인중개사가 내가 제시한 보증금과 월세로 가능한 집들을 보여주는데, 처음엔 기절초풍할 정도였다. 여기 어떻게 사람이 사냐는 생각이 드는데,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집들이 많았다. 상상했던 것이 다 무너지는 절망감과 돈 없는 팔자에 대한 서러움이 겹쳐지니, 중개사가 슬쩍 말한다. 월세를 조금 더 내면 되는 집이 있는데 볼 의향이 있는지를. 그때 만난 집이었다. 어? 여긴 사람이 살 만하네. 방도 세개라니, 세상에나. 이 집, 절대 놓치지 말아야지.
힘들 때 연애하면 큰일 난다, 그런 것이었을까? 나를 지탱하는 토대가 부실하니, 상대의 작은 배려에 지나치게 감동하는 그런 꼴이었다. 추락하는 자신을 구원이라도 해준 것마냥 순간 사랑에 눈이 멀 듯이, 나도 그 집과 단번에 사랑에 빠졌다. 대가는 가혹하다. 이런저런 하자를 예상치 못하게 발견해야 하는 짜증은 기본이고 수습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한없이 낭비해야 했다. 그만큼 공부에 모든 에너지를 쏟기가 힘들어지니, 나는 계속 뒤처졌다. 살아보면 안다. 집중하지 않아서 가난한 게 아니라, 가난하니 집중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때 귀는 얇아진다. 부정확한 정보를 걸러내지 못한다. 나는 끝도 없이 출몰하는 개미 떼 문제를 해결하려고 서울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강원도 어디의 오일장을 가기도 했다. 그 개미는 약국이나 마트에서 파는 일반적인 약들로 사라지지 않았다. 수소문하다가 인터넷 어딘가에서 그 장터에서만 살 수 있는 해충제가 있다는 정보를 들었다. 피식 웃고 넘겨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속는 셈 치고 버스에 올랐는데,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그렇듯이 나도 속았다. 리어카 한쪽의 군부대에나 어울릴 법한 병에는 먼지가 자욱했다. 개미가 냄새만 맡아도 전멸된다는 문장이 라벨지에 있었는데, 도무지 믿음이 가지 않는 글꼴이었다. 그걸 믿었다.
집에 와서 곳곳에 발랐다. 개미가 사라졌다. 하지만 사람도 사라질 수준의 냄새가 진동했다. 아무리 환기를 해도, 구역질이 계속되었다. 옆집, 윗집에서 항의가 이어졌고 심지어 경찰도 출동했다. 경찰은, 냄새 때문에 집에서 이야기 못하겠다며 나를 밖으로 끌고 갔다. 주인은, 당장 해결하라며 고함을 질렀다. 방역 업체를 불렀다. 흰색 가운에 특수 마스크까지 착용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연기를 뿌렸다. 두달치 월세에 맞먹는 돈을 지불했다. 게다가 24시간 후부터 집에서 생활할 수 있다고 해서 모텔에서 잠을 잤다. 또 5만원이 날아갔다. 돈을 모으기는커녕 이런 데 날리고 있는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다.
다행히 나는 운이 좋았다. 그 끔찍한 집에서 계약한 대로 2년을 어떻게든 살았다. 신혼 생활도 했고 아이도 태어났다. 여러 대학에서 강의하며 생활비를 마련할 기회가 있었다. 부자가 될 리는 없었지만, 삶의 의미를 잃지 않고 살아갔다. 가끔은, 그때 좀 안정적이었다면 지금의 내 모습이 어떠했을까를 떠올리기도 한다. 생활비 걱정 없이 긴 호흡의 글을 쓸 환경이 부럽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그러나 여기까지도 기적이다.
그 운, 누구에게나 있지는 않을 거다. 내가 그런 집을 덜컥 계약했듯이, 순간적으로 이성이 마비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있다. 그런 선택들은 끊임없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한다. 집이 안락해야 재충전이 되고 삶에 충실할 수 있는데, 집 문제로 시간 쓰고 비용을 지불한다. 어찌 자기 계발을 하고 돈을 모으겠는가. 그때 주변의 헛소리들이 묵직하게 개인의 삶을 파고든다. 관심도 안 가질 구인 광고에 눈을 떼질 못한다. 뭐라고? 캄보디아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고? 그것도 한달에 천만원? 이 친구, 캄보디아에서 범죄 혐의로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되는 청년들 중 분명 있을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