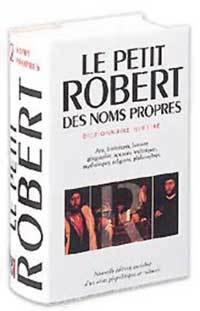이 책을 산 것은 1994년경이다. 소련 멸망의 ‘한국적’ 후유증이 본토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던 때다. 실제로 그랬을 리야 없겠다. 하여간에 어쨌거나, ‘소련을 이긴 서양’ 공부를 뒤늦게 하느라 교보문고 외서부를 뻔질나게 들락거리며 ‘최근’ 관계 책들을 훔쳐보고 들춰보고 급기야 사서 보고 그랬을 때다. 마르크스주의의 공부와 실천(?)의 후유증 때문에 독일어의 어감이 퍽이나 딱딱하게, 마치 골격이 살(肉)을 대신한 것처럼 불편하고 부조리하게 느껴졌을 때다.
뭔가 내 두뇌 단백질의, ‘근육질’을 풀기는 풀어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책이 내 눈에 띄었다. 우선은 재밌는 그림이 많아서다. 대략 2천쪽에 흥미로운 컬러 및 흑백사진이 2200개,거기에 유효적절한 도표와 연표가 200개 첨가돼 있다. 항목은 무려 3만6천개. 이렇게 되면 내용이 너무 소략해지는 것 아닐까? 그렇지 않다. 놀랄 만큼 작은, 그리고 더더욱 놀랄 만큼 끼깔한 맵시의 글씨체 때문에 보통 사전의 3∼4배 분량을 너끈히 감당하고 있다. 불어에는 거의 문외한이었지만 ‘고유명사’들이 우선 나를 안심시켰다. 그건 독해력과 상관없으니까. 레닌도 고유명사고 셰익스피어도 고유명사니까.
그리고 인명, 지명, 예술작품명, 역대 왕조명에다가 건축물까지 고유명사로 아우르는 체제가 나는 문득 신기해지기 시작했다.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고유명사들은 풍부한 예술 ‘그림’을 매개로 각각 제 몸을 열며 다른 고유명사들을 받아들이고 제 몸과 융화시키면서 ‘열린’ 공동체를 만들어갔고 그 모양은 ‘낡게 닫힌’ 공동체론과 ‘완고한’ 일반론 혹은 일반명사에 시들해 있던 나를 꽤나 참신하게 감동시켰다. 그리고 그 감동 속에서, 너무 흐물거려 좀체 독해력에 잡혀들지 않는 불어가 오히려 명징하게 들리고 해석이 빤한 독일어가 오히려 청각장애 속으로 유폐된 것처럼 먹먹해 보였다.
이 사전을 가끔 들고 다니다 보니, 살색 표지에 때가 잔뜩 묻었지만, 아직도 불어 실력이 그다지 는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꼬박꼬박 챙겨서 알아두고 외어두는 게 어찌 이 사전의 ‘의도’에 맞겠는가. 이 사전은 문학-예술과 역사의 묵은 향기를 ‘오래될수록 참신한’ 향기로 바꾸려 상상력과 공력을 들이고 있거늘….김정환/시인,소설가maydapoe@thru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