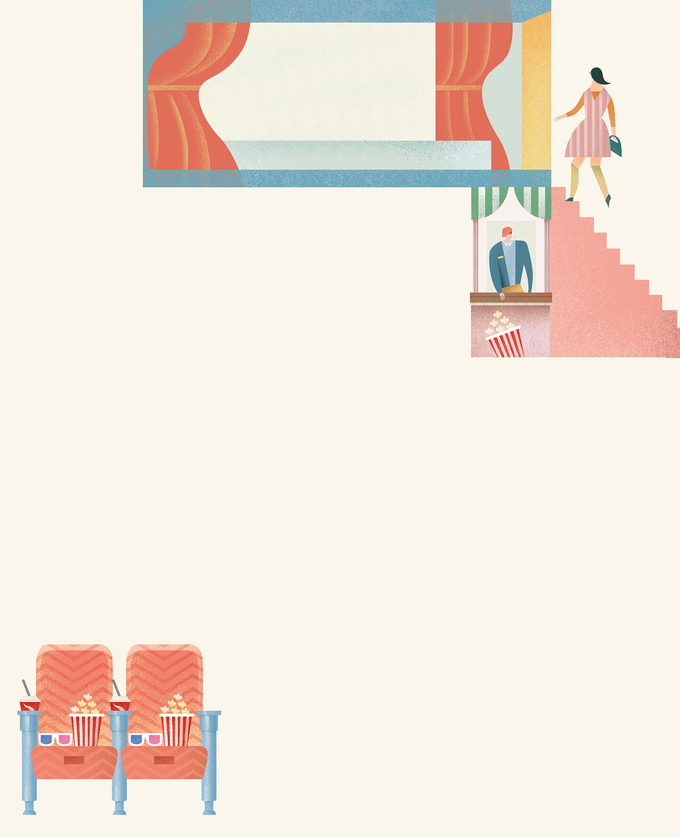영화가 과연 언제까지 지속할까 고민한 적이 있다. 20대에 다녔던 영화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문을 반쯤 닫게 된 것이 계기였다. 그때는 영화 촬영과 상영 포맷이 아날로그인 필름에서 디지털로 전환이 이루어지던 시점이기도 했고, 산업 측면에서도 영상미디어의 영역이 인터넷을 넘어 모바일로 확장을 시작하던 무렵이었다. 나는 당시 영화라는 것이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꼈다.
당연하게도 영화는 사라지지 않았다. 미디어는 역사가 오래될수록 수명이 길다. 역사가 짧은 순서대로 먼저 사라진다. TV보다도 역사가 긴 라디오는 아마 TV보다 더 오래 우리 곁에 있을 확률이 높다. 무선 이동통신 수단인 삐삐는 사라졌지만, 우편은 아직 유효하다. 책은 틀림없이 더 오랫동안 존재할 것이다. 그렇다면 120년 남짓한 영화의 나이로 볼 때, 영화는 그 역사만큼 앞으로 한동안 지속할 확률이 높다(그래도 몇 천년 이어온 연극보다는 더 오래 지속하진 않을 듯하다).
영화라는 포맷은 거의 바뀌지 않았지만, 영화를 감상하는 플랫폼은 오히려 다종다양해졌다. 그러니 사라질지도 모르는 것은 영화가 아니라 ‘영화를 보러 가는 일’이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나는 영화를 보러 가는 일을 언제까지 지속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영화를 보러 가는 일이야말로 영화다운 것으로 생각했으니까. 천막을 치고 어둠 속에서 함께 어떤 것을 보는 행위는 뤼미에르 형제가 최초의 영화를 상영했던 시절부터 이어져온 고유한 문화였기에 나는 이 영화를 보러 가는 행위로 비로소 영화가 완성된다고 여겼다. 그래서 아무리 미디어 환경이 최첨단으로 바뀌었을지언정 오늘도 우리가 사실상 어두운 천막이 발전된 형태에 불과한 검은 극장에 모여 빛을 응시한 채 영화가 말하는 세상을 보며 웃고 울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머지않은 미래에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행위가 비록 노스탤지어가 된다 할지라도 함께 모여 보는 행위는 영화라는 본질에 적지 않은 지분을 가진 상태로 존재할 것이라고 말이다.
하지만 그와 같은 위기가 이런 식으로 또 타격을 주게 될 줄은 몰랐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영화계도 타격을 받고 있다.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극장에서 영화를 보는 일 또한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넷플릭스 등 OTT나 IPTV를 통해 집에서 혼자 영화를 보는 경험은 많이 늘었다고 한다. 다른 무엇도 아닌 신종 감염병으로 이렇게 영화 보기의 주류 행태가 빠르게 달라질 줄은 예상치 못한 일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영화산업은 어떤 변화를 맞닥뜨리게 될까. 물론 감염병의 위기는 언젠가는 멈추거나 잦아들 것이다. 다만 지금의 이런 상황이 내가 항상 걱정해왔던 노스탤지어가 된 미래의 예고편은 아닐까 하는 쓸쓸한 기분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