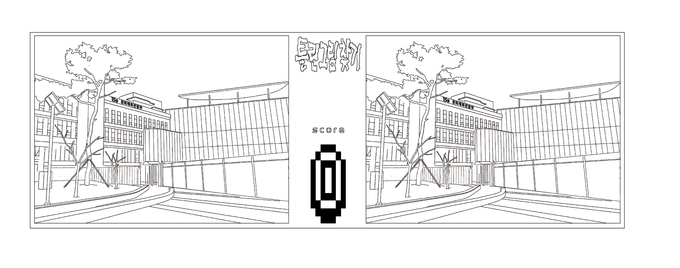박근혜 정권이 계속되었다면 한국의 예술은 어떻게 됐을까? 어떤 예술가들은 사라졌을 테고, 어떤 예술가들은 사라지지 않기 위해 자신의 예술을 바꿔야 했을 것이다. 훗날 진실의 전모가 드러난다면 그제야 사람들은 박근혜 정권의 예술 검열이 비밀리에 진행된 대규모의 예술 학살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다행히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태가 완전히 종결되었다 말할 수 있을까? 그 원인은 충분히 밝혀져 제거된 것일까?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의 책임규명 요구가 있은 지 두달이 넘은 시점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문제 인물들에 대한 “조치”를 담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자 68명에 대한 이행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진상조사위와 예술인들이 반발하자 문체부는 자신들의 조치는 사실 매우 강력한 것이며 예술계의 부정적 반응은 국민의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공개 대응했다. 이러한 문체부의 일련의 행동에는 대내외적으로 조직을 수호하려는 방어기제가 작동하고 있다. 그렇다. 문제는 조직이다. 우리는 대체로 조직은 합법이고 소수의 일탈한 구성원들이 불법적 행위를 저지른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어떤 조직은 집단적 공모를 통해 불법을 행하며 구성원들에게 불법을 합법이라 변호하는 믿음과 구실을 제공한다. 이때 구성원들은 조직의 영향력이 약한 곳에서, 극단적인 경우 조직에서 일탈함으로써만 합법적으로 행위할 수 있다.
문체부도 그러했다. 문체부는 위로는 청와대, 아래로는 산하기관으로 이어지는 불법적 네트워크의 일부였고, 구성원들은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명분하에 (확신의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지라도) 불법적 행위를 저질렀다. 합법적으로 행동하려는 이들은 오히려 조직 내부에서 조심스럽게 처신해야 했다.
블랙리스트가 조직이 범한 반헌법적 범죄 행위라면 조직 외부와의 협력은 문제 해결에 필수적이다. 이때 조직 외부와의 협력이란 관행적인 감사나 자문을 넘어서야 한다. 또한 진상조사위는 문체부가 원하는 만큼의 제안만 하는 컨설턴트가 아니다. 진상조사위는 내부 권력이 합법성과 정당성을 회복하기 위해 소통해야 하는 외부 권력이어야 한다. 문체부의 조치에 대한 예술계의 반발은 단지 징계의 범위나 수위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과거 오점을 부끄러워하지만 그 원인과 해법을 캐묻지 않는 안이함, 외부에 등을 돌리고 내부를 돌보는 데 급급한 그 변치 않는 조직 본능에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문체부는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블랙리스트를 작성 지시·작성·이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은 가정한다. 예전에 사람들은 부당한 권력에 처벌받을까 두려워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는데 이제는 법으로 처벌받을까 두려워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묻고 싶다. 정말로 블랙리스트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처벌 가능성 때문에 민주주의와 헌법의 원칙을 어기거나 지키는 조직은 도대체 어떤 조직인가? 왜 문체부는 스스로에게 묻지 않는가? 예술을 사랑하는 전문가로 자처했던 그들이 어쩌다 공포로 움직이는 조직적 동물로 전락했는지.